좀 서늘하더니만, 어제오늘은 날이 정말 눈부시다 라는 표현이 맞겠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의 투썸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만치 좋다.
어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 좋은 날에 집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잠만 잤다. 그 와중에 책은 읽겠다고 품에 안고 말이다. 무겁기까지 한 책을 가슴이 팍 안고 잤더니 어깨가 다 뻐근하다.. 쓸데없는 짓을... 쯧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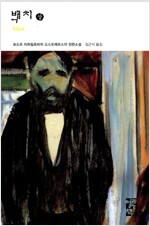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것. 상.하권 중에 상권 하나 다 읽은 걸로 뭐 그리 감격을? 하겠지만 이넘의 책 두께가 500페이지다. 그러니 앞으로 500페이지를 더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고전소설의 특징인, 초반 도입부에서부터 아주 느릿느릿 진행되는 전개과정에 중간쯤 까지는 이거 읽어 말어? 하고 있었는데, 상권이 끝날 때쯤에는 매우 흥미진진해져 버렸다. 그래서 상권 덮고 두말 없이 하권을 꺼내들었다. 뭐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도스토예쁘스키의 소설들은 인간 심리 묘사가 탁월하다는 것.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가의 소설을 마치 경전인 듯 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나도 이 작가를 매우 매우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감동하고 있는데, <백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악령>이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소설을 볼 때의 감동은 아직 솟아오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초기작품이라 그런 지도 모르겠다. 다만, 전개가 되면 될수록, 아.. 사람의 이 복잡미묘한 심리를, 때로는 병적일만차 오락가락하는 그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여지없이 느끼고 있다. 집에 <악령>을 사두어서 이 다음에는 <악령>을 읽을 참이라 워밍업이 되는 느낌이다.
<백치>의 두꺼운 상권과 하권 사이에 끼워넣어 읽겠다고 꺼낸 건 정유정의 <종의 기원>이다. 작년에 정유정의 <7년의 밤>을 읽고 꽤나 감탄했던 터라 바로 <종의 기원>을 사두었더럤다. 이걸 읽지 않고 계속 미룬 까닭은, 알고보니 내용이 좀 섬찟해보여서 마음도 계속 울적한데 읽으면 그 울적을 더할까 두려워 다소곳이 책장에 그대로 두었다... 라는 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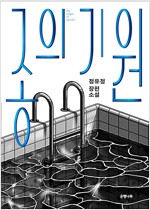
이제야 읽을 마음이 든 건, 이젠 더이상 미룰 수 없을 만치 읽고 싶다는 욕망이 커져서였다. 왠지는 설명이 안되고..허허. 어제 새벽에 잠시 읽었는데, 오. 이 작가. 정말 문제적인 작가구나 싶다. 인간 심정의 밑바닥을 그려내는 솜씨가 탁월하구나 라는 생각. 우리나라 현대 작가 중에 꽤 괜챦은 작가로 남을 수 있겠다 라는 느낌.
물론 약 100페이지가량 읽은 내용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과거와 현재를 오고가며,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일인칭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결말까지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무섭다고나 할까... 누군가의 시커먼 구멍을 보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나 할까... 그래서 새벽녘에 읽다가 일단 덮었다. 더 읽으면 잠을 자기 힘들겠다... 내용의 흡인력도 대단해서 더 읽으면 정말 잠을 자기 힘들겠다... 일이 많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라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나오면서도 이 책을 꾸역꾸역 챙겨나온 건... 웅. 이래선 안되는데. 혹시 일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읽을까 라는 핑계를 대며 가방에 쓰윽 넣었다. 이거 읽기 시작하면 오늘 일은 끝.. 이라는 느낌도 있었으면서. 그래서 우선 일부터. 라며 자료들을 다 꺼내놓고 이 책은 저 멀리 두었다. 날 읽어 날 읽어.. 라고 쳐다보는 것 같아 애써 외면하며.
아 날도 좋은데... 놀러도 못가고. 라는 불평감은 버리기로 했다. 이 화창하고 평화로운 날이 일요일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느즈막히 나와서 빛나는 햇살을 바라보며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 내가 세상에 이렇게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에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런 날, 두산은 야구를 이겨야 한다. (이 왠 삼천포???) 그러면 나의 이 멋진 일요일의 결말이 더욱 멋져질거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