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드러누워 이 책을 보는 건... 즐거우면서도 괴로운 일이다. 날도 추운데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는다는 건 즐겁지만, 책제목처럼 내용은 그리 즐겁지 않아 괴롭다. 사실 즐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참혹하다. 그저 알고 있는 것과 하나하나 사례를 들고 구분하여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 여성혐오를 근간으로 한 폭력과 살인과 억압이 얼마나 많고 그 구분 또한 얼마나 사회 곳곳에서 튀어 나오는 지 놀라울 정도이다.

이 말이 맞다. 어떤 현상에 이름을 붙여주면, 특히나 불의에 이름이 더해지면, 저항의 힘도 구체적이 된다. 어떤 일이든 성별의 관점에서 쳐다볼 때 그 현상은 달라보인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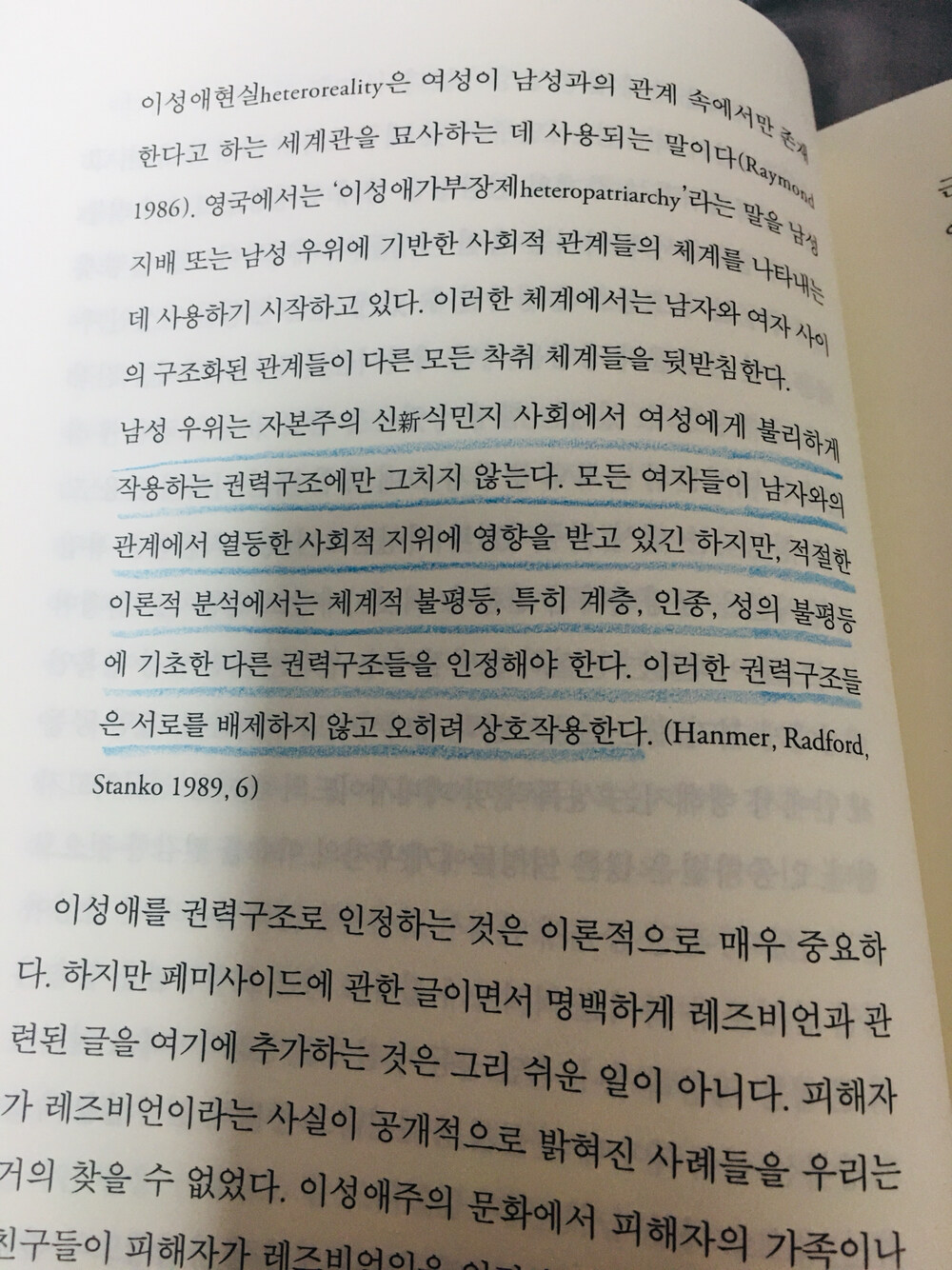
'이러한 권력구조들은 서로 배제하지 않고 상호작용한다.' 이 대목에서 소름. 여성이 여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인종과 계층, 성의 불평등이 합세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인지. 원인은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복합적인 얼개들이 덮쳐와서 해석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볼 때는 왜곡도 된다.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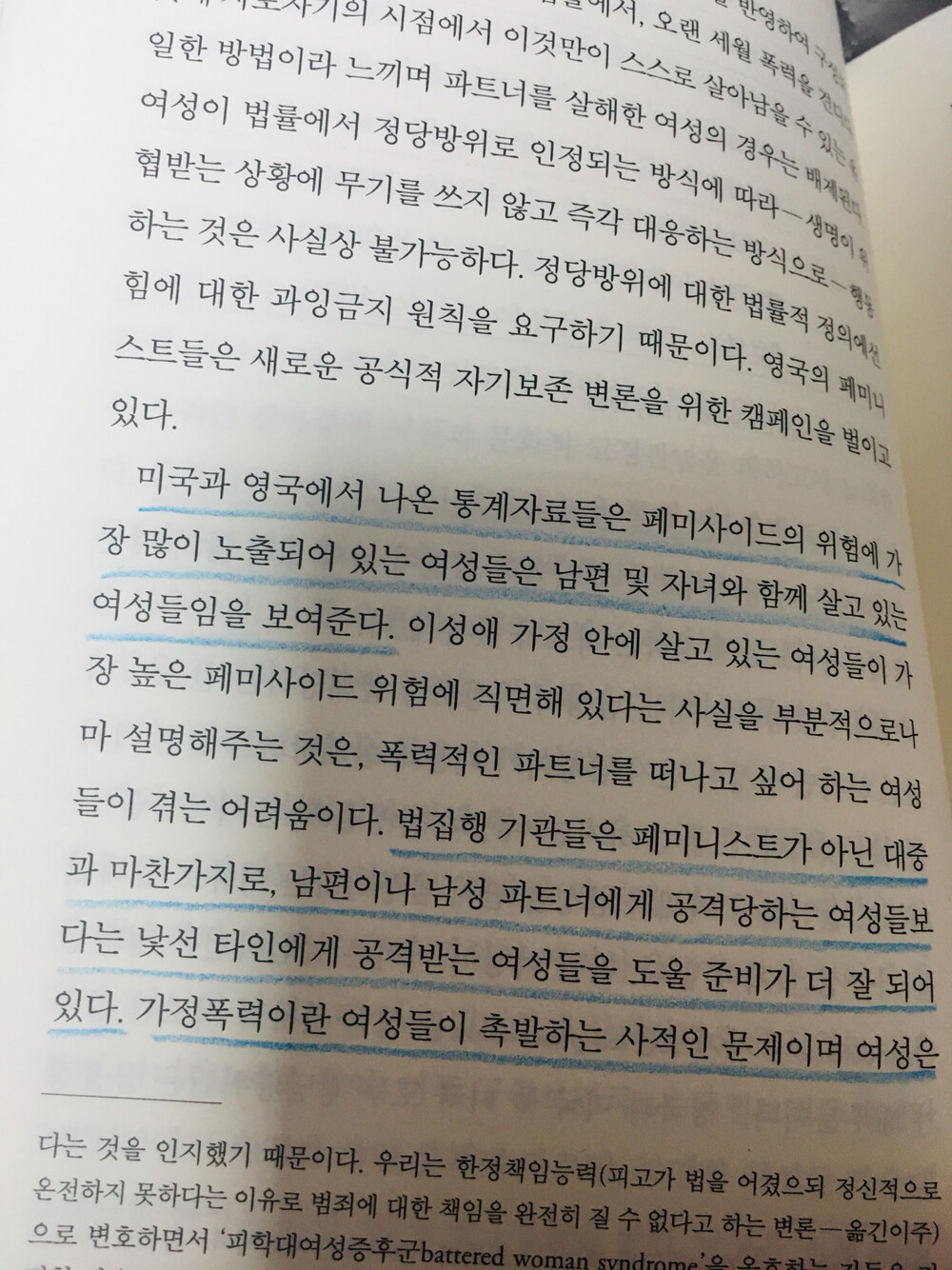
너무 슬프다. 이성애를 강조하는 이 사회에서 이성애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가장 살해를 많이 당한다는 이 사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참을 것을 강요당한다는 사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며 "오죽하면 그랬겠니.." 라는 말을 양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히려 남에게 공격받는 여성들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가정 내에서 당하는 여성들은 방치되고 오해되고 간혹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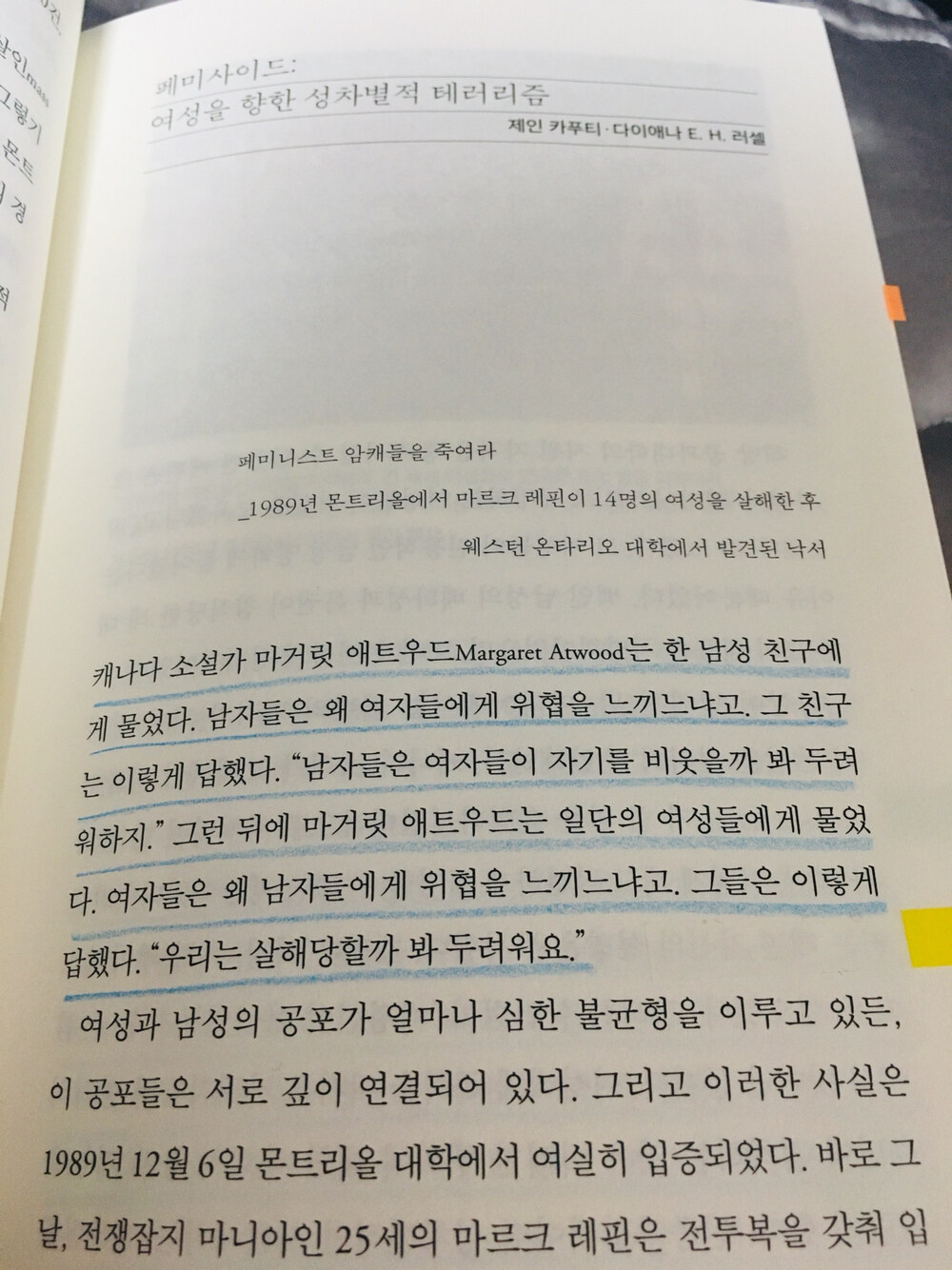
난 마가릿 애트우드의 이 일화에 깊이 공감한다. 요즘 <도어락>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나처럼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이런 공포와 두려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존한다. 매우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막연한 공포감. 뭔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느낌.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보지도 않는 TV를 켜고 소리를 내고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을 끄집어 내어 현관에 진열해두고 누가 배달이라도 올라치면 문을 열지 않고 문 앞에 놔두어달라고 메세지를 남기곤 한다. 나같이 연령이 있고 직접적인 남성으로부터의 공격을 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는 여성도 느낄 수 있다면 더 많은 여성들은 실제적인 위협 속에 살 수 있다. 그게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 절렬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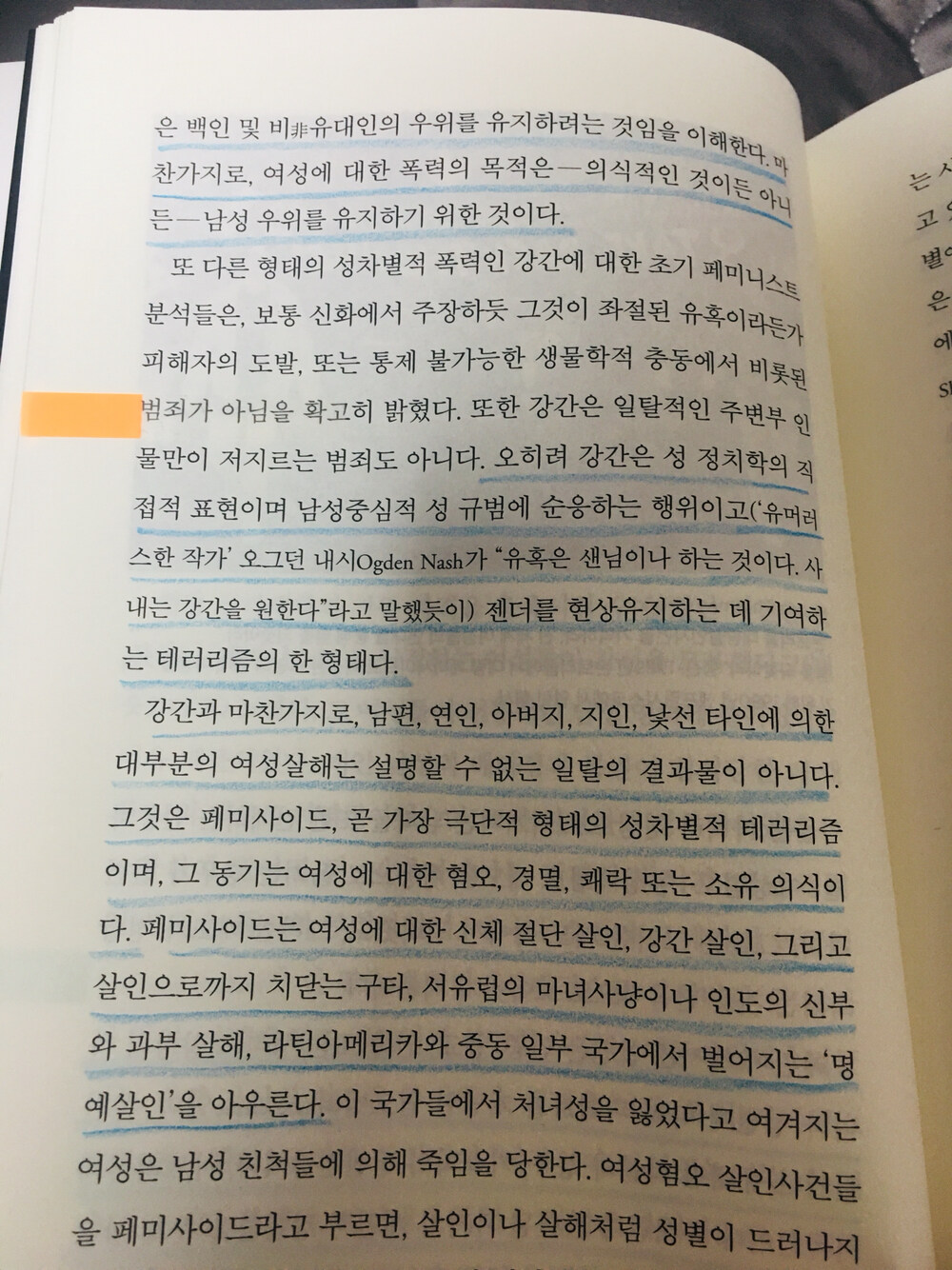
유독, 여성을 겨냥한 범죄의 경우, 예를 들어 연쇄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이나 권력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기 보다 가해자의 개인적인 분노, 좋지 않았던 성장과정 등을 예로 들며 자꾸 협소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다. 여기서 예로 든 것처럼, 유대인이나 흑인에 대한 공격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뿌리깊은 권력형 폭력이고 정치적인 동기가 심각하게 내재된 살인이다 라고 본다면 여성을 향한 혐오범죄 또한 사적인 원한관계나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상당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읽으면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까 두렵기까지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함과 동시에 군더더기를 제외하여 목적에 충실하게 편집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