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언제, 어디서 책 읽는 걸 좋아하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좋아합니다. 예전엔 주로 화장실에서, 베란다에서. 요즘에는 솔직히 그런 공간들에서 스마트폰을 자꾸 만지작거리게 되어서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책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Q2. 독서 습관이 궁금합니다. 종이책을 읽으시나요? 전자책을 읽으시나요? 읽으면서 메모를 하거나 책을 접거나 하시나요?
당연히 종이책이지요. 잠깐 이북을 다운 받아 보기도 했는데 저는 영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눈도 좀 피로하고. 손으로 만지지 않는 이야기에는 무언가가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예전에는 책에 볼펜으로 밑줄을 긋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이미 되어 버린 내 책을 보는 게 낯설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왜 여기에 줄을 그었나, 싶은 대목들. 되도록 새 책 그 상태로 보고 간지를 붙이고 나중에는 따로 노트에 그 부분을 옮겨 적어 둡니다. 그렇다고 그 노트를 다시 보지도 않으면서도 되새김질하듯 그런 필사의 과정을 하게 됩니다.
Q3. 지금 침대 머리 맡에는 어떤 책이 놓여 있나요?
솔직히 자기 전에는 책을 잘 읽지 않아요. 일단 아이들을 재워야 하기 때문에 불을 꺼버리기 때문이고 이상하게 자기 직전에는 읽는 것보다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아서 라디오를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어요. 책 낭독 팟캐스트를 들으며 잠들기도 했는데 그런 습관이 또 어느 새 없어졌네요. 너무 재미있어서 잠이 확 깬 경험이 있어서요. 김영하가 덤덤한 목소리로 읽은 체홉의 단편이 그랬어요. 좀 으스스해지기도 하고.
Q4. 개인 서재의 책들은 어떤 방식으로 배열해두시나요? 모든 책을 다 갖고 계시는 편인가요, 간소하게 줄이려고 애쓰는 편인가요?
솔직히 나의 개인 서재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간소하게 줄이려고 합니다. 두 번 읽지 않을 책은 끊임없이 처분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작가별로 책을 눕히지 않고도 잘 정리한 볕이 잘 드는 나만의 서재를 가지고 한 권, 한 권 다시 읽어가며 늙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Q5.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은 무엇입니까?
<소공자>, <소공녀>, <쿠오레> 속의 사랑스러운 소년, 소녀들을 닮고 싶어서 몇 번이고 읽고 말투(번역체)를 따라해 보기도 했고 뭐 그런 기억이..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나를 더 예뻐해 준 것도 아닌데...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아서 그런 예쁘고 사랑스러운 무언가 관심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었던 것도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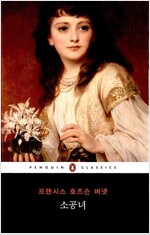
Q6. 당신 책장에 있는 책들 가운데 우리가 보면 놀랄 만한 책은 무엇일까요?
좀 뜬금없는 책들도 ㅋㅋ <금융법률실무> 같은 거, 지난 주에도 버릴까 하다 한때의 경험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남기기로...
Q7. 고인이 되거나 살아 있는 작가들 중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면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제는 고인이 된 올리버 색스를 만나고 싶어요. 그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 먼 발치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는데... 자신의 일과 글쓰기를 충실히 양립시키면서 사려 깊고 섬세하게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죽어간 그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워요. 다양한 관심사가 예술과 사람에 닿아 있어 그런 부분이 참 경이롭기도 하고. 제대로 성실하게 잘 살다 간 부분을 닮고 싶어요.

Q8. 늘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읽지 못한 책이 있습니까?
대체로 읽은 편입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민음사 판으로 나오는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는데 다 읽을 수 읽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Q9. 최근에 끝내지 못하고 내려놓은 책이 있다면요?
지금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을 읽고 있는데 다 읽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네요. 아주 잘 넘어가는 책은 아니라서요.

Q10. 무인도에 세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서머싯 몸의 <면도날>. 이 책은 정말이지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매번 놀라요. 소설 이상의 이상. 잘 읽히기도 하지만 소설에 나오는 인간 모두가 그 상황에서 정확한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할 캐릭터가 없어요. 마치 인생 자체인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박완서 작가의 그 어떤 책이라도 좋아요. 한국어의 찰진 맛이 그리울 때 박완서의 글은 그런 허기를 채워 줍니다. 마지막 한 권은 아직 내가 읽지 않은 만나지 못한 그 어떤 책이 될 듯합니다. 가장 좋은 책은 항상 또 생겨나곤 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