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롤랑 바르트의 'to write' is an intransitive verb'('쓰다'는 자동사이다) 라는 글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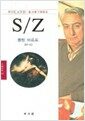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한국에서의 '쓰다'는 타동사라고 나와있습니다.
예)
너 요즘 뭐해?
응? 나 글 써.
사실 '글쓰기'라는 조합(글+쓰기)자체가 한국어에서 '쓰다'가 타동사임을 보여줍니다. ‘쓰다’의 명사형은 ‘쓰기’인데 ‘쓰기’가 단독적으로 쓰이지는 못합니다. '글'은 쓰다라는 동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나타나는 결과물 일반을 지칭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글 써’ 나 ‘글쓰기’라고 말합니다. 즉 ‘쓰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쓰기’라는 형태로 명사화됩니다.
너 요즘 뭐해?
*응? 나 써.
이것은 한국인 화자에게 전혀 말이 되지 않지요.
영어 wirte와 비교해보면 흥미롭네요.
What do you do for living?
Oh, I write.. (바르트 식의 설명으로 하면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위의 한국어 상황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네요.)
Oh, I write novels (그러나 이 또한 자연스럽습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니, write는 자동사와 타동사적 용법 둘 다 있네요.
외국 이론서들을 보면, 이렇게 나쁘게 말하자면 '말로 장난치기' 혹은 '어원가지고 마구 우기기' 등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사유' 하면서 '언어'가 도구 이상으로 사유의 본질에 가깝다는 전제 아래에 이러한 사유들을 전개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에서 '쓰다'가 타동사인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르트 식으로 혹은 푸코처럼 '사유' 해 봅시다.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탐구해본다면 고대부터 '쓰다'가 타동사였는지 예전에는 자동사였는지를 탐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분명 '쓰다'라는 행위는 일부 특권층에게만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의 '쓰다'는 '타동사'로서의 '쓰다' 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쓸 생각을 했지, 그냥 '쓰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겠지요. 중요한 공문서나 상소문 같은 것이나 '쓸' 생각을 했겠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 '쓰다'는 고대에는 '타동사' 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쓰다'가 자동사로도 사용되기 시작하는 조짐은 분명 문자를 사용하는 일부 특권층에서 일어난 미묘한 일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문학사에 '최초의 서정시' (문학사에서 '최초'라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고 약간은 우스꽝스럽기도 한 것이지만.. 또 <황조가>가 서정시가 아니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하튼 '최초의 서정시'라 가정된 x를 '황조가'라고 부른다고 해도 좋습니다.)라 불리는 '황조가'와 같은 것. 즉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다'라는 행위를 시작한 것 말입니다. 물론 이 차원도 벗어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겠다는 자각도 없는 글쓰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동사'로서의 글쓰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시는 일정부분은 이러한 자각도 없는 글쓰기에 근접합니다.
고대 서구는 어떠했을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대 서구'하면 찬란했던 페리클레스 이후의 그리스가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 이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쓰다'는 타동사로서만 기능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수입한다고 해도, 이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고 일부 특권계급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만이 '쓰다'라는 동사가 기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쓰다'라는 동사가 언중에게 '자동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이의 가격이 매우 하락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중 중 일정 수 이상이 보통교육을 받고,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이후에야 그들이 무언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임으로 분명 '쓰다'라는 것이 '자동사'로 받아들여지고 사용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보니, 이러한 설명은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즉 소위 우리 문학사에 있어 ‘근대’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중 중 일정 수 이상이 보통교육을 받고, 여가시간의 증대(이재선 선생님에 따르자면 등유값 하락 등)로 ‘근대문학’의 수용자 층이 늘어났다고 파악됩니다. 같은 원리로 본격적인 전문적 작가가 아니더라도 ‘습작’을 해보는 사람들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굳이 ‘습작’이 아니더라도 낙서나 ‘끄적임’이 이때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때서야 비로소 언중에게 ‘쓰다’라는 것이 ‘자동사’로서 인식되고 사용될 수 있는 물적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즉, ‘근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동사’로서의 글쓰기가 성립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저 ‘끄적여’ 보는 것으로서의 ‘글쓰기’의 탄생. 자동사로서의 ‘쓰다’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아도, 한국인 화자로서는 아무래도 ‘자동사’로서의 ‘쓰다’라는 것은 어색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새는 울고, 사람은 쓴다’라는 식의 말이 어색한 것입니다. 영어로 바꾸어보면 “Birds fly, Men write" (정치적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자면 "Birds fly, Humans write" 정도)정도 이지요.
그래서인지 바르트식의 단어 가지고 하는 사유는 한국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만으로 사유하는 한국인 화자에게는 어색합니다. 어쩌면 이는 ‘어색’의 차원이 아니라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르트는 ‘write'의 자동사적 용법을 가지고 그 자체로 목적하는 ’쓰기‘라는 개념을 ’사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 화자도 그렇게 사유할 수 있지만, 바르트처럼 매끄럽게 사유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트의 사유는 매우 매끄럽지요. ’write'가 자동사라면 자동사인 이상 당연히 이는 목적어가 필요 없고 주어 자체만의 움직임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야말로 "Birds fly, Men write“ 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앞의 “새는 울고, 사람은 쓴다”라는 말을 아포리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무언가 꽉 막힌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물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도대체 뭘 쓰냐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앞서 사유해본바, 모든 ‘쓰다’는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타동사’였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인류 역사의 신화적인 ‘시작’때를 상정하고 이를 상상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야지 언중들이 ‘쓰다’를 ‘자동사’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물론 고대나 중세시대에 일부 엘리트층들이 ‘쓰다’를 자동사적인 용법으로 사용하고 이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가 자동사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 한국어에서 ‘쓰다’는 ‘타동사’로 확고하게 굳어졌고,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이는 그렇지 않았던 것일까요. 엄청난 질문이라서, 또 우리의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어학상의 질문이라서 대답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문학의 ‘정론성’의 일부는 이러한 ‘쓰다’의 ‘타동사’적인 성격에 아주 일부는 기인한다는 것은 너무 나아간 해석일까요? 만일 바르트가 오버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그러하겠지요.
바르트가 ‘write'의 ’자동사‘ 적인 용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글쓰기‘론을 전개해나갔듯이, 우리는 태연하게 한국어의 ’쓰다‘는 결코 ’자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글쓰기‘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쓸 수밖에 없노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무엇‘을 쓰느냐 ’무엇‘을 써야만 하느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얼리즘‘ 끝난지가 언젠데, 한국은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유일한 분단국가‘ 운운 말고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쓰다’는 ‘타동사’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