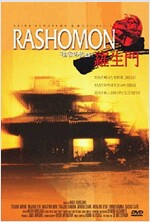

집에서 비디오로 라쇼몽을 보다. 내용이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직접 영화로 보니 새롭다.
한자어로 나생문(羅生門)이라고 쓰는데, 일본어로는 라쇼몽이라고 읽는다. 다 허물어져 가는 문 이름이다. 폐허를 상징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 앞에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영화의 처음에는 비가 내리고 두 사람이 등장한다. 곧이어 영화가 전개되면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해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쿠타카와 소설에 '나생문'이란 소설이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인가 보다 하고 이 소설만 읽으면 낭패를 당한다. 이 소설은 그냥 배경에 불과하고,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영화와 소설은 제목만 같고 나머지는 다르다. 영화는 오히려 '덤불 속' 또는 '숲 속에서'로 번역되는 소설과 관련된다.
한 사내의 죽음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말이 옳은가? 소설 속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진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소설을 읽으며 또는 영화를 보면서 진실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영화는 소설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다.
영화에서 나무꾼이 하는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사무라이라고 하는, 또는 남자다운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나약함을 포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스님은 이런 인간의 악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 인간은 악한 존재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간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가 끝나지 않는다.
영화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비록 살기 힘든 상황이지만 나무꾼을 통해서 희망을 본다. 자식이 여섯이든 일곱이든 힘들긴 매한가지라고, 버려진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나무꾼, 그리고 비가 그친다.
이 영화 속 사건과 같이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판단하는가? 우리는 법에 이런 판단을 맡기곤 한다. 그렇지만 법 역시 완전하지 않다. 편견을 가진 인간이 법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쇼몽을 보면서, 또 다시 작은 범우문고판 [나생문(외]를 읽으면서 인간에 대해 생각한다.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도덕을 현실의 욕망 속에 밀어넣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현실 속에 인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결국 희망은 현실에서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 소설이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영화에서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에 대한 믿음, 그것은 바로 현실에서 진실을 살아가려는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