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2월 22일이 처음이었으니,
경향에 글을 쓴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간다.
알라딘에서 소재를 찾아 글쓰는 연습을 워낙 많이 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각하가 워낙 많이 도와줘서 뭘 써야 할지 걱정한 적은 거의 없었다.
솔직히 말해 매주, 아니 사흘에 한번씩도 쓸 수 있을만큼 각하는 풍부한 소재를 제공해 줬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한 건, 내 결정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아내 때문이었다.
늘 내 안위를 걱정했던 아내는 내가 듣보잡이란 걸 잘 몰라서인지
새 대통령이 될 분이 날 가만 안둘 걸 걱정했고
“이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만 쓰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경향 또한 3년간 우려먹은 내 스타일이 지겨워지고 있던 터라,
“앞으로 두 번만 더 써달라”는 조건으로 비교적 흔쾌히 내 사표를 수리해줬다.
그러니 어제 실린 내 칼럼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이자
대선을 일주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나가는 글이었다.
칼럼을 쓰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쓸까?” 몇 시간 가까이 고민했다.
각하의 도움 없이, 선거에 대해 써야 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좌변기의 꿈’이다.
http://seomin.khan.kr/173
몇 시간 고민한 효과는 있었다.
보통 내 글이 신문에 실리면 부끄러워서 잘 읽어보지 않는데,
이 글은 쓰고 난 뒤에 읽다가 너무 잘쓴 것 같아 기절할 뻔했고,
신문에서 읽었을 때도 까무라칠 지경이었다.
특히 ‘줄푸세’를 ‘즐프세’로 바꾼 걸 보면 내가 천재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
어머니의 “우리 아들 너무 잘썼어”란 의례적인 칭찬도 이번만큼은 진짜로 받아들였다.
아내한테 이랬다.
“이거 경향에 나가고 나면 난리날 것 같아. 여기저기서 싸인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글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내 글이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편’들 사이에서만 잔잔한 반응이 있었다.
뜨면 뭐하겠느냐, 평범한 게 좋다고 늘 말하고 다니지만,
이번 글은 3년간 쓴 것 중 단연 최고라고 생각했기에 옆구리 한켠이 좀 서운했다.
아쉬움을 달래려고 네이버에다 ‘좌변기의 꿈’을 검색해 봤더니,
http://noma1221.blog.me/150153861713
이 블로그(골드문트님)에서 내 글을 언급해 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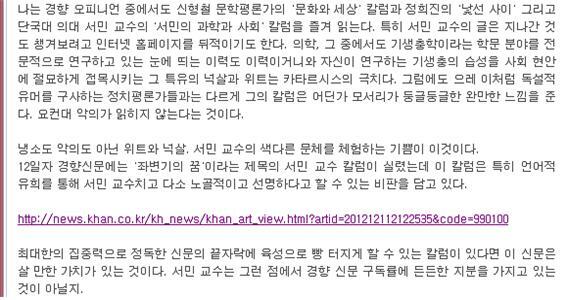
문장 하나하나마다 내 가슴이 벅찼지만, 특히나 마지막 문장은
글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육성으로 빵 터지게 할 수 있는 칼럼이 있다면 이 신문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서민 교수는 그런 점에서 경향 구독률에 든든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지."
이 대목을 읽으니 내가 이제 더 이상 경향에 글을 안쓰기로 한 게 미안할 정도였다.
백번의 포옹보다 한마디의 진정어린 말이 더 나을 때가 있는데,
이 글을 읽고나서 내가 하룻동안 가졌던 아쉬움은 모조리 날아갔고,
당분간 벅찬 가슴을 안고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골드문트님에게 감사드리며, 3년간 변함없이 날 격려해주신 알라딘 마을 주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오늘의 난 다 알라디너 분들이 키워주신 거란 걸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