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꺼워진다는 것
책을 읽고 나 이런 책 읽었다고 떠들기 시작한 것이 만으로 2년, 햇수로 3년 째 이다. 지난 2년은 사업 망하고 집에 꼭꼭 숨어들어 외부와 일체 연락을 단절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동안 거의 책하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만나기 싫었다.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지 않았기에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더 뼈저리고 감당할 수 없었다. 나 역시 완벽주의자였던 스스로가 인생의 크나큰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모양새가 그런대로 멀쩡했던 내 삶의 이력서에도 하나둘 빨간 줄이 쳐지기 시작했고 어디다 내놓기에 민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전엔 책도 안 읽고 글도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책 안 읽고 글 안 쓰는 사람은 대부분 나처럼 생각이 짧다고 여겼으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사람은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았다. 아마 드러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난 이년간 단지 책 읽고 글 쓴다는 이유로 같이 책 읽고 글 쓰는 사람들로부터 어이없는 일을 꽤 당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고 잊어버리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알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덕에 분노보다는 측은지심이 더 많아졌다. 또 오해건 이해건 분명 내가 무언가를 쓰고 세상에 떠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므로 -그리고 책 읽고 글 쓰는 사람은 더 상상력이 풍부하므로-그냥 내가 감당했어야 할 일들 이었다는 생각이 많다.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세월이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상처 받는 것도 경력이 되다보니 점점 능숙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사실 나이 들면 이 착각 때문에 자신이 어느덧 너그러워졌고 이해심이 많아졌고 유 해졌구나 오해를 하곤 한다. 그러다가 비슷한 상처를 받으면 여지없이 서운하고 똑같이 상처받는 자신을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른다. 한번 아팠던 곳이라고 다시 아프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분명 그 굳(어 버렸다고 생각하는)은 살의 더께위로 내가 본 다른 사람의 상처와 눈물도 얽혀 들어가는 듯하다. 상처는 맞는데 아프기도 한데 내가 아프면서 그래 너도 그랬구나를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화된 상처. 교류된 상처. 나도 아프지만 너 아픈 것도 알게 되는 것, 나아가 그 아픔의 정도까지 공감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상대의 왼쪽 발뒤꿈치에 겨우내 붙어 있는 몇 조각 각질만도 못한 만큼이지만 그것도 여러 번 쌓이다 보니 암 것도 없었을 때와 차이는 나는 듯하다.
#2. 시리다는 것

디센던트 (The Descendants) - 감독 알렉산더 페인 / 조지 클루니, 주디 그리어 출연
마음이 잡히질 않아 영화를 봤다. 그런데 영화보고 나서 더 붕뜨고 말았다. 옆집 아저씨로 변한 조지 클루니는 늙어도 멋있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냥 혼자서 두어 번 훌쩍거렸다. 승승장구에서 너는 왜 우냐고 하는 이수근에게 김병만은 ‘니 마음을 알겠어서...’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꼭 그랬다. 나는 남자도 아닌데 그 마음 알 것 같았다. 연기라는 게 원래 그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거 아닐까. 약간 배도 나오고 이태리 정장이 아닌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에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 진짜 볼품없이 뛰는 모습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사랑스러웠다. 이 영화는 잔잔하면서도 그 속에서 밀도 높은 파문이 결국 일고 만다. 슬픔을 견디는 건 사실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잠들면서 이루어지는 일에 불과했다. 사람은 그러다가 어느날 죽는 것이다. 그 변함없는 사실이 좀 시리긴 하지만. 영화 리뷰는 내 이웃님 맥거핀님에게 부탁하고 나는 그냥 한마디만 하련다. 오는 27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탈 것 같은 예감이 심하게 든다. (골든글러브 타면 이어지는 아카데미도 같이 타던데, 하하 브래드 피트도 좋지만 조지 클루니가 타길 바라는 사심에서)
이번 주에 온 책, 담 주에 오기로 한 책만 해도 배가 불러 터질 것 같다. (나도 이런 책 자랑을 하다니 참 대견하군 ㅋ) 내가 산 책도 있지만 요즘 갑자기 여기저기서 좋은 책이 생긴다. 책을 쌓아두는 것도 부질없는 욕심인데 생각 같아서는 2월 내로 다 읽고 리뷰도 다 써내고 싶으나 두어 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까 싶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본주의 그 이후>는 가뿐히 500p, <종말론>은 450p,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도 공부하겠다고 산 책이라 만만치가 않다. 김태용의 소설집 <포주 이야기>는 소설이 독특한 듯해서 유하의 <추억은 미래보다 새롭다>는 옛 정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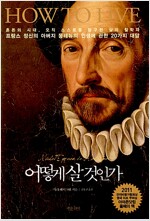






날이 영 풀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내일 2박 3일 여행을 떠난다. 겨울은 늘 한두 번 씩 새로 오는 봄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고 심술을 부릴 때가 있다. 지금쯤이면 큰 추위는 물러가겠지 싶었는데 산소 앞에서 덜덜 떨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뼈가 시리다. 그러고 보니 산소갈 때 늘 몇 가지 제사음식을 준비하시던 엄니 생각이 절실하다. 몇 가지 물어 볼 것도 있고 보고 할 것도 있고 일 년 만에 얼굴을 내미는 딸자식이 그새 늙었다고 뭐라 하시지 않으실까... 오늘은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날이다. 고로 마음이 복잡한 날이다. 마음의 때를 박박 밀고 와야겠다. 부디 개운해야 할 텐데 돌아오면 이빠진 사람처럼 시큰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뭐 하나 대책이 없을 때 '대'하라고 있는 것이 '책'이라고 했던 그의 말이 생각난다. 책을 가져갈까 말까 실은 고민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