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설의 위대함 :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으면 이반 일리치가 죽기 직전의 시간에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독자는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느끼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 즉 독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도 죽음에 직면한 자의 느낌을 알게 된다. 이런 게 소설의 위대한 힘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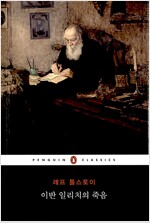


2. 긴장감과 궁금증 때문에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소설 :
악인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 버린 한 남자가 있다. 비록 살인범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주인공의 편에서 진실이 밝혀질까 봐 독자는 마음을 졸이며 소설을 읽게 된다. 나중엔 범인으로 밝혀질 걸 알지만 소설을 읽는 동안은 지금 밝혀지는 건 아니겠지, 하며 조마조마해진다. 팽팽한 긴장감과 궁금증 때문에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다. 이런 소설을 좋아한다. 꽤 두꺼운 이 소설을 오래전 금방 읽었던 걸 기억한다. 그만큼 독자를 끄는 흡인력이 있다.




다른 이유로 긴장감과 궁금증을 느끼며 읽었던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이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이다. 표제작인 ‘대성당’도 특별했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아이가 회복될 것인지 죽을 것인지 궁금하여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마음이 따뜻한 작가가 아니라면 쓸 수 없는 소설 같아서, 내 마음까지 따뜻해지게 만든 소설이라서 감탄, 감탄.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을 흥미롭게 읽었다. 어떤 소설은 작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몰라서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 점이 좋았다.
3. 내가 쓰고 싶은 글 :
내가 가장 읽고 싶은 글은 문학적인 문장이 돋보이는 글이 아니다. 정보와 지식이 돋보이는 글도 아니다. 대단한 주제를 다루는 글도 아니다. 깊은 사유로 깨달음을 주는 글을 읽고 싶은 것이다. 나 또한 그런 글을 쓰고 싶다.
4. 자신의 허물은 덮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본다 :
내가 어느 서재에서 다음과 같이 댓글을 쓴 적이 있다.
“저는 비교적 바른 어린이로 컸어요. 맘에 걸리는 건 내 이득을 위해 비굴할 때가 몇 번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우개로 지우고 싶죠. 때로는 재수 없는 아이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재수 없어 하는 아이, 였어요. 저도 여기까지 성장 소설을 써 봤습니다. 작위적인지 아닌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역시 굿~ 밤~ ㅋㅋ”
과거 속의 나를 잘 살펴보면 남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하는 걸 느끼게 되면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누군가에 대해 관대해진다. 문제는 자신이 걸어 온 길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점이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은 덮어둔 채 남의 허물만 크게 보게 된다.
5. 어렵게 쓰는 필자, 쉽게 읽는 독자 :
칼럼 한 편을 완성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글을 쓰고 나면 지친다. 잘 썼든 못 썼든 나로선 최선을 다했으므로 피로를 느낀다. 그런데 내 칼럼을 읽는 독자는 대충 읽을 것이다. 필자가 문단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등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난 독자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자에게 한 번 읽어 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한 글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
나는 모든 글 가운데서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그대는 피가 곧 정신임을 알게 되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는 게으름뱅이들을 미워한다.(63쪽)
-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
나는 니체처럼 게으름뱅이 독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 글을 독자가 대충 읽어도 감지덕지할 일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