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에겐 의식 정화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민경, 봄알람, 2016-08-02.
“집에서는 안 그래요. 부드러운 남자에요.”
집에서 부드럽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집에서는 안 그런데 왜 밖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가. 어떤 행동은 집에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밖에서 해서는 안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있다.
여러 가지로 두 부부의 발언에 적잖이 놀라고 있다. 나랏일을 하겠다고, 큰일을 할 사람이라 자청하며 목소리 높이고 있는 누군가의 ‘언어’는 개인의 언어로서도 부적절하다.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의 언어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투표일을 앞두고 뱉은 말들을 주워 담기 위해 ‘이해시키려’ 쏟아내는 말들은 오히려 앞의 언어가 ‘한번 삐끗’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 언어가 빠져 나온 통 속에는 동종의 언어가 가득함을, 언어통을 지배하는 ‘인식세계’의 수준이 어떠함을 드러낸다. 이 인식체계에서 주워 담은 언어통 속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무한재생일 뿐이다. 그들이 이해를 시키려 노력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 책 작가의 말대로 이해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면 ‘이해를 시키려 노력한다’는 말, 묘하게 모순입니다. 이해란, 원래 시키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대화를 마치고 ‘이해시키느라 힘들었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상대가 해야 할 이해를 도와주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힘에 부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힘을 키우면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말하겠으나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해가 누구 몫이어야 하는지는 짚어둡시다. ‘이해’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누가하고 있는지도 봅시다. p21
“설거지를 어떻게….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남녀 일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비하, 성차별 발언이라며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아들은 “아버지는 집에서는 설거지, 청소, 빨래도 자주 하시고 라면도 잘 끓이시는 자상한 분”, 부인은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한다”라며 아버지를 두둔했다, 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편이 말한 것이 거짓말임을 밝혔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안된다면서 참 쉽게도 거짓말 하는 대통령 후보를 만난다.
이 발언이 ‘여성혐오적 발언’이라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후보는 “스트롱맨이라서 웃자고 한 소리다” “센척할려고 한 소리다” 라고 변명했다. 웃자고 한 소리라는 말에 정작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건가. 더 정색할 말이 이어진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말도 자당 후보를 향한 비판에 유권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언어’를 구사한다. 아니 수습의 언어라고 해야 하나. 같은 통에서 꺼낸 말로 당 대변인은 한마디 덧붙였다. “설거지 발언은 이 시대 남성 심경을 대변한 것이다.”
이 말이 여성혐오의 표현만이겠는가. 남성차별의 언어이기도 하다. “강한”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성을 폄하”하는 데 기대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강함의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그 강함은 자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여성을 비하하고서야, 여성을 깔아뭉개고서야 비로소 제 위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성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또한 그 속에는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성혐오”의 표현을, 행동을 감행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도 분명 포함되어 있다. 이 잘못된 언어의 중심에는 결국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있는 것이다.
이 “강한”남성들의 세계관은 여성비하, 폄하 못지않게 남성 자신들의 비하와 폄하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강한 남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여성혐오를 하용하면서 “남성적이지 않은 남자들”을 지적하고 걸러내 또한 차별하고 있음을 정녕 모르고 있는 건가.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 행하는 행동이라는 데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아 외면하는 행동 패턴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인식세계다. 굳이 가부장제를 끌어 오고 싶지 않지만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얻어낸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스트레스와 공포를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성집단”을 차별함으로써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 대상을 줄이고 싶은. 정의와 평등의 언어가 아니라 혐오의 언어로 제 존재적 증명을 펴려는 그들만의 언어의 세계. 이 혐오의 언어가 ‘개인’의 언어가 아니라 점점 집단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배제하려는 이유는 결국 제 것을 더 갖기 위한 발악이다. 한편으로 이 여성혐오의 언어는 물론 주욱 이 나라에서 이어져오고 잘 써먹어 온 말이다. 그러나 변화하지 못하는 소멸되는 언어로 만들지 못하는 건 헬조선 사회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며, 특정한 권력이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이유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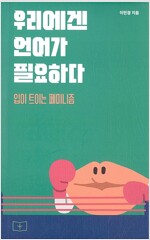
이 책 <우리에게도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 다른 페미니즘 책보다 그렇게 흥미를 당기진 않았다. 최근 페미니즘 관련 책들이 너무 쏟아져 나와서 비슷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분명, 환호할 정도의 공감이나 끄덕거림보다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오늘 문득, 한 대선 후보의 발언에 반응하는 내 언어가 이 책에서 말하는 바와 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