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 싶지 않은데 웃음이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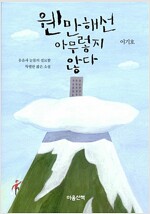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이기호 , 박선경 (그림) .
의도한 것인지 이기호의 소설은 읽기 전부터 웃음이 유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그 웃음이 길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에 함정이 있다. 이 책도 그 중에 하나다. 제목에서 주는 느낌,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 속에 담겨진 웃다 앓을 이야기들. 그런 것 같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는 소설.
이 소설집도 최근 여러 편의 소설집의 계보를 잇는 짧은 소설의 묶음이다. 단편소설과 중편소설로 페이지가 정해진 소설의 흐름이 어느덧 짧은 이야기로 바뀌는 건가. 최근 출간된 여러 편의 소설에서 이런 경향을 봤다. 이것은 작가의 의도인지 편집자의, 출판계의 의중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후자일 수도 있는 게 특정 출판사에선 아예 짧은 소설 위주의 시리즈를 기획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것을 봐선 이런 분량의 소설을 작가에게 요구했겠거니 싶다. 이런, 그 출판사가 이 출판사였다. 정이현의 <말하자면 좋은 사람>과 같은 스타일. 소설의 분량인들 무슨 상관이랴. 글이, 이야기만 좋다면 그것에 마음을 주면 되는 것일 뿐.
어쨌든, 이렇게 짧은 소설의 계보에 이기호도 참여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전반적으로 몸은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예사스럽지 않다. 움직이고 움직이며 무언가를 하고는 있는데 그 모습이 어째 뒤뚱뒤뚱 허둥지둥 위태롭기만 하다. 소설의 세계가 상상이 아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때, 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애타게도 안쓰러운 모습들을 보인다. 이기호의 전작 소설 제목이 떠오르는 건 그래서일 것이다. <갈팡질팡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현실적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낮은 곳으로 임하라>의 청년들의 이야기가 맴돈다. 소설집의 제목이 짧은 소설의 제목이 아니라 이야기 속의 문장이었다.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를 겪는 청년들의 표정이 이 제목과 겹쳐진다. 그래도 웬만해선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겠지. 부모에게서 사업자금을 얻어낼 형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다행이지 않은가, 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으니까.
준수는 강원도를 향하는 내내 말없이, 어쩐지 비장해 보이기까지 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게 단순히 우리 미취업자들의 일상 표정이라고만 생각했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과 땀에서 배우라는 말,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무표정하게 변해갔고, 결국은 지금 준수가 짓고 있는 저 표정, 그것이 평상시 얼굴이 되고 말았다. 웬만해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나도 눈높이를 좀 낮추고 취업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찌된 게 이놈의 나라는 한번 눈높이를 낮추면 영원히 그 눈높이에 맞춰 살아야만 했다. 그게 먼저 졸업한 선배들의 가르침이었다. 내 땀과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의 땀의 무게가 다른 나라. 설령 눈높이를 낮춰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월급에서 학자금 융자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라…….
강원도에 갔다 온다 한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거기 가면 눈높이 따윈 없겠지, 생각하며 나는 두 눈을 감았다. p25~26
한편, 현대 사회 속에서 가상의 세계에 빠져 허우적이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다. SNS의 세계에서 자신을 가상하고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에 관한 이야기도 이 책에 실려 있는데 이 인터넷상에서 가상의 나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관해서 정이현의 짧은 소설집에도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 그 두 이야기를 비교하는 맛도 좋을 듯하다.
인생은 <초간단 또띠아 토스트 레시피> 같은 것일 게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쉽다고 세상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세계는 삶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들만을 한다. ‘해야 하고, 할 수 있고’ 그러니 ‘넌 왜 그러고 있니?’ 같은 뉘앙스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흘린다. 돌아보면 모두 힘겨운 삶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너만 왜 그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도 무언가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버팅기며, 들어갈 틈을 주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말은 많았으나, 그저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을 뿐이었다. 나는 그저 무언가를 다시 해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는 괜스레 케이블TV 속 셰프가 원망스러웠다. 누구에겐 초간단 요리가, 또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음을……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p184
힘겨운 삶을 버팅기며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말은 그것일까. <이젠 애쓰지 않아도 돼요>라는 말. 그것이 포기의 낙심의 말로써가 아니라, 진심어린 위로와 희망의 말로써 건네고 듣는 말로.
그 형 딸아이 말이야,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내 오촌 조카가, 제 아빠 얼굴을 쓱 한번 문지르더니 귀에서 뭔가를 쑥 빼내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 이젠 애쓰지 않아도 돼요”라고 말하더라고. 그게 뭔지 알겠어?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그래, 그게 바로 보청기였어. 알고 보니 이 형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만 청력도 많이 손상되었다나 봐. 그런데도 그 귀로, 그 청력으로, 이십 년 넘게 가수 생활을 한 거였지……. 그걸 이 세상에서 오직 딸만 알고 있었던 거고. 나? 나는 형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어. 그저, 그 형이 고장 난 귀로 살아온 이십 년을 생각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 p2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