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어진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진리다.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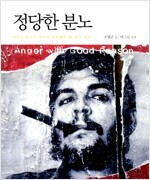
시인으로 등단하여 문화평론가, 강사, 번역가, 방송구성작가 등 여러 직업을 경험한 조병준의 포토 에세이 <정당한 분노>는 ‘때로는 분노가 우리의 도덕률이 될 때가 있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저자의 글에 매그넘의 사진이 실린 이 책에서 제대로 분노를 만날 수 있다.
매그넘은 세계 각국 사진 작가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진 에이전시라고 한다. 1974년 유명한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 등에 의해 설립되어 전세계에 사진을 공급하고 있다. 매그넘의 사진들은 세계 각국의 산업, 사회, 정치, 재난, 전쟁 등의 사건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저널리즘 사진이다. 매그넘은 라틴 문학에서는 위대함이라는 의미를 총의 내포적 의미로 강인함을, 샴페인 양식에서는 축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이 책에선 이런 매그넘의 사진을 보는 기쁨이 있다. 물론, 사진의 내용이 기쁜 것은 아니지만.
표지는 체 게바라의 사진으로 시작된다. 체 게바라에 투여된 이미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이 책의 제목과 사진들과 글의 내용들을 짐작할 수 있다.
분노. 조심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단어에는 힘이 담겨 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던가. 분노가 얼마나 치명적인 부정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성현들이 분노하지 말라고 가르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이 다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분노해야 할 때가 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을 때,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쓰고 냉철해진 머리로 생각을 해도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일 때, 불의와 부패와 부도덕이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고 머리가 아니라 몸이 비명 지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때로는 인내가 아니라 분노가 우리의 도덕률이 될 때가 있다. 불의와 부패와 부도덕이라는 이름의 탱크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그 앞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은 분노뿐이다. p13
분노보다도 꽉 막힌 슬픔이 마구 흘러 들어온다. 사진도 글도 이 세상에 대해 그토록 슬프고 억울하고 아프게 살아간 이들에게 느껴지는 죄책감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억울함과 슬픔이 무력감과 겹쳐진다. 한편,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동질감에 나름 위안을 가진다.
분노. 그렇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자. 800킬로미터의 길을 걷는 동안, 나를 채웠던 감정들 중의 가장 큰 부분은 분노였다. 처음엔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다. 그리고 분노라는 이름의 에너지가 언제나 그러하듯, 그 분노는 부메랑처럼 내게로 다시 날아왔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편협함, 나의 허약함, 나의 탐욕스러움, 나의 비겁함, 그리고 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인간의 속성들이 다 내 안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만큼 큰 고통이 또 있을까. 이미 수많은 성현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다. 분노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분노는 아주 쉽게 그 진행방향을 자기 자신을 향해 전환할 수 있다. p102
작가는 10년 동안 인도와 유럽을 방랑하고 2년간 인토 마더 데레사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한다. 방랑을 시작한 건 삼십 대의 어느 날이었고 거울에서 ‘주어진 인생 앞에 굴복하기 시작한 사내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책은 그 사내가 그 길 위에서 본 또다른 얼굴들일 것이다. 이 글들은 그 사내의 모습을 ‘보고’ ‘떠날 수’ 있던 사내가 보는 눈이었다. 거울 속 사내의 눈이었다면, 이 글들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 이 글과 작가가 만난 풍경과 사람들은 결국 볼 수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 풍경과 사람들이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과오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는가. 나 자신을 향한 분노는 우리의 숙명이다. 인간은 얼마나 약하면서도 오만한 존재이던가. 그렇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때로 나 자신을 향한 ‘정당한 분노’는 우리의 의무가 될 때도 있다. 때로는 내 스스로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죄는 내게 있음을, 따라서 벌도 내가 받아야 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분노의 부정적 에너지가 내 인생을 끝없이 갉아먹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p103~104
그리고 거울을 보던 사내는 길 위에서 체 게바라를 떠올린다. 길을 걷는 동안 내도록 ‘분노’의 감정을 느낀 그 사내는 ‘분노’를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자신이 느낀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불의에 부패에 부도덕에 맞설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한다.
가난, 전쟁, 질병, 소외, 폭력, 억압, 차별, 탐욕…….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불의와 불행들을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 합니다. 혁명을 꿈꾸기에 세상은 너무 단단해졌다고 한숨만 쉬며,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눈 감고 살겠노라고 비겁하게 도망칩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p188
good reason, '합당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선한 이유‘로 풀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혁명이 신화가 될 수 있었던 건 거기에 ’선한 의도‘, 즉 고통받는 민중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애정이 담보되어 있었기에 당신의 븐노는 정당한 분노가 될 수 있었고, 당신의 혁명은 신화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사진들에 첨부한 중언부언들에도 또한 그렇게 ’선한 이유‘가 담겨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거기에 ’선한 의도‘가 먼저 담가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걸 알 만큼은 저도 세상을 살았습니다. p189
폭격처럼 내리던 비가 그치고 찌르는 햇볕이 나왔지만 반갑기보다는 답답하다. 비가 내리는 동안 만들어 낸, 휩쓸고 지나간 상처들이 눈에 쟁쟁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또다른 일들이 마구 만들어진다. 천재지변은 인재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이는 ‘인재’를 만들어낸 주체가 아닌가. 천재지변을 더욱 강화시키는 인재의 모든 주체자들에게 ‘정당한 분노’를 건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