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연극』 2009년 9월호에 기고했던 글을 역시나 뒤늦게 옮겨놓는다. 이 글에서 내가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 역시나 지극히 역설적인ㅡ그러므로 내 경우에 있어서는 대단히 '일반적인'ㅡ주제인데, 이 주제는 이하의 글 안에서 그만큼이나 역설적인 하나의 모토로 요약되고 있다. "정적(靜寂)의 비명, 다성(多聲)의 침묵"이 바로 그것. 말하자면 나의 질문은, 연극음악 안에서, 그리고 연극음악을 통해서, 소리 없는 비명은 어떻게 들리게 되는가, 그리고 웅성거리는 침묵은 또한 어떻게 들리게 되는가, 하는 일견 모순적인 문제들인데, 나는 이러한 지극히 역설적 형식의 질문들이 연극음악을 위한 핵심적인 물음들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데에 아마도 나의 가장 큰 '역설'이 있을 것이다. 연극음악은 '기형적 공감각'의 산출을 목표로 해야 하며, '연극적 실재'를 [찰나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추구하는 연극음악의 '역설적 존재론'임과 동시에 '이상적(理想的/異常的) 방법론'이기도 하다. 고로, 환면(幻面)을 어떻게 내파(內破)할 것인가.
2) 내 글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기대되는 어떤 역설적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사족(蛇足)이 아니라 일종의 사두(蛇頭)를 붙여보자면, 나는 얼마 전에 김온 작가 덕분에 새러 케인의 「4. 48 정신이상」의 불역본을 구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이는, 이하의 글에서 내가 문제 삼고 있는 영어 원문과 독일어 번역에 '임상적 증례'를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불역본에서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옮겨지고 있었다: "la capture/ la brûlure/ la rupture/ d'une âme" 이것이야말로 실로 최고의 번역적 '사치'ㅡ혹은 최고의 번역적 '무위'ㅡ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곧 '[연극]음악적'으로 다시 '번역'해보자: 그러므로 문제는 '리듬'인 것이다, '의미'가 아니라. 또한 문제는 '사유의 전이'인 것이다, '주제의 이식'이 아니라.
(2010. 2. 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리 없는 비명은 어떻게 들리는가
— '기형적 공감각'으로서의 음악과 '연극적 실재'
최 정 우 (작곡가/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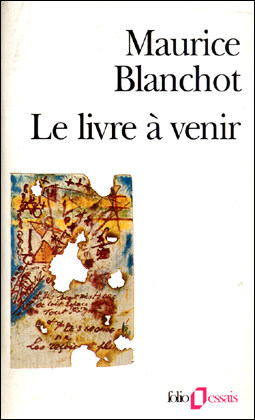
▷ Maurice Blanchot, Le livre à venir, Paris: Gallimard(coll. "Folio essais"), 1986[1959¹].
모리스 블랑쇼(Maurice Blanchot)가 말하듯, 창조적인 경험의 일기는 그 은밀한 움직임이 심화될수록 "추상성이라는 비개인성(l'impersonnalité de l'abstraction)"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도래할 책(Le livre à venir)』). 제가 연극 안에서 음악을 생각하는 방식, 혹은 저 추상성의 음악적 '번역어'로 즐겨 선택하는 구절은 '정적(靜寂)의 비명, 다성(多聲)의 침묵'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반적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제가 음악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니고 품게 되는 일종의 다짐이자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명은 소리 지르지 못한 채 속으로 파열하고, 침묵은 여기저기서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로 울려옵니다. 하지만 물론 말은 음악이 아니고 음악 또한 말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음악과 연극은 지극히 '번역적'인 관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는 새러 케인(Sarah Kane)의 희곡 「4. 48 정신이상(4. 48 Psychosis)」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e capture/the rapture/the rupture/of a soul."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일종의 '번역 불가능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 말들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번역 불가능성'이란 단순한 번역상의 좌절감이나 당혹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근대와 현대, 유럽과 아시아, 혹은 지금의 이곳과 그때의 저곳을 가르는 묘한 '현기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을 되씹고 곱씹고 있는 저의 눈에 이 문장에 대한 독일어 번역("die Verhaftung/die Verzückung/die Zerreißung/einer Seele")은 하나의 사치로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구어(印歐語)와 알타이어 사이의 간극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 구절에 대한 번역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어가ㅡ독일어와는 다르게ㅡ그 구절의 선율과 리듬을 '번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逆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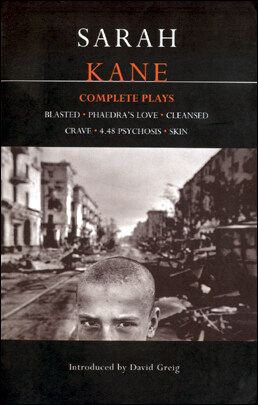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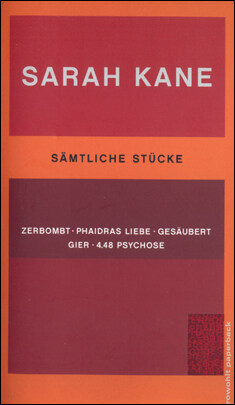
▷ Sarah Kane, Complete Plays, London: Methuen, 2001.
▷ Sarah Kane, Sämtkiche Stücke, Hamburg: Rowohlt, 2002.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불일치와 어긋남 속에서 연극과 음악 사이의 관계가 지닌 독특한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극 안에서 음악은 언제나 넓게는 이러한 '번역'과 '번안' 사이를, 좁게는 '독주'와 '반주' 사이를 오고갑니다. 이러한 현기증의 해결은 요원하며, 우리가 흔히 '해방'이라고 부르는 것(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결국 지금 여기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새러 케인의 구절을 차용하자면, 일종의 "독주 교향곡(solo symphony)"을 만들어내는 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단성의 합창'을 배반하고 위반하며 그것을 '다성의 침묵'으로 은밀하게 확장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소리 지르지 않는 비명', '다성의 단선율'이라는 지극히 역설적인 표현은 어쩌면 '불가능한 번역'으로서의 연극음악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연극음악은 바로 이러한 '불가능'의 조건으로부터 비로소 '가능'해지는 무엇입니다. 연극음악은 무엇보다 연극에 대한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그 어조와 선율과 리듬을 어긋나게 옮겨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하나의 역설적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의 현기증: <4. 48 정신이상>의 한 장면.
장 주네(Jean Genet)의 연극 <발코니(Le balcon)>을 떠올려보죠. 그 작품의 장소를 이루는 매음굴, 그 공간의 바깥은 없습니다. 실제의 혁명도, 실제의 여왕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존재라는 것이 고집스럽게 '실존'만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이 여전히 순진한 솔직함으로밖에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의 시뮬라크르(simulacre)로서 축조된 이 고급스러운 매음굴 속에서, 오직 그 안에서만 그렇게 존재한다는 뜻일 겁니다. 진짜 없는 가짜, 원본 없는 모사. 세상의 모사화(模寫畵)인 이 매음굴은 자신의 원본을 모르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세상의 '거울'이자 욕망의 '텔레비전'으로 기획되었지만, 그 환면(幻面)이 비춰 보여주는 어떤 세상이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온전한 세상, 어쩌면 그 밖에서는 어떤 것도 실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매음굴 안에서 욕망되고 있는 저 모든 이미지들은 언제나 실존의 지위를 초과하고 잠식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그러한 이미지가 '욕망의 수요'를 조절하고 '실존의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표로서 기능하는 것이죠. 영원히 반복해서 들려오는 연극 속의 저 총탄과 폭탄의 소리들은, 그래서 단순한 폭발(explosion)의 소음이 아니라 어떤 내파(implosion)의 징후들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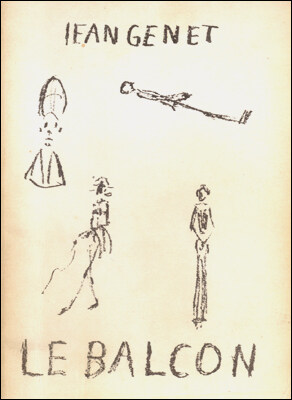
▷ Jean Genet, Le balcon, Paris: L'Arbalète, 1983.
인물들이 매음굴 안에서 펼치는 놀이는 주인과 노예의 은밀한 변증법을 따르고 수행합니다. 이들의 '가학-피학(SM)'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사드(Sade)'와 '자허-마조흐(Sacher-Masoch)'의 이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노예(Slave)'와 '주인(Master)'의 이니셜일 겁니다. 그곳에서 사고파는 것은 단순한 성(性)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 진짜 몸이 아닌 기호(sign)로서의 몸이며, 그들은 그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하고 유통시키면서 욕망이 언제나 무엇보다 타자(他者)의 욕망임을 증거하고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무대는 욕망의 시장인 매음굴인 동시에 '죽음의 왕궁'이자 '삶의 감옥'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미지 속에서 죽음의 '절대성'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으로 완성되는 존재, 이는 주네가 이미 『장미의 기적(Miracle de la rose)』(1946)에서 아르카몬에 대한 동경과 그와의 '신성한' 합일을 통해 보았던 악(惡)의 절대성에 대한 또 하나의 변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향유하는 놀이는 무엇보다도 죽음의 놀이이며, 이 놀이는 때로는 다른 이름을 달고 때로는 다른 역할의 의상을 입고 영원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음악과 연극 역시 이러한 '놀이' 안에 위치합니다. 그 안에서 음악은 연극의 '다른 이름', '다른 의상'이 되고자 합니다.

▷ 환면의 환면: <발코니>의 한 장면.
따라서 연극 속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란 어떤 직선적인 전복이나 찬탈 또는 일회성의 단절이 아닙니다. 혁명은 오히려 하나의 갱신(更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차이를 지어내며 계속 반복되는 나선형의 순환 구조 속에 삽입된 하나의 후렴구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을까요? 혁명의 노래는 매번 다른 이름을 위해 그리고 매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불릴 테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발코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기존 권력의 부패나 혁명의 진정성과 같은 지극히 '상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혁명과 권력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환상성과 허구의 힘, 곧 '실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연극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구조를 비춰봅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쫓고 뱉고 먹고 싸며 살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잠을 자고 또한 이미지가 깨어나서 걸어 다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연극 속에서 이미지의 삶과 죽음을 봅니다. 환면의 환면, 이것이 바로 '연극적 실재'입니다. 어쩌면 연극음악은 이토록 '시각적'인 은유 속에서 지극히 '청각적'인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형식일 겁니다. 거울은 다른 거울 속으로 제 자신을 복제하고 연극은 또 하나의 연극을 배 밖으로 잉태합니다. 배보다 더 큰 배꼽, 배 밖으로 비집고 나온 또 하나의 배, 사실 그것은 어떤 유별난 기형이나 변종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미지의 '전형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연극과 음악은 이렇듯 배보다 더 큰 배꼽의 형태로, 그런 기형 아닌 기형의 모습으로, 서로를 향해,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무엇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감각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음악이 저 블랑쇼의 말처럼 "추상성이라는 비개인성"을 획득하는 길은, 이렇듯 그 자신의 역설을 바로 그 역설 자체로 통과하는, 이미 그 자체가 가장 역설적인 하나의 길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비명을 들리게 할 것인가, 혹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소리를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이 지극히 역설적인 질문들은 연극음악이 언제나 근본적으로 묻고 품어야 할 청각적이며 시각적인, 따라서 지극히 공감각적인 물음이 되고 있습니다.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