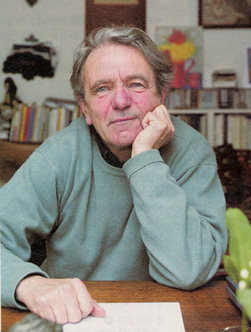
1) 이틀 전 주간지 <시사IN>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주어 자크 랑시에르와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다. 나에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는 양창렬 선생이, 그리고 <한겨레> 인터뷰는 진태원 선생이 각각 맡아 진행했다. 녹녹치 않은 두 개의 인터뷰를 마친 직후인데도 랑시에르는 내 질문들에 성의를 다해 자세하게ㅡ게다가 자상하게(!)ㅡ답변해주었다. 좋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게다가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랑시에르의 책 세 권에 사인을 받는 여분의 즐거움도 있었다.
2) 랑시에르의 사유를 그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네 번의 강연이 현재 서울의 몇몇 대학에서 펼쳐지고 있다. 네 번의 강연이 모두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데("민주주의와 인권", "감성적/미학적 전복", "동시대 세계의 정치적 주체화 형태들", "테러가 뜻하는 것"), 이 각각의 주제들이 모두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랑시에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들이어서, 알찬 연속 강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 랑시에르 블로그에서 자세한 일정을 참조할 수 있다(http://ranciere.wordpress.com).
3) <시사IN> 기사는 아마도 다음 주(65호)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경향신문>, <한겨레>,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에 실린 랑시에르와의 인터뷰 기사들을 옮겨놓는다:
① <경향신문> "해방은 인민의 주체적 역량으로만 가능" (2008. 12. 2.)
② <한겨레>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새 정치의 희망" (2008. 12. 2.)
③ <연합뉴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연대가 필요하다" (2008. 12. 2.)
④ <동아일보> "욕망 제어 못하는 민주주의, 사회질서 해치는 정치과잉" (2008. 12 . 3.)
4) 기사 제목을 뽑은 것을 보면, 각각의 언론들이 어떤 논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한 랑시에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인데, 나는 도대체 랑시에르와의 인터뷰에서 "욕망 제어 못하는 민주주의, 사회질서 해치는 정치과잉"이라는 제목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매우 '징후적'인데, 이러한 제목을 통해 우리는 기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ㅡ또는 혹시 아무 생각 없는 것은 아닌지ㅡ추측해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랑시에르가 말하는 '과잉'은 정치적 주체화의 한 조건으로서, 이는 또한 불화와 불일치 자체를 정치의 조건으로 보는 그의 기본적인 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목은 <동아일보> 기자의 '무지'의 결과일 것인가, 아니면 '의지'의 표현일 것인가?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되는 일들은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5)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랑시에르의 방한에 관련된 나의 개인적인 느낌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랑시에르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거의 모두가 한국정세나 세계정세와 관련하여 랑시에르로부터 어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언급들을 끌어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식-대중'이 랑시에르라는 철학자와 그의 이론에 기대하는 부분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나 개인적으로는 그의 방한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정치와 철학에 대해 사유하는 한 명의 '석학'으로부터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정세 진단에 관한 언급들을 듣는 '제한된' 경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사유하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 일은 결국 언제나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이 '우리'는 물론 민족주의적인 '우리'가 결코 아니다).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랑시에르에게 의견을 묻고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랑시에르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자신의 이론에 입각한 다분히 일반론적인 언급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한국의 여러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해 랑시에르의 입을 차용해 진단을 내리거나 분석을 행하는 것이 되기보다는(이러한 측면의 가장 부정적이며 파렴치한 사례를 저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랑시에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논의들을 최대한 잘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겐 우리의 정치적 문제에 관해 어떤 해외 석학의 고견을 듣는다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며 우리와 비슷한 층위의 이러저러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사유하고 있는 한 프랑스 학자의 논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 내게는 이 점이 중요하며 또한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랑시에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역시 한국정세에 대해 자신이 직접적으로 말한 '일반론'이 통용되는 일보다는, 자신의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치성을 조직해내는 일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6)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또한 랑시에르가 서울에서 갖는 네 개의 강연이 모두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학생 또는 지식인이 지닌 어떤 지적/담론적 권위에 대해 랑시에르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랑시에르의 논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 다시 말해 그의 논의가 가장 먼저 전달되고 전유되어야 할 곳은, 지식인/대학생 등의 자리가 아니라ㅡ하기야 현대의 대학생들을 과연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지만ㅡ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몫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그를 통해 자신들을 정치적 주체로 조직하고 형성하는 자리가 아닐까(물론 그러한 여러 자리들 중의 하나가 '대학'이라는 공간임 또한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하자면, 이는 정치에 대한 랑시에르의 사유를 가장 '급진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독점적인 '장소'와 '청중'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일 수 있을 텐데, 나는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랑시에르의 정치적 논의들을 일종의 '무기'로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강연들이 진정 '개방적'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묻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다소 회의적이다.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