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막돼먹은 영애씨'에서 개지순이가 집들이를 가서는 돈은 안 들이고
시를 읊어준다고 분위기를 잡았던 적이 있었어.
그때 읽었던 시가 이 시란다. 최영미의 선운사에서...
선운사에서... 니까, 선운사엘 갔겠지?
거기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생각했겠지? 그걸 살펴 보자.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잊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최영미, 선운사에서>
1연에서 꽃이 피는데 한참 걸리다가 지는 건 순간적이란 이야기를 한다.
4연에서 같은 구절인데, 꽃이 지는 건 쉬운데 잊는 건 한참이란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깐, 꽃의 피고 짐을 인간의 <만남>과 <이별>과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깐, 꽃은 '자연물'이면서 '임'의 상징이 되겠구나.
잊는 일은 참 힘들잖아. 그런데, 쉽게 안 잊히니깐,
2연에서 쉽게 잊고 싶다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3연에서 그대를 자꾸 부르고,
4연에서 잊는 건... 영영... 한참만에 잊게 된다는 건...
영영... 잊을 수 없다는 말의 반어적 표현이 되겠다.

마치 김소월이 '먼 훗날'에서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 때에 잊었노라.'던 표현이,
실제로 잊을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영영 잊을 수 없다는 말의 반어적 표현을 통한 강조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지.
이 시의 주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 되겠지.
최영미 시인은 1994년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집을 발표해서 갑자기 유명해 졌어.
한 해 동안 50만 부 이상을 판 시집은 거의 없거든.
1980년대까지의 시들은 참 비장하고, 장엄하게 폼잡는 걸 최고로 여겼는데,
1990년대부터는 가볍고 경쾌하게 비트는 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음악에서도 서태지라든가 랩을 부르는 가수들이 마구 치고 나오던 시기야.
내용보다는 경쾌한 리듬 같은 것 말이지. 은지원 같은 애들이 당시 인기인이었단다.
그런데, 시도 통일을 노래하고, 민중을 노래하던,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의지를 가지자던 시들은 신세대의 취향에 맞지 않게 된 건지 몰라.
세계적으로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예술이 생겨났지.
최영미 시인은 그렇게 유명해졌던 사람이란다.
고작 서른 살 살았던 주제에, 이 사람이 1961년생이니 1994년이면 33세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삶에 대한 통찰과 의지를 보여줘야하는 시인이 되기엔 젊은데,
벌써 <잔치는 끝났다>고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외친거지.
구경꾼들은 '이거 뭐야? 도대체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보자.' 이런 호기심도 많았을지 모르겠다.
암튼 그의 이별 노래를 한 편 봤으니, 대표적인 이별 노래를 한번 읽어 보자.
이형기의 <낙화>도 참 유명한 작품이야.
20년 정도 전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시란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낙화>
이 시에서도 꽃이 지는 것을 '이별'에 빗대고 있지.
인생과 자연을 이렇게 빗대놓고 보면, 멋진 유사점들이 도출된단다.
이런 것을 관조라고 하고, 비유의 방법을 쓴다고 하지.
내가 이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이란다.
하롱하롱~~을 입 속에 넣고 가만히 읊어보면 참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것 같거든.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도 읽어 보면 운율이 참 잘 멋있어 보이지.

이 시에서는 <역설법>을 공부해 보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 두 구절을 보자.
이별이 축복이래. 좀 웃기잖아.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이지.
만남이 '축복'이고, 이별은 '불행'이고 뭐, 이래야 어울리잖아.
청춘이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 '꽃답게'란 어휘랑 어울리지 않거든.
나의 청춘이 비참하게 죽어야 또 어울리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모순되는 시어들의 결합이 더 큰 강조의 효과를 드러낼 수도 있단다.
이 시를 읽어보면, 이별하는 과정에서 <성숙>을 배우게 되고,
그것은 자연에서 <낙화>를 통해 <결실>이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관조적으로 바라본 거지.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한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저 구절들을 읽어 보렴.
옛날에 노래 가사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래가 있었단다.
꼭 고통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힘든 일을 겪으면서 병이 생기고 만다면 힘든 일을 회피해야 하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성숙되는 일이라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해>야겠지?
고려 가요 '가시리'나 김소월의 '진달래 꽃'과 같이 이별의 정조가 강한 노래지만,
그 속에서 성숙하는 영혼을 발견한 통찰력이 이 시를 명작으로 만든 것 같다.
물론, 시라면 읽는 데 매끄러운 발음, 편안한 끊어읽기도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말이야.
똑같은 역설을 말하는 시가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할게.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란 시야.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핫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세이고.......
허이연 허어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서정주, 견우의 노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날이 있으려면 일단 <이별>이 전제조건이지.
이별하지 않으면 만남이 의미가 없잖아.
1년간 그렇게 간절히 바라만 보다가 1년에 단 한 번 만나게 되는 기막힌 운명.
그들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시를 쓰고 있단다.
1연은 역시 '역설'임을 알 수 있겠지?
'물살, 바람, 은핫물' 같은 것은 사랑의 장애물들이다.
전에 이 전설의 교훈이 <사랑에 빠지더라도 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말자> 뭐, 이런 거랬잖아.
그러니깐, 이 시에서도 마지막에
나는 암소를 열심히 먹이고,
그대는 비단을 짜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다.
맨날 사랑한다고 발렌타인 데인 초콜릿만 사고 있으면,
소는 누가 키울거야, 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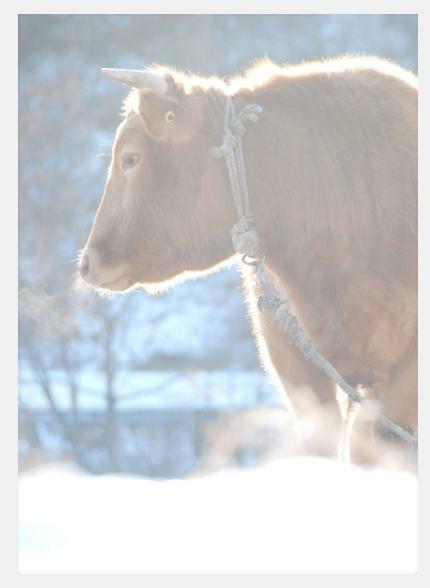
이러다가 견우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지게 된 거니깐 말이야.
'견우와 직녀' 설화를 차용하여 사랑의 참된 의미를 제시하려고 한 시라고 볼 수 있단다.
이별이 곧 슬픔만이 아니다.
이별은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이런 역설적 표현을 통해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형상화하려고 한 것이지.
세상 만사가 <새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좋은 일에는 반드시 불행도 숨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슬픈 일이라 해도 또 역시 행운도 붙어 다니게 되어 있는 것.
좋은 일이라고 그저 헤헤거리는 놈도 바보가 되고,
슬픈 일이라고 그저 머리 처박고 울고만 있는 놈도 바보라는 이야기겠다.
변방의 노인네가 말이 한 필 있었는데,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That's too bad.'하고 위안을 했더니, 'Not so bad.' 이랬다는 거잖아.
근데 그 말이 암말을 하나 데리고 와서 엄청 경사가 났다는군.
(유목 민족에게 말이 하나 늘었다는 건, 농경 민족이라면 땅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지.)
또 동네 사람들이 'That's so good.'이렇게 부러워 했더니, 'Not so good.'이런 거지.
요즘 말로 하면, 차도남(차가운 도시 남자)이나 까도남(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정도 되려나? ㅋ
근데 아들이 새로 온 암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고, 또 할배는 '뭐, 나쁘기만 하겠냐?' 이랬다지.
지 아들 다리가 병신이 됐는데... 좀 웃긴 남자지.
근데 전쟁이 나서 동네 아들들을 다 나가서 죽었는데 그 아들은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도 되었다는 뭐, 그런 게 <새옹지마>잖아.
민우가 이적지 해온 고등학교 생활이 무척 훌륭했다면,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닐 수 있다고 돌아 보고,
거꾸로 불만스러웠다면, 그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긍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지.
그런 <통찰력 insight>을 가지는 일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단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고, <관조>를 잘 얻어내는 사람이기도 할 거야.
민우도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