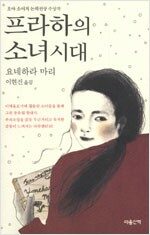요네하라 마리는 알라딘 편집팀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작가였다. 과거형을 쓴 것은 '편집팀'은 이미 '도서팀'이 되었고, 구성원들도 대부분 바뀐지 오래기 때문. 이런 사정과는 무관하게, 새로 출간된 요네하라 마리의 <미식견문록>은 여전히 좋다. 군침도는 음식과 당장이라도 친구에게 전화 걸어 '너, 이거 알아?'라며 얘기해주고 싶은 흥미로운 지식들이 맛깔나게 녹아있는 것이다.
사실 책을 파는 일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은 좋은 책을 추천하는 일이다. 재미있다, 좋다, 읽어 보세요. 하지만 대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마련이고, 관계를 의심하는 연인에게 필사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연인들은 이벤트를 하고, 책 또한 마찬가지.
'좋다'는 말은 이미 위에서 했고, 출간 기념 이벤트 역시 진행되고 있으므로(여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미식 견문록>을 지니고 다니며 읽었던 지난 며칠 간, 내게 일어났던 '이상한 일'에 대해서. 그리 거창한 일은 아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인, 자질구레한 체험인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기록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렇게 쓴다.
원치 않는 분들은 읽지 않아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해야 하는 이야기는 '좋다' 한 마디에 있으므로. 하지만 펼쳐진 부채살의 골처럼 때론 접혀 보이지 않는 일상의 이면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내 기분을 이해할 것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신종 플루, A형 간염, 수족구병 등에 이어 세균성 장염이 유행이라고 한다. 신상 가득한 매장에서 쇼핑하는 기분으로, 고민 끝에 장염을 골랐다. 음주 습관과 식습관 등 내 스타일엔 역시 장염이 맞다는 의견에 그만 얇은 귀가 흔들렸다. 정확하게는 '불상의 바이러스성 창자 감염'. 그런데 왠걸, 유행이라면 언제나 한 발 빠른 문학MD님이 먼저 장염에 걸린 것이 아닌가. 게다가 풀옵션으로 입원에 90시간 금식까지! 기분이 상했지만 어쩔 순 없었다. 괜히 문학MD는 아닌 모양이다.
물 대신 포*리스웨트를 마시며 며칠간 연명했다. 의학의 발달 보단 조금 더딘 속도로 나아지고 있는 참이었다. 요동치던 장들도 이제는 잠잠해지고. 그런데 식욕만은 어떻게 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처방전을 들고 세 번째로 약을 타러 간 날, 식전과 식후로 나뉜 약의 복용법을 설명하던 약사 할머니에게 "밥을 안먹으면 어떡하나요?"라고 묻자 빙긋 웃음과 함께 이렇게 답해주셨다. "글쎄,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뭐, 별 수 있나?" 아 네…
약사 할머니의 말씀에 감명 받은 나는 <미식견문록>(마음산책, 2009)을 가방에 챙겼고, 출근하자마자 메신저 대화명을 이렇게 바꿨다. "술, 담배, 인터뷰, 남 좋은 일 안합니다" 솔직히 담배는 끊을 자신 없고, <미식견문록> 초반에 나온 보드카 얘기에 술이 조금 당기긴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별 수 없는 것이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올 무렵, 메신저로 담배나 한 대 피자고 나를 꼬셔낸 문학MD님이 문득 옛이야기를 꺼냈다. 좋았던 시절, 술담배는 끝도 없이 하고 인터뷰와 남 좋은 일은 꿈도 안꾸던 그때. 장염은 그저 개가 걸리면 죽는 병이라고 알고 있던, 그럼에도 조심할 생각은 않던 그때 말이다. (그러고보니 장염에 걸리고도 죽지 않았다. 이젠 사람이 된 걸까?)
문학MD는 내게 '간판' 이야기를 했고, 나는 '미끄럼틀'을 생각했다. 좋았던 시절, 만취상태에서 싸운 상대. 물론 '간판'과 '미끄럼틀'은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그 사이에는 5년의 시차가 있었고 전혀 다른 두 여성이 연루되어 있었다. 나는 13년 전 얘기를 이제와서 꺼내냐고 불평했고, 문학MD님은 8년 전 얘기라고 퉁박을 줬다.
마침 저녁에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던 나는 살짝 놀랐다. 그러니까, 8년 전 나와 간판을 싸우게 했던 친구 A. 이런 종류의 동시성(coincidence)은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한다. 빈정대던 문학MD님의 오해와는 달리 한때 나와 선배와 'bizarre love triangle'을 이루었던 그녀는 8년째 열애중이고, 나는 쿨하게도 그 둘과 '좋은 관계'로 남았다. 물론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고, 하나의 간판이 세상을 떠나야 했다… (명복을 빕니다)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는 A는 종종 미식가임을 자처했다. 맛집으로 안내하라는 부탁을 들어준 적은 없지만, 언젠가 조금 색다른 '미식'책을 내고 싶다는 꿈을 살짝 내비친적은 있다. 그때 내가 추천했던 출판사는 바로 마음산책이었다. 역시 마음산책이지, 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왕십리에는 비가 왔고, 우리는 찜닭을 먹었다. 반주도 없이, A는 교정을 하기 위해 사랑니를 뺀지 얼마 안되어 술을 못먹는다 했다, 텅 빈 가게에서 찜닭을 먹고 있자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찜닭이 처음 대중화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무렵이었다. 갑자기 그 시절이 그리워졌다. 하늘은 넓고, 미소는 빛났으며 찜닭집은 언제나 만원이었던 그때. 당면을 뒤적이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있는데 후배 B에게 전화가 왔다. 이른 시간에 잔뜩 취한 녀석의 목소리가 한층 그리움을 키웠다. 한 때 왕십리 바닥에선 담배꽁초보다 이런 녀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지금은 미래도시가 되어 버렸지만.
여자친구와 2시간 전에 헤어지고 혼자 실내포차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B는 생각보다 멀쩡했다. 부러 시간을 끌다 간 그곳에는, 알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시체'를 치우는 편이 차라리 낫다, 그 사이에 연락을 받고 온 후배 두 명이 더 있었다. A, B, C, D… 문득 시간 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비 오는 왕십리.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배는 술에 꼴았으며, 녀석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가 나왔으나, 실상은 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녀석도 질세라, 내게 욕을 한다.
"형, 그거 알아요? 형이 X 같은거. 그래서 내 인생도 X 같지."
"그러니까 니 말은, 내 X 같은 면에 네가 영향을 받아서 너도 X 되었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책임져"
"그래, 니 말대로 나는 X 같아. 그런데 내가 너를 책임진다면 난 더이상 X 같은 놈이 아니잖아? 그러니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영락 없는 8년 전 필름. 그래서 마시기 시작했다. 장 따위는 잊고. 이건 분명 꿈 아니면 '타임슬립time slip'이었으니까. (* 'Life on Mars' 참고) 죽을 때가 되었나 싶기도 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은 과거가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경험한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게 소주병이 쌓여갈 무렵,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선배에게 전화가 왔다. 물론 나한테 온게 아니라 함께 있던 후배C(여, 28세)에게. 이래도 이게 과거가 아니라고? 택시를 타고 출발. 선배들은 취해 있었고, 소녀시대 이야기를 했으며(과거까지 장악해 버렸다!), 우리에게 '보드카 오렌지'(!)를 사줬다.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 홍대 거리의 불빛만 아른거릴 뿐.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타임슬립'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꼬인 시공간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기억이 끊긴 것이리라. 그래도 보드카 오렌지는 맛있었다.
보드카는 이렇게 생겼다. (PPL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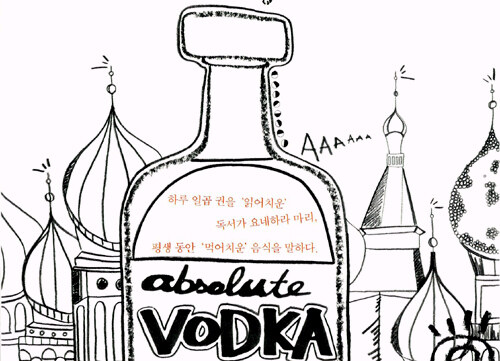
시간여행을 마친 아침, 그 부작용으로 깨질듯한 머리를 안고 일어나 라면을 먹었다. 각각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집으로 출발하려던 차. 책상에 놓여 있던 책을 보고 후배가 말했다. "마리네?" 나는 되물었다. "친했어? 요즘 연락 되냐?"(* 요네하라 마리는 2006년에 세상을 떠났다) 후배가 대답했다. "거 왜, 형이 전에 나 준 <대단한 책>이 이 사람, 요네하라 마리 책 아니야?" 바로 그랬고, 나는 잽싸게 책을 가방에 넣었다. 부천까지는 먼 길이었으니까.
영화는 5시부터, 약속은 1시에 있었다. 부천에 살고 있는 사촌누나(모출판사를 다니고 있음)를 오랜 만에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이 무거웠지만, 요네하라 마리를 읽으며 어느덧 몸에서 알콜이 빠져나가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낄낄 웃으며 책장을 넘기자 라면을 먹었음에도 살짝, 배가 고파왔다. 부천에 도착한 것은 2시 반이었다.
송내 역에서 서로를 발견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못본 사이 몸무게가 *KG 은 늘어있었던 것이다. 반면 누나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너, 이 동네로 이사왔니?" 나는 그냥 비가 온다길래 츄리닝 바지에 슬리퍼를 신었을 뿐인데.
'도가니'탕을 먹으며("진실을 결코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나누던 중, 누나가 사랑니를 뽑고 교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정을 시작하면서 식탐이 늘었다고. 주말에는 이모부가 하는 이것저것들을 토할 때까지 먹는다고도 했다. 이모부는 호텔 주방장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어린 시절, 방학이면 놀러갔던 이모댁. 가난한 우리 집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산해진미가 쌓여 있었으니 그 중에 압권은 역시 홈메이드 생선초밥이었다. 문득 누나가 출생의 비밀이라도 밝히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빠… 다 일식 주방장인줄 알았잖아 그래서… 근데, 양식이었대… 엄마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 이런 일이 있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도가니탕은 무척이나 맛있었다. 아, 우리 모두 밥은 말아 먹지 않았다. 라면이나 생수 아닌 다른 국물에 불은 밥은 맛이 없으니.
무려 한 시간 삼십 분에 걸쳐 밥을 먹은 후, PiFan 극장에 닿았다. 그곳에서 장염이 다 나은 문학MD님을 만났다. 함께 본 것은 '반드시 크게 들을 것'. 락의 불모지 인천, 모텔촌 사이에 오아시스처럼 피어난 클럽 '루비살롱'과 밴드들의 이야기다. 어제 아른하게 과거를 걸으며 보았던 홍대의 불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는 모양.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그리고 이런 명대사도 존재한다.

아 눈물 나서 혼났네.
바람 불어 철제 의자가 날리는 살풍경한 그곳에서 한 편의 영화를 더 본 후 다시 지하철을 탔다. 막차 즈음한 지하철은 한산했고, 나는 다시 요네하라 마리를 읽었다. 덜컹덜컹, 낄낄, 덜컹덜컹, 낄낄. 늦은 밤엔 언제나 그렇듯 신도림에는 쉬이 열차가 오지 않았고, 열차를 기다리며 책을 읽는 내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집에 가도 먹을 건 없잖아. 우린 안될거야, 아마. 생각하며.
결국 15분이 훌쩍 넘어서야 도착한 열차 덕에, 응암역에 내릴 즈음엔 이미 번역자 해설만 남기고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책장을 덮고 지하철 문을 나서는 순간 문득,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완결된 기분. 나는 아팠고 길을 떠났으며 첫 장을 펼쳤고, 이제 나았고 돌아왔으며 마지막 장을 덮었다- 라고 말하고 싶은.
하하, 스스로 생각해도 허튼소리에 그저 헛웃음을 짓고 돌아온 집에는 낮에 다녀가신 엄마가 해놓은 두부전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밥보다 맛있는 밥은 없고 가끔씩 장염에 좋은 책도 있다는 얘기.
이 정도면 이 책이 좋은 책이라는 말을 믿을 수 있겠지?
* 이 글을 쓰는 동안 어떤 간판도 다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Also Availa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