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때문에 여름 기분 확 난다. 7월, 칠월, 줄라이, july! 줄라이 모닝, 은 줄라이 모닝으로 써야 맛이 난다. july morning 이라고 쓰면 어쩐지 반감되는 느낌. 사랑스러운 모국어는 참말 위대하다. 여름을 준비한다. 책과 음악과 영화들. 어지간히 보고 또 보고 쓸고 닦고 들었던 것들이지만 똘똘한 여름 보내고 싶어서. 허전하고 싶지 않아서.
 질 나쁜 연애
질 나쁜 연애
이 여름 낡은 책들과 연애하느니
불량한 남자와 바다로 놀러 가겠어
잠자리 선글라스를 끼고
낡은 오토바이의
바퀴를 갈아 끼우고
제니스 조플린의 머리카락 같은
구름의 일요일을 베고
그의 검고 단단한 등에
얼굴을 묻을거야
(중략)
문혜진의 시집 한권으로 여름을 시작한다.
연애는 여름에 하면 딱 좋다. 적당히 노출된 몸매 때문이 아니라 더운 날씨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너그러워지고 해이해지기 때문이다. 남편을 가을에 만났다. 초여름 무렵, 칠부 티셔츠를 입고 데이트를 했다. 내 팔에는 보송보송하다 못해 거뭇한 털...이 수북했다. 면도기로 박박 밀다가 어느새 포기해버렸는데 아주 제법, 원시인스러웠다. 그걸 본 그가 건넨 한 마디. "왜 진즉에 말 안했어?" 그의 안경엔 빙글빙글 골뱅이 두 마리가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왜? 진즉 말했으면 데이트 안 했을거야? 결국 지금은 부숭한 털들을 다 면도했다. 여름이면 알러지가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온 몸이 간지럽다. 매일 면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나쁘지 않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화가 덜 됐다는 농담을 들었던 초등학교 때 밀어버리는건데. 지금은 그런 농담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나이잖아.
 독일의 휴양지 바덴바덴에 7월의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먼 곳, 슈바르츠 발트나 튜링거발트쯤의 하늘에 보랏빛 먹구름이 걸려있고, 그 너머 더 먼 곳 어딘가에는 번갯불까지 번쩍이고 있었다. 좀 더 도시 쪽으로 가까이 오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이 있으며, 그 언덕에는 빽빽이 초목이 자라고 있었다. 또 붉은 벽돌로 된 알테스 성과 노이에스 성이 보이고, 삐죽이 솟아 있는 탑들과 오래된 기사들의 성도 볼 수 있었다.
독일의 휴양지 바덴바덴에 7월의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먼 곳, 슈바르츠 발트나 튜링거발트쯤의 하늘에 보랏빛 먹구름이 걸려있고, 그 너머 더 먼 곳 어딘가에는 번갯불까지 번쩍이고 있었다. 좀 더 도시 쪽으로 가까이 오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이 있으며, 그 언덕에는 빽빽이 초목이 자라고 있었다. 또 붉은 벽돌로 된 알테스 성과 노이에스 성이 보이고, 삐죽이 솟아 있는 탑들과 오래된 기사들의 성도 볼 수 있었다.
<치프킨, 바덴바덴에서의 여름>
도스토예프스키와 두번째 아내 안나의 여정을 담았다. 역자 이장욱의 말처럼 '이 소설은 픽션과 다큐의 경계에 있다' 끈질기게 도박에 미쳐있는 도스토예프스키와 그를 위해 숄까지 팔아 밑천을 대준 안나의 이야기는 여름을 진득하게 이겨내는 사랑의 묘안처럼 들린다. 아끼고 사랑해마지 않는 책.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여름 휴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여름 휴가-
섹시해 보이는 소녀가 있고,
그소녀를 경계하는 어른 여자가 있고,
소녀와 왠지 잘 어울리지만 여자가 보기엔 자신과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섹시 가이가 있다. 사랑의 신 큐피드는 누구일까. 결론은 큐피드의 말로다. 큐피드여, 사랑을 전도하고 연결해줄 거라면 힌트라도 먼저 주시길.
소녀와 여자가 함께 요트를 타고 짧은 항해를 한다.
그것만으로도 여름이 성큼 느껴진다.
바다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이 느껴지지만
외려 바다와 요트를 보고 있으면 얼른 구명조끼라도 입어줘야 할 것 같은 간절함에 몸살이 날 것 같다. 거실에서 허리에 튜브를 끼고 앉아 있어볼까. 아주 재미있을 것 같지만, 혼자 있을때만 그래야겠다.
 Myrra, Sweet Bossa-
Myrra, Sweet Bossa-
두 장의 씨디가 들어있다.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바람같은 음색이 매력이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의 햇빛이 휘황찬란할 때
미라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드라이브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긴다.
첫번째 트랙 Taxi Driver, 는 사랑 고백을 하러 가야 하는데
택시 운전사가 아주 느긋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How insensitive 에선 사랑이 떠나간다. 택시를 타고 사랑 고백하러 갔던 여자가 결국 사랑이 떠나 어떻게 냉담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걸까. 고백했으니 아름다웠다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았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연애, 사랑인 거 같다. 여름엔 실연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하긴 어떤 계절에도 실연은 위태로운 계절이다.
 차가운 벽, 트루먼 카포티-
차가운 벽, 트루먼 카포티-
차가운, 때문에 고른건 아니다. 어떤 여름날엔 짧은 이야기를 빨리 흡수하고 싶을 때가 있다. 단편 소설도 길 때가 있다. 엽편 소설은 흔하지 않다. 단편과 엽편 사이의 이야기들, 그러나 스펀지 흡수의 속도만큼 어떤 이야기가 살갗에 심장에 스며들어 줬으면 할 때, 이 책이다. 그의 명성 <인 콜드 블러드>에 비해 아주 흡족한 소설은 아니지만 아주 실망스러운 소설도 아니다. 나를 툭, 치고 가버리는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여름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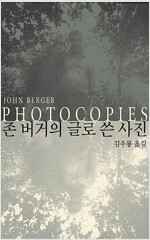

이윤기가 건너는 강, 이윤기-
존 버거의 글로 쓴 사진, 존 버거-
아웃사이더 예찬, 마이클 커닝햄-
이윤기의 에세이가 왜 좋으냐하면 옆에서 나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것 같아서다. 야야, 좀 들어봐, 이런 일 있었는데 난 이렇게 해버렸다, 그거면 됐어. 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슬금슬금 말을 걸어오는 느낌. 소나기 같은 이야기들, 소나기처럼 빠르지만 여운이 남는 이야기들.
존 버거는 언제나 그렇듯 섬세한 사람이다. 사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글자로 사진을 찍고 있다.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활동사진으로서의 글을 썼다. 수변공원 산책로에서 자주 만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연상하게 한다. 유모차의 여인, 자전거를 탄 여인이 그렇다. 풀밭위의 그림, 도 자주 보는 풍경이다. 거기에 나만 포착하고 존 버거는 포착하지 못한 풍경은 -다리 밑에서 고기를 굽는 사람들- 이다.
마이클 커닝햄! <세월, The Hours> 를 사랑한다. 영화도, 소설도 아주아주 좋다. 그가 말하는 프로빈스 타운에 갈 일이란 까마득한 먼 약속이겠지만 왠지 그와 함께 장도 보고 시청 화장실에들러 본 느낌도 든다. 완벽하게 그 지역색이 도드라져 한참 읽다가 내가 이걸 왜 읽지...하는 느낌은 잠깐 들지만 그래도 좋다.
여름이 왔다. 잘 견뎌내고 싶은 마음이나 잘 지나가리라는 기대는 없다. 봄을 살아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바지런하게 살아서 옹골찬 가을을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잘 투과하고 싶은 계절이다. 견딘다고, 지나갈거라고 일상의 아픔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저 묵묵히, 그러나 괜찮다는 말은 남발하지 않으면서 잘 지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