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요리 레시피나 요리 블로거들을 탐독하는 걸 즐긴다. 가끔은 이야기 책들이 재미없으면 요리책을 펼쳐 읽기도 한다. 레시피에는 과거형이 없다. 레시피를 참조하여 요리 하는 순간은 언제나 지금, 현재다. 볶는다. 끓인다. 뿌린다. 담는다. 조린다. 익힌다...등등. 이것이야말로 현재행 소설의 백미가 아닐까.
주말 오후 12시에 일주일치를 재방하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을 자주 본다. 괜찮은 양념과 소스는 간단하게 메모한다. 새로운 요리, 획기적인 요리보다 보통 자주 해먹는 요리 레시피가 더 반갑다. 실수했던 과정을 '교정'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 책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요며칠 내가 왜 샀을까, 이 책을... 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항상 기억을 떠올리고 지난날을 회상할 땐 다시 육수처럼 후회가 밑바탕이 되는데 이 책은 좀 달랐다. 얼마전 책들을 결제하기 직전, 장바구니를 훑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뭔가 그 책들끼리 잘 어울리지 않고 서로 어색해하는 이상한 오글거림이 둥둥 떠있었다. 그러다 택배 상자를 받을 때 활자들 천지의 글이 아닌 달콤하고 분위기 있는 사진들이 있는 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다른 책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풍미를 돋울 그런 책! 영화와 책에서 상상으로만 그리던 프랑스 요리책이 어떨까 하다가 고르게 되었다.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진한 초콜릿 향같은 건 풍기지 않았지만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다. 불어는 모르지만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눈으로도 읽었다. 분위기 있는 발음과 낯선 소리들 때문에 외국어는 가끔 어떤 요리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다. 부르고뉴풍의 쇠고기 스튜는 찬바람 불면 시도해봐야겠다.
이 책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요며칠 내가 왜 샀을까, 이 책을... 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항상 기억을 떠올리고 지난날을 회상할 땐 다시 육수처럼 후회가 밑바탕이 되는데 이 책은 좀 달랐다. 얼마전 책들을 결제하기 직전, 장바구니를 훑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뭔가 그 책들끼리 잘 어울리지 않고 서로 어색해하는 이상한 오글거림이 둥둥 떠있었다. 그러다 택배 상자를 받을 때 활자들 천지의 글이 아닌 달콤하고 분위기 있는 사진들이 있는 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다른 책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풍미를 돋울 그런 책! 영화와 책에서 상상으로만 그리던 프랑스 요리책이 어떨까 하다가 고르게 되었다.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진한 초콜릿 향같은 건 풍기지 않았지만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다. 불어는 모르지만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눈으로도 읽었다. 분위기 있는 발음과 낯선 소리들 때문에 외국어는 가끔 어떤 요리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다. 부르고뉴풍의 쇠고기 스튜는 찬바람 불면 시도해봐야겠다.

키조개 관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 검색하다가 찾게 된 블로그다. 도쿄에 사는 저자는 깔끔하게 일본 가정식 상차림을 차려낸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건 원플레이트 한 끼. 접시 하나에 반찬 조금씩 담아낸 상차림이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고, 귀찮다고 대충 먹는 버릇들을 단번에 없애고 싶을만큼 깔끔하고 예쁘다. 계란말이, 양파와 감자 볶은 것, 구운김과 김치. 한 접시에 담아놓으니 차린 건 없어도 많이 먹고 싶어진다. 반찬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밥 생각이 없다면 더더욱 예쁘고 깔끔하게 차려 먹는 게 좋은 거 같다. 손님들 오실 때 꺼내 쓰는 그릇이라는 수식어는 아예 없애버리고 집에 있는 그릇들은 널리 자주 쓰는 것도 집에서 먹는 밥의 풍미를 돋운다. 그러다 얼마전엔 아끼던 접시의 이가 나가버렸지만... 괜찮다. 그까이꺼. 알뜰살뜰하게 돈 모아 더 예쁜 접시 사면 되지 뭐. 흑. 좋은 벗에게 생일 선물로 보냈다. 그녀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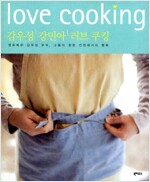 자주 들여다보고 참고하는 요리책 중에 하나. 감우성과 그의 아내 강민아의 밥 잘해먹고 살기 스타일의 요리 책이다. 레시피를 복잡하지 않게 설명한 것이 장점이다. 물론 처음 요리를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처음 요리를 시도하는 이들은 무조건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담은 요리책을 선호한다. 경험상 처음이라는 첫 단추에 나는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자신없으니 무서워, 라는 구절만 빼면 불친절한 요리책을 찾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재료의 양과 조리 시간의 측정이 초보 요리를 하는 데 가장 힘들긴 하지만 웬만한 요리 책이라면 그 정도는 다 나와있다. 가령 한 큰숟갈을 측정할 때, 납작하게 한 큰숟갈인지 봉곳하게 한 큰숟갈인지 헷갈리는것이다. 지나치게 정확한 잣대를 견주면 요리 자체가 피곤해지니 조금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먹을 준비를 하는 게 맛있는 식탁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자신의 미각을 믿고, 맛있게 먹어본 경험을 되살리면 초보 요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처럼 맛을 잘 아는 사람이 요리도 잘 하는 것 같다.
자주 들여다보고 참고하는 요리책 중에 하나. 감우성과 그의 아내 강민아의 밥 잘해먹고 살기 스타일의 요리 책이다. 레시피를 복잡하지 않게 설명한 것이 장점이다. 물론 처음 요리를 시도하는 이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처음 요리를 시도하는 이들은 무조건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담은 요리책을 선호한다. 경험상 처음이라는 첫 단추에 나는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자신없으니 무서워, 라는 구절만 빼면 불친절한 요리책을 찾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재료의 양과 조리 시간의 측정이 초보 요리를 하는 데 가장 힘들긴 하지만 웬만한 요리 책이라면 그 정도는 다 나와있다. 가령 한 큰숟갈을 측정할 때, 납작하게 한 큰숟갈인지 봉곳하게 한 큰숟갈인지 헷갈리는것이다. 지나치게 정확한 잣대를 견주면 요리 자체가 피곤해지니 조금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먹을 준비를 하는 게 맛있는 식탁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자신의 미각을 믿고, 맛있게 먹어본 경험을 되살리면 초보 요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처럼 맛을 잘 아는 사람이 요리도 잘 하는 것 같다.


처음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야만 했던 그때. 내 식탁을 책임져야 할 시점에서 난생 처음 구입한 요리책이다. 어떤 책이 좋더라, 하는 조언은 떨궈내고 서점에서 직접 골랐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내게 친절했다. 이 책의 레시피는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다 해보았는데 만족스러웠다. 이 책을 펼치면 신혼의 향기가 폴-폴- 난다. 신문과 잡지 스크랩, 인터넷에서 프린터 한 종이들을 끼어놓아서 더 그렇다.
어느날, 못된 마음을 품은 채 찌개를 끓였다. 매번 하던 방식 그대로, 재료도 그대로 넣었는데 맛은 형편없었다. 맛이 손끝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우러나오는 건 그래서인가보다. 요리를 할 땐 맛있게 먹어줄 사람을 생각하며 한다. 엄마가 그 맛있는 반찬을 드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밀었던 이유를 얼핏 알 것도 같다.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뿌듯하지만 요리하는 동안 냄새에 질려 먹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렇다. 맛있게 요리를 하고나면 찬물부터 들이켠다. 그순간 찬물은 내게 가장 훌륭한 반찬이다.
계절이 바뀔 때 요리책을 펼치면 또다른 느낌이다. 식탁의 반찬을 바꾸면서 한 계절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일상이 숭고하게 느껴진다. 매번 새로운 메뉴를 올려놓지는 못하지만 늘 해왔던, 조금은 잘해왔던 메뉴들은 항상 그 맛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올 가을에 바라는 것도 그뿐이다. 거기에 개미 허리만큼만 더 보태자면 지금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된장찌개와 미역국을 끓이는 것. 그거면 올 가을은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