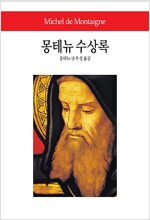사람들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스치듯 마주친 '책에 관한 에피소드' 때문에 기어이 그 책을 읽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을까? 나로서는 그런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하지만 그런 인연 덕분에 읽은 책들은 보통스러운(?) 다른 책들보다 훨씬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다. 그런 인연이 그만큼 각별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 인연으로 읽은 책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단테의 『신곡』이다. 나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도무지 언제쯤이나 그런 책을 읽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언젠가 우연히 영화관에서 마주친 '자막' 한 줄이 나를 어디엔가 단단히 옭아매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나자 사정이 달라졌다.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솟구쳤던 것이다.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였다.
주인공인 카터(모건 프리먼)는 갑작스레 찾아온 병 때문에 입원한 어느 날, 대학 신입생이던 시절 철학 교수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 리스트’를 만들라고 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리고 같은 병실을 쓰게 된 에드워드(잭 니콜슨)와 함께 병원을 뛰쳐나간 두 사람은 그 '리스트'를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 카터는 비록 자동차 정비공 신분이었지만 독서광이었던 덕분에 아주 박식했다. TV 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별의별 문제들을 식은 죽 먹기로 척척 알아맞힌다. 정확히 어떤 장면에서였는지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 불쑥 친구인 에드워드에게 농담삼아 던지는 말 하나가 내 가슴에 콕 박힐 때가 있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단테의 『신곡』은 읽어봐야 할 거 아냐?"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국 단테의 『신곡』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을 읽기 전에 난생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갔을 땐 피렌체에 있는 '단테의 생가'를 들른 적이 있었다. 그럴 때조차 단테의 책을 읽어보리라는 다짐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의 대사 하나가 그토록 놀라운 힘을 발휘할 줄은 몰랐다.
영화와 책이 강하게 결부된 두 번째 경우는 2004년에 개봉했던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볼 때였다. 그 영화에서는 두 청춘남녀가 도서관에 갖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한참이나 이어진다. 갑자기 뉴욕항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기상이변이 닥쳐 온 도시가 통째로 마비되기 때문이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두 사람은 도서관에 꽃힌 무수한 책들을 불태우면서 추위를 견딘다. 그때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에미 로섬이 남자친구한테 건네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다음 대사는 물론 정확한 게 아니다. 내게 남아 있는 기억을 대충 되살려본 것뿐이다.)
"아무리 춥다 해도, 니체의 책까지 불태울 순 없어."
나는 그 영화를 볼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니체의 책들은 제대로 읽어본 게 거의 없었다. 물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니체의 책들은 읽지 못했다. 아니, 읽고 싶어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내겐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중에 니체의 책들을 단단히 붙잡고 읽게 된 계기는 물론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알게 된 때문이었다. 그러나 니체의 책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에미 로섬이 뉴욕의 어느 도서관 서가에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 빼들었다가 '인류의 양심상' 도저히 그 책들을 불태울 수 없어 도로 제자리에 꽂는 장면을 늘상 함께 떠올리곤 한다.
세 번째로 생각나는 책은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이다. 내가 이런 희귀한 책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맨처음으로 알게 된 건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을 때였다. 그 책 속에는 온갖 시인과 철학자와 역사가들이 남긴 인용문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관심을 끄는 인물은 단연 루크레티우스였다. 그 시인만큼 '사물의 본성'을 제대로 간파하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몽테뉴를 만날 때만 하더라도 루크레티우스의 책은 국내에서는 언감생심 번역될 생각조차 없을 무렵이었다. 내가 몽테뉴를 처음 만난 건 1980년대 초반이었고,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물경 30년이나 지난 2012년에야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어쨌든 나는 몽테뉴의 소개 덕분에 그 책을 정말 각별한 심정으로 읽을 수 있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몽테뉴 수상록』에 인용된 루크레티우스의 문장들까지도 다시 찾아볼 정도였다. (다시 만나고 거듭 만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고대의 시인 이야기)
네 번째로 꺼내 들고 싶은 책은 토마스 만의 자전적 소설인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이다. 내가 이 책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처음으로 발견한 건 『평생 독서 계획』이라는 책에서였다. 그 작품이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그 소섫을 무려 30번씩이나 읽는 소설가가 있단 말인가 싶었던 것이다. 나는 만의 소설을 그토록 많이 읽은 소설가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소설가가 읽었다는 그 '횟수' 만큼은 또렷이 기억해 두었다. 그만큼 내게는 '횟수가 주는 인상'에 꽉 붙들렸던 셈이다. 물론 그 뒤로 내가 토마스 만의 소설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 읽은 소설은 결국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이었다. 토마스 만이 쓴 뛰어난 단편들이 많았음에도 나는 기어코 다른 책에서 읽은 '에피소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셈이다.(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_뤼벡과 그 밖의 도시들)
좋은 책은 좋은 사람과 비슷한 점이 많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잘 알 수 없듯이 책도 한 번 읽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 번 되풀이하여 읽는 과정에서 그 책을 잘 알게 되고 그리하여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없으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마저 갖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가 있다. 독일의 소설가 프란츠 베르펠은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이라는 장편소설을 너무 좋아하여 평생 30번 가량 읽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그 소설을 읽은 것은 죽기 한 달 전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번이라는 횟수가 아니라 죽기 한 달 전의 경황없는 상황에서도 토마스 만의 소설을 읽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베르펠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만의 소설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으리라.(476쪽)
- 클리프턴 패디먼, 『평생 독서 계획』, <역자 후기> 중에서
내가 『평생 독서 계획』에 대해 리뷰를 썼던 게 벌써 8년 전의 일이다.(고전을 읽어라. 그전에 패디먼을 먼저 만나보라.)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을 30번씩이나 읽은 소설가의 이름을 여태껏 한 번도 자세히 뒤져볼 생각을 갖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오늘, 우연히, 혹시나 싶어, 검색창에 그 소설가의 이름을 넣어 봤더니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쓴 소설 몇 권이 우리말로도 버젓이 번역되어 나와 있을 정도로 그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다!(더군다나 그가 생전에 거쳐갔던 여러 도시들 가운데 내게도 무척이나 인상적인 도시들도 적지 않았다. 프라하, 함부르크, 라이프치히, 빈 등등.)
그런데 독일에서도 유난히 큰 도시였던 뤼벡을 (몇년 전 자동차를 빌려 타고 마음 내키는 대로 쏘다녔던 '독일 일주 여행'에서) 깜빡 빼놓고 지나친 일은 지금 생각해도 몹시 후회스럽다.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의 주무대가 바로 뤼벡이고, 토마스 만의 고향도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결코 그런 멍청한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끝으로,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즐겨 읽었던 바로 그 소설가를 소개하며 글을 맺는다.
프란츠 베르펠
1890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 베르펠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함부르크의 운송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르펠은 얼마 뒤 라이프치히의 한 출판사에 들어간다.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는 틈틈이 시 창작에 매진하여 1912년부터 1915년까지 3년 사이에 『세상 친구』, 『우리는』, 『서로』 등 세 권의 시집을 펴내는데, 탁월한 표현주의 시인의 출현이라는 평을 얻는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베르펠을 ‘다음 세대’를 이끌 위대한 시인으로 일컫기도 했다. 베르펠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준 첫 소설은 『베르디. 오페라 소설』(1924)이다. 음악가 베르디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쓰여진 이 소설은 오페라 역사상 위대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오델로」가 작곡된 과정을 담고 있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미망인 알마 말러와 결혼하여 오스트리아 빈에서 거주하고 있던 베르펠은 1938년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도피했고, 1940년 도보로 피레네 산맥을 넘은 뒤 미국으로 망명했다. 망명 전까지 장편소설 『고등학교 동창회』(1928), 『바바라 혹은 깊은 신앙』(1929), 『나폴리의 형제자매』(1931), 『무사 닥에서의 사십 일간』(1933), 『예레미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1937), 『횡령된 천국』(1939) 등을 펴냈다. 희곡 작가로도 명성이 높아 1944년에 발표한 『야코봅스키와 대령』은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옅푸른색 잉크로 쓴 여자 글씨』(1941)는 남프랑스에서 쓰기 시작해 망명지인 미국에서 완성, 발표한 작품이다. 또 다른 대표작 『베르나데트의 노래』(1941)는 배우 제니퍼 존스의 출연으로 영화화되면서 널리 알려졌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1945년 세상을 떠났다.(알라딘 작가 소개 중에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