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린 날씨를 핑계로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막국수가 다른 선택지였다) 오늘 할일을 가늠해보던 차에 우연히 손에 들고 펼쳐본 게 사이토 다카시의 <철학 읽는 힘>(프런티어, 2016)이다. 기시미 이치로와 함께 국내에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듯한 인문 저자. <철학 읽는 힘>이 3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두달 동안 세 권의 책이 더 보태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달에만 세 권이 나왔다. 다작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거의 모든 책이 국내에 번역되는 추세가 아닌가 한다.



이유야 물론 팔리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불황기에 고정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심심찮게 터뜨려주는 저자라면 출판사들로선 유혹적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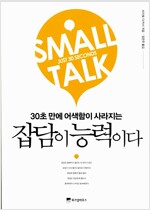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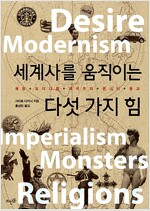
그럼에도 부쩍 많이 소개되는 건 작년에 나왔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위즈덤하우스, 2015)이 대박을 쳤기 때문. 알라딘에서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잡담이 능력이다>(위즈덤하우스, 2014)도 의외의 판매고를 올렸고.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뜨인돌, 2009)은 '사이토 다카시'란 이름을 각인시킨 스테디셀러다.






여하튼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사이토 다카시의 장점은 무엇인가. 내가 읽은 몇 권에 기대 말하자면 일단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문교양서'로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라고 할까(하긴 모든 책은 자기계발서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인문학 전공이 아니고 인문서 독서 경력이 일천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사이토 다카시의 책은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그로써 '읽었다'는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철학 읽는 힘>의 부제가 '지적 교양을 위한 철학 안내서'라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책이 길잡이 혹은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열풍에서도 확인되지만, 인문 독자층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초급 교양(넓고 얕은 지식)에대한 수요다. 고전(이른바 '그레이트 북스')을 읽어야 한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고 그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정작 현단계 대다수 독자들에겐 '그림의 책'일 따름이다.



이지성의 <리딩으로 리드하라> 같은 베스트셀러가 독자들에게 고전 독서 의욕을 잔뜩 부추켜놓았지만 정작 플라톤이나 데카르트를 직접 읽을 만한 독서력이 대다수 독자들에겐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독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고 할까. 이 간극을 채워주는 책들이 채사장과 사이토 다카시, 그리고 기시미 이치로 등의 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시미 이치로의 경우에도 <미움 받을 용기> 열풍을 낳은 것은 '용기'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프로이트와 아들러 같은 고전 심리학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게 크지 않았나 한다.
여하튼 이런 저자들의 독자층이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른다는 사실은 음미해볼 만한 일이다(이백만 부 가까이 팔린 <정의란 무엇인가>는 너무 예외적인 사례였고). 인문 독자층이 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 주로 아랫변에 해당한다. 그리고 꼭지점을 형성하는 소수의 고급 독자층이 있다. 예컨대, 칸트나 비트겐슈타인을 원전번역으로 읽는, 그리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다.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새번역 <철학적 탐구>(아카넷, 2016)나 강철웅 교수의 <설득과 비판 - 초기 희랍의 철학 담론 전통>(후마니타스, 2016) 등이 '하드'한 책에 속한다. 조금 평이하게 쓰였지만 신승환 교수의 <해석학>(아카넷, 2016) 같은 책도 어느 정도 독서력을 갖춘 독자들이 손에 들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책의 독자는 몇 명이나 될까? 이삼천?
요는 <철학 읽는 힘>과 <철학적 탐구> 사이의 차이와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 나는 이 간극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반대로 이러한 두 가지 독서 혹은 경향은 상충적이며 대중철학서 열풍은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다. 중간 저자들이 다리가 되어 더 깊이 있는 교양으로 독자를 이끄는 것이 가능하고,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다. 곧 <철학 읽는 힘>의 독자들이 일부라도 <철학적 탐구>의 독자가 되기를 바란다. 전부가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20/80의 균형은 유지되면 좋겠다 싶은 것이다(1/99가 아니라).
<철학 읽는 힘>에서 사이토 다카시는 칸트를 이렇게 소개한다. 칸트가 '경험적 인지'와 '선천적 인지'를 구별했다고 하면서 "칸트는 매주 진중하게 사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태도로 구별해보니 사람의 인식은 경험적 인식이 많았다."(118쪽) '매주'는 '매우'의 오타일 것이다. 즉 우리가 아는 칸트는 "매우 진중하게 사고하는 사람"이다(혹은 '매일 진중하게 사고한 사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를 따라서 '매우 진중하게 사고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칸트가 되거나 칸트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매주 하루 정도는 진중하게 칸트를 읽거나 비트겐슈타인을 읽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고전을 무작정 숭배하는 물신적 독서를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는 다만 고전의 대명사로 내세운 것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이고, 이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고전을 읽는 힘, 철학을 읽는 힘이다. '매주 진중하게 사고하는 사람'을 그 한 가지 모델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매주'도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매달 진중하게 사고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매년'은 어떻겠느냐고? 흠, 그건 좀...
16.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