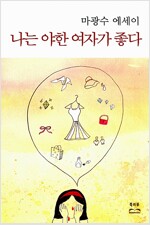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서 주문하고 저녁에 받은 책은 마광수의 유작 소설집 <추억마저 지우랴>(어문학사)다. 음란물 판정을 받아 출금된 대표작(?) <즐거운 사라>를 구할 수가 없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2013 즐거운 사라>(책읽는귀족)도 같이 주문했는데 이건 일종의 대표 장면 변주 앤솔로지다(이런 장르도 있나?). 저자의 말에 판금해제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한다.
‘마광수 교수‘에 대한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대학가(연대 강의실)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의 강의가 한 잡지에 소개된 걸 초겨울 어느 서점에서 읽었다. 그의 에세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가 나온 게 1989년으로 돼 있어서 1989년 겨울이 아닌가도 싶지만 내 기억은 1987년 겨울과 마광수를 겹쳐놓는다.
아무튼 그 이후에 마광수 문학론에 해당하는 책들을 두루 읽었고 단행본으로 나온 윤동주에 대한 박사학위논문도 읽었다. 문학론 가운데서는 얇지만 <상징시학> 같은 책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내게 그의 시나 소설은 문학론이나 에세이보다 수준이 떨어져 보였다. 아마도 사법적 처벌이 아니었다면 그냥 유야무야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법적 탄압을 받으면서 오히려 마광수는 표현의 자유와 성해방을 외치는 투사의 이미지를 덮어쓰게 되었다. 작가로서 가장 큰 문제는 빈곤한 상상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상상력은 그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언젠가 희대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광수 교수의 부고 기사를 읽은 건 프라하 성 투어를 하던 날이었다. 고인에 대한 평가에 인색한 편이지만 마지막 유작 정도는 읽어보고 싶었다. 사람을 잘못 보듯이 작품도 잘못 읽을 수가 있으니까. 설사 크게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억은 추억 자체로 기억될 권리를 갖는다. 내게 마광수는 30년 전 잡지속에서 본 자신만만한 젊은 문학교수로 남아 있다. 시무룩하고 우울한, 전혀 즐겁지 않은 표정의 은퇴한 노교수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