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이후 첫 주를 정신 없이 보내고 맞는 주말에 '이주의 저자'를 고른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서재 방문자 수는 조울증 환자처럼 널뛰기를 하는데, 어제오늘은 조증 모드다. 그렇다고 서재에 특별한 메뉴가 마련돼 있는 건 아니니 하던 일이나 해두도록 한다. 3인의 학자를 골랐다.



먼저 서울대 독문과 명예교수인 안삼환 교수의 역작이 나왔다. <한국 교양인을 위한 새 독일문학사>(세창문화사, 2016). 주로 괴테와 토마스 만 작품 번역으로 알려진 저자가 정년 이후에 펴낸 노작으로 840쪽에 이르는데, 제목에서부터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한국 '교양인'을 위한 책이라는 것과 '새' 독일문학사라는 점.
"서문에서 저자는 '한국 교양인을 위한' 이란 책 제목의 이유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독일문학' 재조명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힌다. 한국에서의 독일어 연구 및 독일문학 연구가 70년이 넘어가는 연륜의 현재에도 아직 일제 강점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그 안타까움이 있다. 이 책은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비롯하여 <파우스트>, <빌헬름 텔>, <유리알 유희>, <양철북>, <향수> 등 친숙한 독일작품들이 어떠한 문학 정신을 품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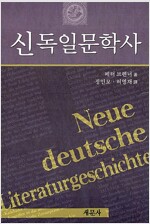

세계문학을 강의하는 처지에서 보면 각 나라별/지역별 문학사가 꽤나 절실한데, 독일문학사의 경우 이미 나와 있는 책들은 분량이 소략하거나 전공학생을 위한 책이었다. 지적 관심을 가진 독자(교양인)을 위한 깊이와 폭을 갖춘 문학사책이 아쉬웠는데, 안삼환 교수의 책이 아주 맞춤하다. 내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쪽 문학 강의를 준비하는 데 요긴하게 참고하려고 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가(가수 조영남과는 동명이인이다)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를 세 권의 역저로 풀어냈다. <개혁과 개방><파벌과 투쟁><톈안먼 사건>(민음사, 2016). 중국 현대사를 다룬 책은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덩샤오핑 시대에 한정하여 국내 학자가 써낸 묵직한 저작은 희소하지 않았나 싶다. 제목과 표지의 사진만으로도 책의 범위와 의의는 가늠해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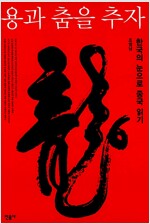

저자는 중국 관련 연구서를 정력적으로 펴내고 있는데, 탄탄한 해설과 함께 현대 중국을 바라보는 독자적인 시각까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조선대 국문과의 차승기 교수도 역저를 펴냈다. <비상시의 문/법>(그린비, 2016). '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화, 정치'가 부제.
"이 책은 한국 근대성에 내재화한 식민성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지정한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치가 지금처럼 결정되기 이전의 상황, 그러나 이 상태를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던 그 시점, 다시 말해 ‘식민지/제국 체제’의 수립과 그 궁지가 노정된 과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형체 없이 흩어지거나 체제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목소리들을 되살려 봄으로써 식민성이 각인한 한국 근대성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
식민성 내지 식민지 체제에 대해서 다시 성찰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도 좋겠다.



되짚어 보니 나는 저자의 저작보다 번역서를 먼저 읽었다. 저명한 바흐친 연구서 <바흐친의 산문학>(책세상, 2006)과 사카이 나오키 등의 <세계사의 해체>(역사비평사, 2009)를 먼저 읽었던 것이다. 첫 저서는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푸른역사, 2009)을 건너뛴 것인데,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된다. 저자가 편자로 참여한 책으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문화연구 시리즈' 책들도 전공자들은 챙겨둘 만하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 교양과 전공의 경계를 표시하는 듯하다...
16.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