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로는 두 달 전에 나온 책이지만 리 빌링스의 <50억년 동안의 고독>(어마마마, 2016)을 '이주의 과학서'로 고른다.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궁리하다가 '이거다!' 싶어서 손에 든 책이다. '외계 생명체와 새로운 지구를 찾아가는 길'이 부제. 따로 갈 데도,숨을 데도 없지만, 기분으론 '50억년'을 가늠해본다. 소개로는 "외계 지적 생명체와 태양계외행성 탐색 분야의 선구자적인 천문학자와 행성과학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들과의 밀착 인터뷰를 통하여 지구와 닮은 별을 찾으려는 노력, 즉 '태양계외행성 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는 책이다."



비슷한 분야의 책으로 예전에 손에 들었던 책은 앨런 라이트먼의 <엑시덴털 유니버스>(다산초당, 2016)다. 이론서가 아니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저자는 우주를 향한 우리의 갈망, 즉 ‘우주 본능’에 답을 주기 위해 우주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풀어나간다. 우주의 대칭성과 인간 삶 속 대칭들을 비교하며 인간이 대칭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속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삶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 인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의 특성과 똑같다고 말하는 식이다."



그리고 지난달에 나온 책으로는 플로리안 프라이슈테터의 <소행성 적인가 친구인가>(갈매나무, 2016). "소행성의 위협과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인류의 기술들, 그리고 소행성이 인류에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꼼꼼하게 담은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책." 먼저 나왔던 <지금 지구에 소행성이 돌진해 온다면>(갈매나무, 2014)의 속편 격인 듯. 소행성이라고 하니까 라스 폰 트리에의 영화 <멜랑콜리아>도 떠오른다. 소행성과의 충돌을 소재로 한 영화이고, 영화속 소행성의 이름이 멜랑콜리아다. 소행성과의 충돌은 물론 지구 종말을 뜻하지만, 영화에서 우울증 환자인 주인공에게는 그 종말이 역설적으로 환희의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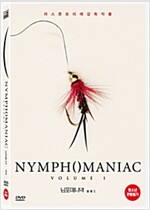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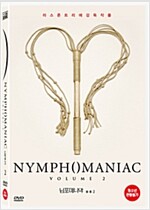

<멜랑콜리아>도 다시 볼까 싶지만, 마침 <님포매니악>을 다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1,2편을 본 게 작년이었던 것 같다. 아직 보지 못한 <안티크라이스트>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대로, 아니면 여유를 쥐어짜서 봐야겠다. 생각해보니, 이 영화들 모두에 샬롯 갱스부르가 주연으로 나온다. 라스 폰 트리에의 뮤즈인 것인가. <50억년 동안의 고독>에서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아래와 같은 포스터를 보고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 독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다고 내가 이 영화를 꼭 권한다는 건 아니다. 라스 폰 트리에의 영화라는 걸 알고 보면 된다...

16. 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