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학기 강의계획서를 올리기 위해 PC방에 왔다가(비가 온다는 핑계로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예전의 쓴 글들의 '편집' 작업만 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학의 학사정보 화면이 로그인 되지 않아 그냥 죽치고 않아 있는 신세가 돼버렸는데, 또 놀면 뭐하겠는가? 창고 정리라도 해야지. 역시나 모스크바통신에 올렸던 글인데, 왕가위의 영화 <아비정전>과 레르몬토프의 시 '나홀로 길을 나선다'에 대한 몇 마디 코멘트이다. '고독에 대하여'란 제목을 그냥 새로 붙여보았다. 아래의 글을 쓴 건 재작년 가을이고 러시아 TV에서 방영되던 <아비정전>을 보면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려가며 쓴 것이다.

갑자기 ‘회고적’ 정서에 물든 건, 지금 STS채널에서 왕가위의 <아비정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열혈남아>가 나왔고, 그 전에는 <타락천사>가 나왔었는데, 당분간 왕가위의 영화들이 나올 예정인가보다, 하고 다음주 TV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니다. 다음주에는 리안의 <와호장룡>이다.
<아비정전>은 내가 최초로 본 왕가위의 영화이며, 내가 단번에 매혹된 영화이다. 아주 옛날 대학가에서 하숙하던 시절에 동네 비디오점에서 주말이면 비디오와 함께 테이프 5편을 한꺼번에 빌려다가 밤새 보곤 했었는데, 어느 주말에 빌려온 테이프 중 하나가 바로 <아비정전>이었다. 나는 영화를 두 번 연거푸 봤는데, 이후엔 ‘왕가위의 모든 영화’이다. 그리고도 매년 생일쯤 되면 ‘청승맞게도’ 비디오방에 혼자 가서 이 영화를 봤다. 어떤 때는 동행이 있기도 했지만, 곧 다시 혼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이 테이프를 아예 집에 소장하고 있다(아이러니컬하게도 소장한 이후에는 한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열혈남아>는 <아비정전> 이후에 찾아 본 영화이다.
<중경삼림> 이후에 왕가위는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만의 왕가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비정전>뿐이라고 해야겠다. 이후에 이 영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을 많이 읽었고 거기에 대부분 수긍하지만, 이 영화에는 그러한 ‘상징적’ 읽기 이후에도 남아있는 어떤 잔여물이 있다. 지젝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상징적인 중층결정’에 의해서, ‘은유적인 의미’에 의해서 다 설명될 수 없는 “라캉적 의미에서의 사물(Thing)”이라고 불렀지만, <아비정전>의 잔여물은 그와는 다른 종류의 잔여물이다.

영화에서 장국영이 '발 없는 새'의 우화를 얘기하지만, 이 영화는 아무런 ‘거대한 잔해’도 남기지 않고 그냥 바람처럼 너울거리며 지나가버린다. 즉, ‘사물’ 대신에 거기에 있는 건 나르시시즘적인 맘보춤이고 허물(虛物; Nothing)이다(‘허물’은 ‘없지만 있는 것’이란 의미에서 ‘증상’에 대응한다). 해서 모성, 혹은 어머니-타자(mOther)의 부재에 관한 영화(이 영화의 모든 인물들은 혼자가 된다. 즉 그들은 어떠한 2자적 관계도 형성하지 못한 채 모두 울며 겨자 먹기의 나르시시스트들로 남는다) <아비정전>의 잔여물은 ‘물질적인 잔여물’이 아니라 허무/허물을 채우는 ‘감정적인 잔여물’이다.

드디어, 양조위가 구두를 닦고 손수건을 양복에 꽂고 기름 바른 머리를 빗어 넘긴 다음에 외출했다(<아비정전>은 미완의 영화이다). 즉 마지막 장면이 지나가고 타이틀이 올라간다. 그렇게 모든 것은 지나가버린다. 영화의 시작에서 장국영과 장만옥이 잠시 함께 했던 시간처럼(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 시간에 대한 기억 또한). 그 장국영도 “발 없는 새”처럼 어느 샌가 우리 곁을 떠나버리지 않았던가. <아비정전>에는 “왕가위적 의미에서의 허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며, 그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잔여물’이다. 요컨대, 왕가위의 영화들은 우리의 고독과 불가피한 나르시시즘의 증상이다.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 왕가위의 영화들은 모두 외로움에 대한 영화이고 고독에 대한 영화이다(이건 왕가위의 ‘전속’ 촬영감독인 크리스토퍼 도일의 영화관이기도 하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영화들은 ‘해피 투게더’의 (불)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다. 데뷔작인 <열혈남아>가 당시에 유행하던 ‘홍콩영화’의 스타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면(유덕화와 장만옥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남자들/‘형제들’ 간의 ‘의리’였다), 두 번째 영화인 <아비정전>은 온전하게 왕가위만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그의 영화를 가로지르는 고독의 기원, 이자적 관계(=투게더)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초적 외상(=트라우마)이 놓여 있다. 그것은 모성의 부재, 혹은 모성과의 단절이다.
알다시피, 엄마와 아이간의 이자적 관계는 3자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상징적 정체성 이전에, 정서적 안정감 혹은 정서적인 정체성이 형성되는 기본관계이다. 따라서 엄마와 아이간의 안정적인 관계의 형성, 기본적인 애착관계의 형성은 이후의 대인관계에서 기본적인 안정감/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이자 바탕이 된다(즉 이자적 관계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 그런데, 엄마의 (너무 이른) 상실은 이러한 바탕을 미처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 아이는 상실한 이자적 관계를 그리워하면서도 (반복적인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그것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며 불안해 하게 되는 것. <아비정전>의 영어 제목은 인데, 이때 ‘사나운’이란 뜻의 ‘wild’는 다르게는 ‘길들여지지 않는’이란 뜻이다. 왕가위 영화의 주인공들은 멀쩡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모두들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그건 정작 필요할 때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가위의 영화가 단지 유행/겉멋으로서의 ‘고독’을 넘어서는 대목이 있다면, 나는 그의 영화에 드리워진 이러한 외상적 진정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나는 실제로 그가 모성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지 어쩐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짐작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타자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고독의 주제화는 문학에서 상당히 보편적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시인 유리 레르몬토프(1814-1841)이다.

<우리시대의 영웅>이란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시인 또한 젊은 나이에 결투로 죽었는데, 그의 문학적 유언이라 할 만한 시는 생애의 마지막 해에 씌어진 '나 홀로 길을 나선다'(1841)이다(이 시에 가락을 붙인 곡이 우리 드라마에서 몇 차례 주제가로 사용됐었다. “브이하주- 아진- 야 나 다로-구”라고 느리게 시작하며 서정적인 음색의 여가수가 부른다. 이 노래만큼은 여가수들이 더 어울린다). 이 시를 러시아어와 함께 옮기면 이렇게 된다.
Выхожу один я на дорогу,
Сквозь туман кремнистый путь блестит,
Ночь тиха. Пустыня внемлет Богу,
И звезда с звездою говорит.
나 홀로 길을 나선다.
안개 속으로 자갈길이 빛나고,
밤은 고요하다. 황야는 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별들은 별들과 속삭인다.
В небесах торжественно и чудно!
Спит земля в сиянье голубом...
Что же мне так больно и так трудно?
Жду ль чего? Жалею ли о чём?
하늘은 장중하고 아름답구나!
대지는 푸른 빛 속에 잠들고...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토록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 걸까? 무엇을 후회해야 하는 걸까?
Уж не жду от жизни ничего я,
И не жаль мне прошлого ничуть;
Я ищу свободы и покоя!
Я б хотел забыться и заснуть!
이미 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나에게 과거는 전혀 후회스럽지 않다.
나는 자유와 평온을 찾고 있다!
나는 모든 걸 잊고서 잠들고 싶다!
Но не тем холодным сном могилы,
Я б желал навеки так заснуть,
Чтоб в груди дремали жизни силы,
Чтоб, дыша, вздымалась тихо грудь;
하지만, 무덤 속의 차가운 잠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잠들었으면,
생명의 힘이 가슴 속에서 조곤조곤 잠들어,
숨쉴 때마다 조용히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Чтоб всю ночь, весь день мой слух лелея,
Про любовь мне сладкий голос пел,
Надо мной чтоб, вечно зеленея,
Тёмный дуб склонялся и шумел.
밤새도록, 하루 종일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며,
달콤한 목소리가 나에게 사랑을 노래하고,
내 위로는 영원히 푸르른,
울창한 참나무가 몸을 숙여 수군거렸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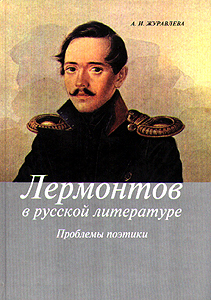
전체 5연의 이 시는 1841년 5월에서 6월초에 씌어졌다. 레르몬토프가 결투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7월 15일이므로 죽음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1연에서부터 눈에 띄는 것은 ‘혼자/홀로’라는 서정적 화자, 레르몬토프의 자의식이다(러시아어의 ‘고독’을 영어로 옮기면 ‘oneness’가 된다. 나는 왕가위 영화의 중핵이 이 ‘Oneness’라고 이미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자의식은 그를 둘러싼 자연이 서로 화합하고 호응하는 시간에도 혼자만의 무거운 상념으로 이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토록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걸까?” 이러한 상념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으며 자연과의 불화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2연의 4행, 그리고 3연에서 보듯이, 서정적 화자에게서 기다림의 대상으로서의 미래와 후회의 대상으로서의 과거라는 시간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서 시간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락이나 비약 또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그가 찾는 것은 ‘자유와 평온’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와 평온의 상태로서 그가 지향/소망하는 것은 ‘잠’이다. 이 잠의 내용을 꿈꾸는 것이 그에게서 상상력이 갖는 몫이다.
‘하지만’이라는 4연의 서두가 말해주듯, 그의 잠은 죽음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잠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무덤 속 차가운 잠’(=죽음)으로서의 잠은 삶의 중단을 전제로 하는 죽음 이후의 다른 삶, 다른 시간의 체험이지만, 이 시의 4-5연에서 묘사되는 잠은 삶의 연속으로서 현재의 시적 자아가 더 확충되는 경험이다. 즉 여기서 ‘나’와 자연의 조화는 (일반적인 경우에서처럼) ‘나’라는 자의식의 소멸을 통해서 자연과 합일/통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전체가 ‘나’에게 순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시에서의 상상력은 자연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자아의식의 확대/심화에 봉사한다(아래 사진은 모스크바에 있는 레르몬토프 박물관).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이 시는 자궁회귀로의 충동 혹은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4연에서 생명이 가슴에서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잠이란 (모체의 자궁 속에서의) 태아의 잠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5연에서, 밤낮으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물론 어머니이며(시인 레르몬토프가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목소리뿐이었다), 동그만 ‘나’의 무덤/자궁 위에 있는 ‘울창한 참나무’는 아버지의 형상이다. 그렇다면, ‘나’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요구하는 자궁 속 ‘어린아이’이다. 다만, 이 ‘어린아이’는 실제의 태아와는 달리 ‘나’라는 자기의식을 보존/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그는 자신이 즉자로서의 태아임을 의식하고자 하는, 행복의 극대치를 경험하고자 하는 대자(‘나’)이다.
물론 이러한 즉자-대자적 존재는 상상력 속에서만 가능하며, 이 상상 속의 ‘나’와 대조되는 것이 1연에서 혼자 길을 나서는 불행한/무거운 현실의 ‘나’이다. 이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일찍 여읨으로써 자신이 소망하는 행복의 결여와 일찌감치 마주하게 된 고아 레르몬토프의 형상이다(시인은 세 살 때 어머니를 여읜다). 생각건대, 엄마들은 아이를 놔두고 일찍 죽으면 안된다. 아이가 나중에 시인이 못 되더라도 말이다(아래 사진은 레르몬토프가 결투로 숨진 장소에 세워진 기념비)...

06.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