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베르 카뮈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다룬 로버트 자레츠키의 평전 <카뮈, 침묵하지 않는 삶>(필로소픽, 2015)이 출간됐다. 저자는 <알베르 카뮈: 인생의 원리>를 먼저 펴낸 바 있다. 책을 먼저 읽고 말미에 해제를 붙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옮겨놓는다. 결말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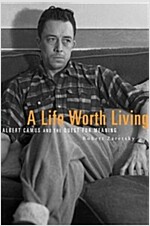

부조리에서 반항으로 가는 여정
(...)
카뮈는 프랑스에서 알제로 이주해온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생이다.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을 가리키는 ‘피에 누아르’에 속했다. 이 유럽 정착민들은 유럽인도 아니었고 아랍인과 베르베르족으로 구성된 알제리 토착민도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잡지 《콩바》의 편집장으로 맹활약을 펼치면서 지식인 저널리스트로 이름을 떨치지만 카뮈는 파리의 지식인 사회에 동화할 수 없었다. 지식인이란 말 자체를 불편해한 카뮈였다. 《반항하는 인간》을 둘러싼 논쟁으로 오랜 우정을 나누던 사르트르와 결별하고 말지만, 그들 사이에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 그 차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응답에서 잘 드러난다.
아무리 옳은 정치적 대의를 갖고 있더라도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 카뮈는 형이상학적 반항을 옹호했지만 그 과도함은 경계했다. 즉 그는 반항과 폭력을 구분하고자 했다. 모두 공포정치로 귀결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혁명은 카뮈가 보기에 반항의 변질이면서 반항에 대한 배신이었다. 《정의의 사람들》에 등장하는 러시아 테러리스트 칼리아예프는 혁명의 대의를 위해 폭탄을 투척하여 황제의 숙부였던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결코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비록 살인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 칼리아예프의 생각이자 카뮈의 믿음이었다. 때문에 칼리아예프의 선택은 순순히 체포돼 교수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반항에는 반드시 어떤 한계가 두어져야 한다고 카뮈는 생각했다. 그는 그것을 《반항하는 인간》에서 ‘정오의 사상’이라고 불렀다. 정오의 사상이란 절제와 절도의 사상이다. 그것은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을 경계하며 중용과 적도(適度)를 지향한다. 카뮈가 회복하고자 했던 고대 그리스의 정신이자 ‘지중해의 정신’이다.
이러한 ‘절제’는 ‘충실’과도 연결된다. 무엇에 대한 충실인가. 충실은 소설 《이방인》과 《최초의 인간》뿐 아니라 《단두대에 대한 성찰》에서도 등장하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 직접적인 기억은 아니고 어머니의 회고에 따른 것인데, 그의 아버지는 흉악한 살인범의 공개 처형 장면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마을로 떠났다가 큰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는 구토를 하고 침대에 쓰러졌다. 살인범을 처형하는 것이 그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단두대형이 집행되고 목이 잘려나가는 광경을 목격하자 그는 이 또 다른 살인에 경악했던 것이다. 카뮈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감정과 태도를 계승한다. 그는 자살이란 선택에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살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특히 그가 문제 삼은 것은 국가에 의한 테러와 합법적 살인이다. 그는 정의를 갈망하고 지향했지만 동시에 ‘살인이 합법화되지 않는 세상’을 추구했다. 그러한 윤리적 태도를 통해서 카뮈의 아버지는 카뮈 속에 자리했다.
부조리에서 반항까지 카뮈의 삶과 사유의 여정은 프랑스 지성사에서 ‘모럴리스트’의 여정에 부합한다. 모럴리스트의 역할은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다. 모럴리스트로서 카뮈는 작가 카뮈나 지식인 카뮈보다도 넓은 테두리를 갖는다. 이 모럴리스트 카뮈를 재조명함으로써 자레츠키의 《카뮈, 침묵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뮈를 좀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전히 고민하는 독자에게 카뮈의 생각과 행동은 충분히 되새겨봄직한 사례다.
15. 05. 17.



P.S. 비슷한 성격의 책으론 토니 주트의 <지식인의 책임>(오월의봄, 2012)을 같이 읽어볼 수 있다. 카뮈에 대한 가장 자세한 평전으론 주트도 추천한 올리비에 토드의 <카뮈>(책세상, 2000)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