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뉴스레터 독서인에 실은 '독서카페' 칼럼을 옮겨놓는다. 토니 주트의 <재평가>(열린책들, 2014)를 다루면서, 특히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회고와 성찰에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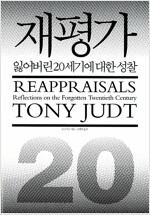


독서인(14년 8월) 재평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열린책들)에서 주인공 유리 지바고는 아주 간명하게 답한다. 병환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안나 이바노브나에게 그가 건네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인간,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자 영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며 당신의 의식은 한평생 그것을 호흡하고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며 기쁨으로 삼아 온 것입니다.”
지바고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과 불멸은 모두 타인 속에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추억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이 타인들에게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그러니 죽음이란 없으며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지바고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작가 파스테르나크의 생각이기도 했다. 소설에서 지바고는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 격동의 시간을 살다가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의 삶이 그걸로 종결되는 건 아니다. 이를 입증하려는 듯이 파스테르나크는 지바고가 남긴 시들은 작품의 마지막 장에 배치했다. 그 시들이 지바고의 ‘사후의 삶’이다. 그는 시를 통해서 기억되고, 그 기억이 남아 있는 한 불멸의 삶을 누린다.
그러한 불멸이 비단 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모든 저자는 그들의 책이 계속 읽히는 한 망각에서 불려나와 불멸의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이를테면 지난 2010년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난 역사학자 토니 주트도 그러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현대사를 다룬 <포스트워>(플래닛)로 명성을 얻은 주트는 명망 있는 정치평론가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번역된 <재평가>(열린책들)는 그의 두 직함이 어떤 상승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무엇을 재평가하고자 하는가. ‘잃어버린 20세기에 대한 성찰’이란 부제가 그의 의도를 집약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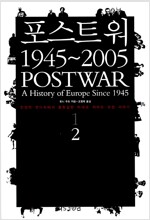
1994년에서 2006년까지 잡지나 신문들에 쓴 평론 모음집에서 주트는 두 가지 주제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 하나는 사상의 역할과 지식인의 책임이고(이 주제는 그가 <지식인의 책임>(오월의봄)에서 따로 다루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지나간 20세기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이다. 역사 또한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기억되는 한 우리 곁에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 반대로 역사의 망각이란 곧 죽음과 다를 바 없다. 망각된 역사는 역사의 죽음뿐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의 죽음을 뜻한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란 죽음의 시대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토니 주트의 묵직하면서도 매력적인 성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회고와 재평가다. 근래에 이 사건과 관련된 책들이 여럿 소개되면서 부쩍 관심을 갖게 된 때문이다. 가령 그래엄 엘리슨과 필립 젤리코는 국제정치학의 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결정의 엣센스>(모음북스)에서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태를 20세기 후반 인류가 겪은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비밀 해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미‧소 양국의 정책 결정과정을 모델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 당시 미 대통령 J.K. 케네디의 동생이자 핵심 측근이었던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의 <13일>(열린책들)은 긴박하게 진행됐던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증언과 회고를 담고 있으며, 역사학자로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엑스콤)의 회의 녹취 테이프를 처음 청취한 셀던 스턴의 <존 F. 케네디의 13일>(모던타임스)은 회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여 미국 측의 의사결정 과정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한 책이다. 그리고 제임스 블라이트와 재닛 랭이 엮은 <아마겟돈 레터>(시그마북스)는 미사일 위기 사태의 주요 당사자이자 결정권자인 니키타 흐루쇼프와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케네디 등이 서로 주고받은 43통의 편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거기에다 문제의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담은 학술적 연구서로서 이근욱 교수의 <쿠바 미사일 위기>(서강대출판부)도 보탤 수 있다.
사태의 발단은 무엇이었나. 1962년 10월 14일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 서부 상공을 비행하다가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 세 곳을 포착한다. 소련이 쿠바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10월 16일 아침에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미사일 위기 사태의 시작이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엑스콤이 소집되었고 결국 22일 저녁 7시에 쿠바 주변 해상에 대한 봉쇄가 결정된다. 특이한 것은 쿠바 내 미사일 배치와 증강 계획이 발각될 가능성에 대비책을 흐루쇼프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준비가 없기로는 케네디 쪽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사전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미사일 발사기지의 성격과 위험 정도, 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응책 등을 긴급하게 결정해야 했다.
케네디의 최종 선택은 부분적인 해상 봉쇄였지만 회의에서는 더 포괄적인 봉쇄, 쿠바 미사일 발사기지 공습, 전면적인 군사적 침공 등 훨씬 더 강경한 대응책들이 제안되었다. 사실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소련의 대륙간 탄도탄 발사 능력을 과장되게 염려하였고 케네디는 1960년 대선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활용했었다. 하지만 쿠바 위기 시점에서 소련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서 17대 1로 불리한 상태였고 흐루쇼프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흐루쇼프의 목적은 이러한 군사적 결점을 상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론 새로운 우방 쿠바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미국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카스트로를 제거하기 위한 온갖 공작을 짜내고 있었고 흐루쇼프는 미국이 쿠바를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쿠바 내 소련 미사일 기지 건설이라는 발상의 배경이다.

미사일 사태 국면에서 흐루쇼프와 케네디는 모두 핵전쟁을 각오할 생각이 없었지만 둘다 그 반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를 썼다. 소련은 포커 게임에서 나쁜 패를 쥐고서도 허세를 부리는 것과 비슷한 처지였는데, 흐루쇼프는 그래도 막판에 판돈을 더 올리고픈 유혹을 억눌렀다. 케네디도 대외적으로 강하게 보이려는 욕구를 갖고 있었지만 중대한 위기 국면에서 놀라운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장 온건한 방안을 선택했다. 즉각적인 군사 행동에 앞서 부분적인 해상 봉쇄를 선택한 것이다. 케네디는 비타협적인 선택을 하면서 소련에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남기고자 했지만 실상 마지막까지도 협상을 모색하면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거듭 연기하고자 했다. 정작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게 해준 것은 그의 인내와 절제였고 대결보다는 협상을 일관되게 우선시했던 태도였다.
냉전 시대의 가장 큰 위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생생한 자료와 분석은 오늘날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참고가 된다. 더불어, 시인이 시를 통해서 기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그의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기억된다는 사실 또한 토니 주트의 성찰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14. 0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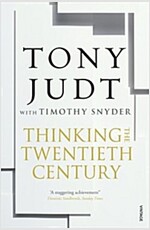
P.S. <재평가>는 반가운 책이지만(<20세기를 생각한다>도 나옴직하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장을 읽다 보니 교정이 부실한 듯해 아쉽다. 419쪽, "케네디가 10월 9일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에서 케네디가 말한 날짜는 10월 9일이 아니라 10월 19일이다. "사흘 뒤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라고 나가는 문장에서는 '사흘 뒤'가 아니라 '사흘 전'(Three days earlier)이 맞다. "사흘 전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다(즉 10월 16일을 가리킨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16일에서 28일까지 13일간 벌어졌던 일이다. 역자나 편집자가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 425쪽, "소련은 10월 17일 쿠바 상공을 정찰하던 U-2기 한대를 '무심결에' 격추시켰다."에서도 미국 정찰기가 격추된 날짜는 10월 17일이 아니라 27일이다. 이런 사소한 실수들로 책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건 피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