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앙선데이에서 '로쟈의 문학을 낳은 문학'을 옮겨놓는다. 이번에 다룬 건 셰익스피어의 <태풍>과 에메 세제르의 <어떤 태풍>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어떤 태풍>은 셰익스피어의 <태풍>을 패러디하여 다시 쓴 작품이다. 셰익스피어의 <태풍>은 국내에 <템페스트>, <폭풍우> 등의 제목으로도 번역돼 있다. 최근에 나온 최종철 교수의 운문 번역 셰익스피어 전집판에서는 <태풍>이라 옮기고 있어서 그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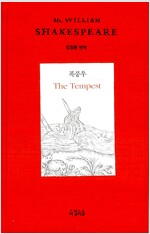
중앙선데이(14. 05. 04)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건 무엇인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식민지 쟁탈전을 주도한 나라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었다. 그 뒤를 이은 영국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대서양 패권을 차지함으로써 17세기에는 식민지 경영의 선두 국가가 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동시대 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도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반영돼 있는데, 『태풍(The Tempest)』(1611)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복수와 로맨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나폴리의 왕 알론소 일행은 아프리카 튀니스에서 딸의 결혼식을 마친 뒤 배를 타고 돌아가던 중 태풍을 만나 난파해 어느 섬에 도착한다. 그 섬에는 12년 전 밀라노의 공작이었다가 동생 안토니오와 알론소의 계략으로 쫓겨난 프로스페로가 어린 딸 미란다와 함께 살고 있다. 알론소 일행을 난파시킨 태풍은 바로 프로스페로가 복수를 위해 마법을 부려 일으킨 것이다. 불의한 세력에 지위를 잃은 프로스페로가 다시금 정의를 회복하는 이야기라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낯설지 않다. 문제는 프로스페로가 도착한 섬에는 원래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섬은 애초에 시코락스라는 여자 마녀가 지배하고 있었다. 프로스페로는 시코락스를 물리치고 마녀의 박해를 받던 요정 아리엘을 해방시켜 심복으로 삼고 마녀의 아들 칼리반은 하인으로 부린다. 프로스페로는 이들의 해방자를 자임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독재자로 군림한 것이다. 칼리반은 ‘야만인’으로 불리지만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의식하고 프로스페로에게 항의한다. “당신이 빼앗은 이 섬은 내 거요, 어머니 시코락스의 유산으로.”
그러자 미란다는 칼리반에게 자신이 말을 가르쳐줘 짐승의 처지에서 면하게 해준 것을 상기시킨다. “야만인인 네 녀석이 자기 뜻을 못 알리고 가장 못난 짐승같이 중얼중얼했을 때 나는 네 의도에 언어를 부여했어.” 하지만 칼리반은 “당신이 가르친 언어로 내가 얻은 이득은 저주할 줄 아는 거요”라고 대꾸한다.
프로스페로가 ‘권력에서 쫓겨난 자’와 ‘권력을 탈취한 자’라는 이중적 형상을 가짐에 따라 『태풍』의 주제도 ‘알론소 일행에 대한 프로스페로의 복수’와 ‘프로스페로에 대한 칼리반의 반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자가 권력 쟁탈전의 양상을 띤다면, 후자는 식민지 해방 투쟁이라 이름 붙일 만하다. 결말에 이르러 프로스페로는 알론소와 안토니오를 용서하고, 미란다를 알론소의 아들 페르디난드와 결혼시키며, 그 자신은 밀라노 공작의 지위를 회복한다. 반면에 칼리반은 프로스페로에 대한 반란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한다. 전형적인 셰익스피어 식의 결말이다. 그렇지만 프로스페로에 대한 칼리반의 순응과 예속은 뭔가 부당하다.



프랑스에서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학운동을 이끌었던 에메 세제르의 『어떤 태풍』(1969)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셰익스피어의 『태풍』을 패러디한 것이다. 세제르의 ‘다시 쓰기’는 원작을 교정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칼리반을 식민주의적 지배에 순응하지 않는 피식민자로 재창조해 낸 세제르는 칼리반의 투사적 면모를 강조해 원작의 메시지를 전복하고자 한다. 세제르의 칼리반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우후루!’라고 내뱉는데, 이것은 ‘자유’를 뜻하는 원주민 말이다. 프로스페로가 그에게 가르쳐 준 말 대신에 원주민어를 쓴 것은 『어떤 태풍』의 칼리반이 『태풍』의 칼리반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문제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더 나아가 『어떤 태풍』의 칼리반은 프로스페로에게 더 이상 자신을 칼리반이라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다. 칼리반이라는 이름은 증오를 담아 부르는 호칭이기에 수치감이 든다는 것이다. “날 X라고 불러 주시오. 그게 가장 어울릴 것 같소. 이름 없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말이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을 도둑맞은 인간이라는 뜻이오.” 프로스페로가 붙여준 ‘칼리반’이라는 이름이 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뿐이다.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프로스페로의 말만 믿고 그에게 복종하는 아리엘과 달리 칼리반은 능멸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태풍』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태풍』에서도 칼리반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체포돼 신문을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순응적인 하인으로 돌아가는 『태풍』의 칼리반과는 달리 『어떤 태풍』의 칼리반은 당당하다. 그는 화해를 거부하며 자신의 유일한 관심은 자유라고 말한다. 칼리반은 프로스페로의 교만을 질책하고 ‘늙어빠진 사기꾼’일 따름이라고 일갈하면서 자기해방을 선언한다. “네놈의 표현을 빌리면 야만인이라는 둥,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는 둥 그게 네놈이 내게 가르쳐 준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제, 나는 그 모습을 거부한다. 그건 거짓이므로!”
『어떤 태풍』의 결말에서 섬에 남아 늙고 쇠약해진 프로스페로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해 “자유 만세!”를 외치는 칼리반의 모습은 셰익스피어를 맞받아치고자 했던 세제르의 의도를 잘 집약하고 있다.
14.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