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앙선데이의 '로쟈의 문학을 낳은 문학'을 옮겨놓는다.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와 사르트르의 플로베르론 <집안의 천치>를 글거리로 삼았다. 방대한 분량의 <집안의 천치>는 국내에 번역돼 있지 않고 번역될 가능성도 희박한 책이다. 다만 사르트르의 자서전 <말>과 함께 지영래 교수의 연구서 <집안의 천치>(고려대출판부, 2009)를 참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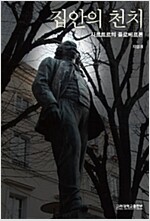
중앙선데이(14. 03. 23) “인간적인 것은 무엇 하나 내게 무관한 게 없다”
사르트르의 대표작이라면 흔히 소설 『구토』나 철학서 『존재와 무』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정작 사르트르 자신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자부한 책은 플로베르에 대한 평전인 『집안의 천치』(1972)였다. 세 권으로 출간한 이 책의 합계가 3000쪽에 달한다는 사실에 기가 질리겠지만 이것도 완성작이 아니었으니, 네 번째 권은 『마담 보바리』(1856)에 대한 본격적인 해부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플로베르에 대한 매혹은 아홉 살 때부터 시작됐다. 치열한 독서가였던 할아버지의 서재는 어린 사르트르에게도 성전(聖殿)이었던 것이다. 자서전 『말』(1964)에 따르면, 조숙한 독서가였던 사르트르는 특히 『마담 보바리』의 마지막 장면을 스무 번도 넘게 읽었다. 엠마가 자살한 후의 장면으로, 주인공 엠마가 아니라 남편 샤를르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시골 의사 샤를르 보바리와 결혼한 엠마는 무능한 남편과 일상의 권태로부터 탈출을 꿈꾼다. 정부들과 밀회를 갖는 한편 사치스러운 소비로 상류 사교계에 대한 선망을 충족시키려 한다. 하지만 빚 독촉에 시달리자 결국 극약을 먹고 자살한다. 유품을 정리하던 샤를르는 아내가 정부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샤를르는 정부 가운데 한 명이었던 로돌프와 우연히 마주치자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튿날 샤를르는 벤치에 앉아 쓸쓸히 숨을 거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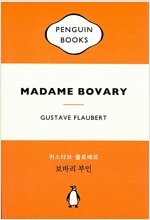


아홉 살 사르트르는 의문을 품는다. “그 불쌍한 홀아비의 행동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편지를 찾아냈다는 것이 수염을 기를 이유가 될까? 로돌프에게 우울한 시선을 던지는 것을 보면 그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또 무슨 까닭에 로돌프를 보고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라고 말한 것일까? 로돌프가 그를 ‘우습고 좀 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뿐만 아니라 샤를 보바리는 왜 죽게 되었을까? 슬퍼서일까, 아파서일까?”
그리고 이런 의문들은 좀 더 원론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그 책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썼을까?” 어린 손자의 질문이었건만 할아버지는 장난 대신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니 인간적인 것은 무엇 하나 내게 무관한 게 없다.” 어린 손자가 마음껏 책을 읽게 해준 할아버지는 동시에 사르트르의 원초적 물음도 명료하게 해 준 셈이다. 작가로서, 철학자로서 사르트르의 필생의 목표는 바로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해명하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집안의 천치』를 쓰게 된 동기도 그런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한 인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게 사르트르가 내건 주제였다. 그는 플로베르라는 한 인간을 해명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인문학적 지식을 동원했다. 작가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했고, 인격 분석을 위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원용했다. 그러고도 생기는 공백은 허구를 가미한 상상력으로 채웠다.

그런데 왜 하필 플로베르였을까? 자서전을 쓸 무렵 사르트르는 자신이 왜 지금의 사르트르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안다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쉽게 말할 수 없다. 『말』이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에서 멈춘 건 그런 난점에서였을 것이다. 그는 적절한 방법론을 찾아 이를 시험해 보고자 했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로서 ‘문학’이라는 것을 선택한 플로베르는 그의 닮은꼴이었다! 사르트르는 플로베르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플로베르와 사르트르의 성장 과정은 다르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사르트르와 달리 플로베르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냉정한 어머니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나 주눅 들어 지냈다. 일곱 살 때까지 말을 깨치지 못해 ‘집안의 천치’라고까지 불린다. 하지만 정작 플로베르를 위대한 작가로 만든 원동력은 이러한 신경증적 상황에서 벌인 투쟁이었다. “사람은 저항함으로써만 자신을 확정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속속들이 불확정적인 존재였다.”
반면 아버지의 부재는 사르트르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플로베르가 겪은 종류의 투쟁은 그의 몫이 아니었다. “세상에 훌륭한 아버지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일반 법칙이다. 남자들이 나쁜 탓이 아니라 부자간의 관계란 원래 고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뭐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이를 소유하겠다니 그런 당치 않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만일 나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내 위에 벌렁 누워서 나를 짓누르고 말았으리라.”
하지만 그런 사르트르도 아버지가 아쉬울 때가 있었다. 『말』에는 어른이 된 사르트르가 식당 주인의 일곱 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없을 땐 내가 주인이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경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내가 그 아이 또래였을 때, 나는 그 누구의 주인도 아니었고,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반면 플로베르에겐 투쟁해야 할 아버지가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담 보바리』라는 걸작을 쓸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14. 03. 23.





P.S. <집안의 천치>(예전에는 <집안의 백치>라도 표기됐다)는 불어판으로는 세 권짜리라고 했지만, 영어판으로 다섯 권짜리다. 언어로 된 '히말라야 산맥'이란 표현이 과장이 아닐 만큼 무지막지하지만 구입하려고 하니 하드카바라서 가격도 만만찮다(40만원이 넘어간다). 소장하는 건 미래의 일로 미뤄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