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앙선데이에서 '문학이 낳은 문학'을 옮겨놓는다. 중국의 문호 루쉰의 단편 <광인일기>와 고골의 단편 <광인일기>를 다뤘다. 루쉰이 일본 유학 시절 러시아 문학을 접하고 탐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데뷔작인 <광인일기>는 고골의 작품에서 제목과 발상을 따온 것으로 유명하다. 두 작품의 주제나 초점은 다르지만,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의 러시아문학 수용은 관심이 가는 주제이긴 하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아쉽다(굉장히 비싼 가격의 학술서가 약간 있긴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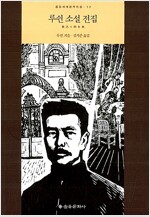

중앙선데이(13. 12. 29) 왜 그들이 세상을 다 차지하는 걸까
중국 근대사의 거인이자 전투적인 지식인 루쉰. 그는 어떻게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국비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의학을 공부하던 루쉰에게 하루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수업시간에 환등기로 미생물 사진을 보여주던 교수가 시간이 남자 러일전쟁 관련 자료들을 보여 주었는데, 그중에 러시아에 군사기밀을 넘긴 죄로 일본군에게 총살당하는 중국인이 있었다. 그 중국인 주위에는 건장하지만 몽매한 중국인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잔뜩 모여 있었다. 일본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지만, 루쉰은 참담한 심정이 된다. 병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정신을 뜯어고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 루쉰은 당장 학교를 때려치운다. “어리석고 겁약한 국민은 체격이 아무리 건장하고 우람한들 조리돌림의 재료나 구경꾼이 될 뿐”이므로.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뜻을 펼칠 수 없었다. 좌절감에 빠져 허송세월만 보내던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와 『신청년(新靑年)』에 글을 청탁한다. 중국의 현실에 대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루쉰은 이런 말로 거절한다. “쇠로 만든 방이 있는데 창문도 없고 부술 수도 없다.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고 곧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이들을 깨우는 것이 온당할까? 그들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결국 친구의 강권으로 루쉰은 글을 쓰게 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중국 최초의 근대소설 『광인일기』(1918)다. 잠들어 있는 중국 인민을 깨우려는 그의 첫 ‘외침’이었다.
루쉰의 걸작이 무에서 탄생한 것은 아니다. 제목부터 형식까지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영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 세기 전에 쓰인 고골의 『광인일기』(1835)는 과대망상증에 빠진 하급관리의 일기다. 관청의 하찮은 직급인 포프리시친은 국장의 집에서 연필 깎는 일을 하다가 국장의 딸에 대한 은밀한 욕망을 키운다. 마흔을 이미 넘긴 초라한 행색의 포프리시친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꿈이지만, 국장의 딸이 고위관리와 결혼할 거라는 걸 알자 그의 분노는 폭발한다.
“이 세상은 시종무관 아니면 장군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내가 어떤 초라한 재물이라도 찾아내어 손에 넣으려고 하면, 으레 시종무관이나 장군이 가로챈다. 제기랄! 나도 장군이 되고 싶다. 청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장군이 되면,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착 달라붙어서 모호한 말과 예절을 다해 아부할지 보고 싶어서다. 그 다음엔 그자들한테 침이라도 뱉어 주고 싶다. 제기랄, 화가 치민다!”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포프리시친은 아예 현실 밖으로 튕겨 나간다. “나는 왜 9급 관리가 되었을까? 어쩌면 나는 백작이나 장군인데, 다만 9급 관리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아마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역사에도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금지된 욕망을 향한 집착은 욕구불만을 더해만 가더니, 포프리시친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조작하기에 이른다.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있던 그는 마침내 자신이 하찮은 관리가 아니라 스페인 왕이라는 걸 발견한 것이다. 아니, 그렇다고 믿는다.

루쉰의 『광인일기』도 과대망상증에 걸린 한 광인의 일기다. 어느 관청의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피해망상증에 걸린 작가의 외사촌동생이 소설의 모델이다. 억압에 짓눌린 힘없는 광인의 분노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망상을 만들어 내고 만다. 루쉰은 위대한 러시아 작가 고골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 사회에서 소외된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시야를 넓혀 봉건제적 질서의 해악을 폭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루쉰은 ‘인의(仁義)’니 ‘도덕’이니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명분일 뿐이라고 고발하는 것이다. “4000년간 줄곧 사람을 먹어 온 곳”에 섞여 살아 왔다는 광인의 발견은 중국 현실에 대한 루쉰의 급진적이고도 철저한 절망을 반영한다. “사람을 먹는 자가 내 형일 줄이야! 내가 사람을 먹는 사람의 동생일 줄이야!”
루쉰은 자신의 『광인일기』가 고골의 소설보다 울분을 더 깊고 폭넓게 토로했다고 스스로 평하기도 했다. 정신병원을 스페인 왕궁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때리는 자들을 고위 관리라 여기는 고골의 광인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머니! 이 병든 아들을 가엾게 여겨주세요! 그런데 알제리 총독의 코밑에 혹이 있는 것을 아세요?”
반면 루쉰의 소설은 광인의 노심초사로 끝을 맺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이, 너무나 희미해서 더욱 처절한 희망이 엿보인다. “사람을 먹어 본 적 없는 아이가 혹 아직도 있을까? 아이를 구해야 할 텐데….” 중국의 개조를 향한 위대한 행보의 첫걸음은 울분의 토로와 절망의 외침이었다.
1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