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련 원서를 사들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뇌과학이다, 며칠전에는 라마찬드란의 <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알키, 2012)의 원서를 다른 뇌과학서 몇 권과 함께 배송받았다. 번역본은 지난봄에 나왔지만 독서는 미뤄둔 상태였다. 원서도 구한 김에 머리말을 읽어보았다. 저자는 저명한 뇌과학자로(리처드 도킨스는 그를 가리켜 '신경과학계의 마르코 폴로"라고 불렀다) 국내에 여러 권의 책이 소개돼 있지만(그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인지신경과학'이라고 부른다), 이 분야의 특성상 가장 최근의 책을 읽는 것이 유리하다. <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가 바로 그런 책으로 라마찬드란의 최신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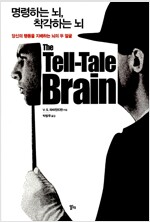


저자는 먼저 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경탄과 자부심을 늘어놓는다. 20세기 마지막 25년 이전까지 지각과 정서, 인지, 지능에 관한 엄격한 과학적 이론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번역엔 누락됐는데, 색채 인지(color vision) 분야만 유일한 예외였다). "20세기 대부분에 걸쳐 인간행위를 셜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내세웠던 것은 프로이트주의와 행동주의라는 이론체계였다. 둘 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극적으로 퇴색했다."(10쪽) 그리고 이 시기에 신경과학은 '청동기 시대'를 넘어섰다. 물론 결코 긴 시간이라곤 볼 수 없다.
이어서 "물리학, 신경과학 등은 여전히 초기단계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Compared with physics and chemistry, neuroscience is still a young upstart."를 무성의하게 옮긴 것이다. "물리학, 화학과 비교한다면 신경과학은 아직 신출내기 학문이다" 정도로 옮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발전은 괄목상대할 만하다. "유전자에서 세포, 순환계, 인식까지, 오늘날의 신경과학의 심오함은 내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보다 몇 광년을 넘어섰다. 지난 10년 동안 신경과학은 전통적으로 인문학이 주도해온 지식체게에 상상력을 불어넣을 만큼 발전을 이루었다."는 게 라마찬드란의 자평이다. 예상할 수 있는 그의 전망: "이러한 발전은 다가오는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100년 전에 고전물리학을 뒤집은 개념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11쪽) '10년 동안'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하게는 '수십년 동안(decade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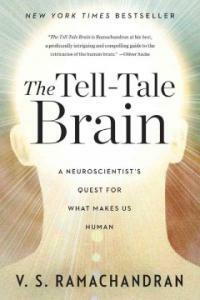
이어서 저자는 책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는데, 몇 가지 주제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인간은 단지 영장류와 다른 종이 아니라 유일하고 특별하다는 것이다."(11쪽) "인간도 단지 원숭이일 뿐"이라고 믿는 다수의 동료들과 견해가 다르다는 걸 그는 인정한다. 저자가 보기엔 영장류에서 인간으로의 진화과정에서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졌다. 그 도약은 물론 '뇌'의 발달과 기능의 전용 때문에 가능했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닥은 진화에 대한 전망이다. 뇌가 어떻게 진화할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12쪽) 이 대목은 엉터리로 번역됐는데, 원문은 "Another common thread is a pervasive evolutionary perspective.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how the brain works without also understading how it evolved."이다. '진화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진화론적 관점'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다는 애기다. 그리고 "뇌가 어떻게 진화할지"가 아니라 "뇌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작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어서 저자는 생물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Theodosius Dobzhansky)의 말을 인용하는데, "위대한 생물학자 테오도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옮겼다. '위대한 생물학자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라고 하거나 그냥 '위대한 생물학자 도브잔스키'라고 해야 했다(도브잔스키는 진화생물학 책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다). 생물 체계에서는 구조외 기능, 기원 간에 하나의 큰 공통점이 있기에 어느 하나를 이해하려면 나머지 두 개를 잘 알아야 한다. 진화적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 진화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능의 전용이다.
우리들의 고유한 정신적인 특징 중 많은 것이 원래는 다른 원인으로 진화한 뇌 구조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새의 깃털은 비늘에서 진화했는데 원래 역할은 나는 것보다는 단열에 있었다. 박쥐와 익룡의 날개는 원래는 걷기 위해 디자인된 앞다리였다. 인간의 폐는 부양 조절을 위해 진화한 물고기의 부레에서 진화한 것이다. 진화의 기회주의적이고 우발적인 속성은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던 용어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유명한 에세이 <자연의 역사>가 대표적이다.(12쪽)
여기서 저자가 직접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화의 기회주의적이고 우발적인 속성"을 스티븐 제이 굴드는 '굴절적응(exaptation)'이라고 불렀다. 한편 번역본은 "스티븐 제이 굴드의 유명한 에세이 <자연의 역사Natural History>"라고 하여 마치 <자연의 역사>가 책 이름인 양 옮겼는데(있지도 않은 대문자로까지 표기했다!) 그냥 "자연사 혹은 자연학(natural history)에 관한 스티븐 제이 굴드의 유명한 에세이들"을 가리킨다. 아래와 같은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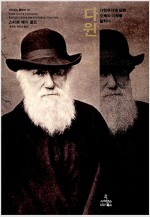

라마찬드란의 기본 관점은 우리의 뇌 역시 굴절적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진화는 원숭이 뇌의 많은 기능을 급격하게 바꿔 전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창조했다. 그 중 몇몇은 - 예를 들면 언어 - 너무나 강렬했다. 생명이 화학과 물리학의 일반적인 변화를 초월할 정도로 원숭이 종의 한계를 뛰어넘은 어떤 종을 만든 것이다."(12쪽) 즉 생명현상이 물리/화학적 현상과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원숭이와 구분되며, 그 사이엔 질적인 도약이 있다는 것. 저자의 기본 생각은 그렇게 간추릴 수 있다. 몇 페이지 안 읽었지만 다소 번거롭게도 번역은 주의해서 읽어야 할 듯싶다. 좀 무성의한 번역이라고 덮어두기엔 물론 너무 흥미로운 책이다...
1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