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진 모나리자와 그림 너머에 있는 것
사라진 모나리자와 그림 너머에 있는 것
<공간>(1월호)에 실은 북리뷰를 뒤늦게 옮겨놓는다. 택배 사고로 잡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루게 됐는데, 그냥 초고를 옮겨놓는 것이다(편집과정에서 약간 수정됐을 수 있다). 책은 지난해 '올해의 책'의 하나로 꼽기도 했을 만큼 흥미로웠다.

공간(11년 1월호) 모나리자 훔치기
“왜, 예술은 우리를 눈멀게 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책의 제목이 <‘모나리자’ 훔치기>인 것은 ‘모나리자 도난사건’을 실마리로 삼고 있어서다. 실제로 1911년 8월 21일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걸려 있던 <모나리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던 사건이다. 정기휴관이었던 탓에 24시간이 지나서야 그림이 사라진 사실이 알려졌고 대규모 수사팀이 차려졌다. 기자회견이 열리고 모든 신문의 1면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도배됐다.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한 그림이 일약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재탄생하게 됐고, 사람들은 구름처럼 루브르로 몰려들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군중들이 보고자 한 것은 <모나리자>가 아니라, 그것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이었다. 구경꾼의 대부분은 이전까지 <모나리자>를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아예 루브르에는 발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즉 그들은 예술작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꾸로 거기에 없기 때문에 보러갔다! 이것은 미술사의 해프닝일까? 혹은 새로운 대중문화 현상일까? 이 도난사건은 2년 뒤에 이탈리아 출신의 평범한 노동자 페루지아가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라캉주의 정신분석가인 저자는 이 사건이 미술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이유에 대해 뭔가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이 희대의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술작품과 그것이 점하고 있던 텅 빈 공간 사이의 분열이 갖는 의미를 말해준다. 작품이 비어 있다고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다. “미술작품이 기거하는 곳은 특별하고, 신성한 공간, 즉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미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공간이다.” 그러니 <모나리자>가 사라진 공간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이 뭔가 ‘착각’한 건 아니었다. 그들은 미술작품의 한 본질적 구성요소에 관심을 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결부돼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핵심적인 경험 중의 하나는 상실의 경험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금지에 의한 어머니의 상실, 교육의 규제에 의한 육체적 쾌락의 상실, 말과 언어 습득에 내재된 다양한 상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런 상실은 자연스레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예술은 그 욕망 추구를 상징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장소이며 예술가들은 그 욕망의 순수성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이다. 흔히 ‘승화’라고 불리는 그런 상징화·정교화의 시도는 항상 실패한다. 미술의 대상은 그것 자체로는 재현될 수 없으며 항상 그것 너머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대상이 재현 불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망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술작품과 그것이 차지하는 장소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존재한다. 새로운 작품이 항상 진품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하는 이유다.
하지만 예술적 승화의 ‘실패’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자면 우리는 ‘승화’가 아니라 ‘승화시키기’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런 승화이론을 입증해주기라도 하듯이 미술사에는 “그림을 끝내지 않기 위해 바쁜 화가들”도 많다.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도 미완성이란 평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미술사가 바사리는 그가 “4년이나 그렸지만 여전히 끝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는 많은 작품을 시도했지만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 부지기수였다. 아예 “레오나르도는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했지만 어떻게 그림에서 손을 떼어야 할지는 모르는 듯했다”고 평한 동시대인이 있을 정도다.

모던아트의 가장 유명한 미완성 <큰 유리>를 만든 마르셀 뒤샹도 ‘악명 높은’ 사례다. 최소 8년 동안 작업을 했지만 뒤샹은 거의 고의적으로 이 작품의 완성을 미루었으며, 작품은 죽기 몇 해 전에 전시되었을 때도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다. 심지어 그는 <큰 유리>의 유리판이 운반 도중 파손됐을 때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자기 작품이나 모던아트 일반에 대해 조롱하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규정에서도 벗어나려고 했던 뒤샹의 관심사는 오히려 “예술작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였다. 그는 자신과 작품 사이의 연루까지도 거부하고자 처음 만든 레디메이드들에 ‘마르셀 뒤샹 작(by Marcel Duchamp)’이 아니라 ‘마르셀 뒤샹으로부터(from Marcel Duchamp)’라고 서명했다. 그에게 ‘작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과정’이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미술계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 않고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뒤샹은 마치 살아있는 텅 빈 공간과도 같았다.”
한때 미술이론 분야에서 열렬히 수용되었다가 지금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지만 미술과 시각에 관한 프로이트와 라캉의 이론은 저자의 주장대로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해주며 깨닫게 해준다. 승화의 의미와 미완성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고, “미술은 결국 의사소통에 관한 일이 아니라 만들기에 관한 일”이라는 통찰에 고개를 끄덕이게 해주는 것은 그 중 하나다.
1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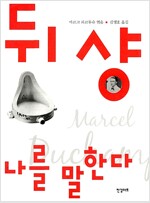
P.S. 지난 12월에 서평을 쓰면서 구해놓은 책은 베르나르 마르카데의 평전 <마르셀 뒤샹>(을유문화사, 2010)이다. 오래 전에 뒤샹에 관한 자료를 좀 뒤적인 기억이 있는데, 다시금 관심을 갖게 돼서다. 이번엔 레디메이드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작업방식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