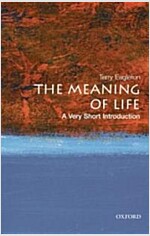인문서 분야에서 올해의 저자라면 마이클 샌델이 되겠지만, 시야를 좀 좁히면 올해는 테리 이클턴의 해도 된다. 실제로 방한하기도 했지만 '이글턴의 귀환'이라고 할 만큼 그의 책이 여러 권 출간됐기 때문이다. 대미를 장식한 것이 <이론 이후>(길, 2010)다. 번역 소식은 진즉에 알고 있었고, 원서도 오래 전에 구해놓은 터라 출간되자 마자 손에 넣었다. 사실 그의 히트작인 <문학이론입문>을 '즐독'하던 시절이 20년쯤 전이어서 이글턴은 내게 '청춘의 독서'를 상기시켜주는 저자다. 내년 강의준비도 할 겸 다시금 '즐독'에 빠져봐야겠다(원서를 어디에 두었나 찾아봐야겠다). 리뷰기사를 옮겨놓는다.

한겨레(10. 12. 18) 포스트모더니즘에 종언을 고함
<이론 이후>는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문화이론가 테리 이글턴(1943~·사진)의 2003년 저작이다. 2003년이면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이라크를 초토화하던 시점이다. 이글턴은 “미국 정부를 장악한 극단주의자들과 반(半)광신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날뛰고 있는데도, 이런 반인륜적 광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진보운동이 주저앉은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론의 무기력’에서 찾는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통설”인 ‘포스트모더니즘’이 문제다. 아무런 전망도 저항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임의 이념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글턴은 바로 그 포스트모더니즘이 종언을 고했다고 선언한다. 이 책은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떤 경로로 서구 좌파의 대세를 장악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이 이념이 무기력 속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글턴 특유의 생기 넘치는 언어로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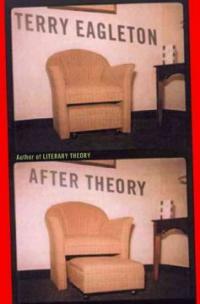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이론’이란 ‘문화이론’을 가리킨다. 문화이론은 1960년대의 격동 속에서 태어났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의 흐름을 타고 격렬해진 서구 학생운동이 문화이론의 산파 구실을 했다. 당시 학생운동은 자본주의 지배체제에 복무하는 인문학을 격하게 거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문학이 전면적인 자기성찰을 감행했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문화이론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란 것은 바로 인문학의 비판적 자기 성찰이다.” 문화이론의 황금기는 1965년부터 1980년 사이 15년이었다고 이글턴은 말한다. 이 문화이론의 황금기를 수놓은 사람들로 이글턴은 “자크 라캉,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루이 알튀세르,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를 거명하고 또 “레이먼드 윌리엄스, 뤼스 이리가레, 피에르 부르디외, 줄리아 크리스테바, 자크 데리다, 엘렌 식수, 위르겐 하버마스, 프레드릭 제임슨, 에드워드 사이드”를 불러 세운다. 거의 전부가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를 이끈 프랑스 출신 좌파 이론가들이다.
이 빛나는 별들을 쏘아올렸던 ‘문화이론’은 1980년대에 들어와 소비주의가 만연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몰락해 버렸다. 그 이론의 폐허 위에 깃발을 꽂은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이글턴은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의 대항문화가 낳은 이론들 속에서 자라났으나 결국에는 그 이론들의 건강한 비판성을 잃어버린 껍데기 이념이다. 이글턴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자로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프랑스 철학자 프랑수아 리오타르, 장 보드리야르, 미국 철학자 리처드 로티, 그리고 몇몇 급진 페미니즘 이론가들을 넌지시 지목한다.
이글턴이 보기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지적 흐름은 “총체성, 보편적 가치, 거대한 역사적 담론, 인간 실존의 튼튼한 기반, 객관적 지식의 가능성”을 거부한다. 또 “진리·통일성·진보에 회의적이다.” 요컨대, 영원한 보편적 진리도, 보편적으로 타당한 가치도, 인간 실존의 굳건한 토대도 없다고 보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이어서, 거기서 진리나 보편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글턴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런 주장들이 모두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글턴이 예로 드는 것이 규범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규범적인 것’을 ‘억압적인 것’과 동일시한다. “규범은 억압적이다.” 정말 그런가. 어떤 규범은 억압적일 수 있지만 규범 자체가 억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규범이 없다면 유아살해범을 처벌할 수도 없고 홀로코스트를 규탄할 수도 없다. “규범이 늘 우리를 구속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낭만적 망상일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진리는 도그마다’라는 명제일 것이다. 이글턴은 이 명제야말로 우리의 행동을 옭아매는 가짜 명제라고 단언한다. 진리를 옹호하는 것은 교조주의도 아니고 광신주의도 아니다. “인종차별주의는 악이다”라는 명제는 인종차별주의의 희생자들에게만 진리인 것이 아니다.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서 진리는 존재한다. 그런 진리를 옹호할 수 없다면 여성이 억압받고 있다든가 기업의 탐욕이 지구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
이글턴은 말한다. “초국적 기업들이 지구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펴져나가는 동안 지식인들은 보편성이란 일종의 환상이라고 목청 높여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2003년의 전 지구를 뒤덮은 네오콘 광기였다. 이런 광기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끝없이 자기 회의와 자기 부정에만 골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끝에 다다른 듯하다.” 이글턴은 “이론 없이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숙고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이론 이후’에 존재할 수 없다”며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론적 파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화이론이 자본주의의 저 야심만만한 전 지구적 역사와 싸워나가야 한다면 자기만의 책임있는 원천을 지니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는 다시 힘주어 말한다. “문화이론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저 숨 막힐 듯한 통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들을 탐구하라.” (고명섭 기자)
10 12 19.



P.S. 올해 더 나온 이글턴의 단행본 저작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오면 좋겠다 싶은 책 세 권은 아래와 같다. <악에 대하여>, <삶의 의미>, <타인을 만나는 어려움> 등이다. 처음 두 권은 비교적 얇은 책이고 '윤리학 연구'란 부제가 붙은 세번째 책은 야심작이다. <문학이론입문>의 개정판으로 <문학이론입문>(3판)도 번역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