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문학동네 블로그에 연재하는 '로쟈의 스페큘럼'을 옮겨놓는다. 어제 보낸 원고인데,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 <차 한 잔> 읽기이다. 분량상 한번 더 다루어야 할 듯하다. 전문은 http://cafe.naver.com/mhdn/17269 에서 읽어보실 수 있다.


펭귄판 『가든파티』의 서문에서 로나 세이지는 맨스필드를 가리켜 “배제, 불안, 이동, 단속성을 글로 피력했던 대단한 모더니즘 작가”(one of the great modernist writers of displacement, restlessness, mobility, impermanence)였다고 평했다. 그녀를 특징짓는 명사들은 모두 이동성의 범주에 속한다. 가난한 축에 속했다면 ‘자주 이사를 다닌 모더니즘 작가’로 불렸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러한 특징은 맨스필드 자신이 뉴질랜드 태생이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활동한 작가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맨스필드가 작품 속에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계급의식’이다. 맨스필드의 문학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가든파티」를 비롯한 몇몇 작품에서는 두드러지는 주제다. 나로선 특히 「차 한 잔」 같은 작품으로 맨스필드를 기억하게 된 까닭에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론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우선 주인공은 결혼 2년차의 로즈머리 펠이다.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고, 남편은 그녀를 끔찍이 사랑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가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 쇼핑을 하고 싶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동네가게 가듯이 파리로 훌쩍 떠나버리는 식이다. 꽃을 사고 싶으면 고급 꽃가게에 들러서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된다. 라일락은 싫다고 말하면 점원은 지당하다는 듯이 굽실거리며 라일락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그리고는 가냘픈 여점원이 커다란 흰 종이 봉지를 한 아름 안고서 비틀거리며 차를 타는 곳까지 그녀의 뒤를 따른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오후 로즈머리 펠은 자주 들르는 골동품 가게에 들렀다가 주인이 소개하는 아주 고가의 조그마한 상자를 본다. 탐나는 물건이었지만 주인에게 보관해달라고만 하고 길을 나선다. 그때 그녀는 잠시 이상한 통증을 느낀다.


누구나 살다보면 두려울 때가 있게 마련이다. 숨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뛰쳐나와 밖을 내다볼 때 그건 참말로 끔찍하기만 한 순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특제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위고 시꺼멓고 희미한 모습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자가 - 어디에서 왔을까? - 로즈마리 바로 곁에 서 있었다.”
그렇게 문득 로즈머리의 공간으로 ‘침범’해온 가여운 여인이 흐느낌에 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한다. “사-사모님, 차 한 잔 값만 주시겠어요?” 그녀는 차 한 잔 값도 갖고 있지 않은 무일푼이었다. “참 희한하군요!”(How extraordinary!)라는 것이 로즈머리의 인상이다. 사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건, 그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녀에겐 예사롭지 않은 일이며 ‘특별한’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 더 희한한 일을 고안해낸다. 마치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서 불쑥 튀어나온 듯한 이 만남이 그녀에겐 예사롭지 않은 사건, ‘모험’(adventure)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면 어떨까? 자기가 늘 책에서나 읽고 무대에서나 구경하던 그러한 사건들을 몸소 실연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스릴 만점일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나서면서 옆에 있는 희미한 모습의 여자에게 집에 가서 차나 한 잔 들자고 말했다. 바로 그때 훗날 친구들이 깜짝 놀라도록 그냥 집으로 데리고 왔지, 하고 말하는 듯한 자신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뒷부분은 원문과 같이 음미해보자.
It would be thrilling. And she heard herself saying afterwards to the amazement of her friends: "I simply took her home with me," as she stepped forward and said to that dim person beside her: "Come home to tea with me."
멀찍이서 이 장면을 봤다면, 차 한 잔 값을 구걸하는 불쌍한 여인에게 부유한 젊은 부인이 뜻밖의 적선을 베푸는 것으로 볼 만한 대목이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차를 마셔요! 마치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에게 ‘환대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하지만 로즈머리의 시점에서 기술되는 이 장면의 핵심은 그러한 윤리와 무관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Come home to tea with me"가 아니라 "I simply took her home with me"이다.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집으로 데리고 왔지 뭐.”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놀래게 만들 자신의 모습에 도취돼 있을 따름이다.
즉 이것은 ‘인정미담’이 아니라 ‘모험담’이다. 이 장면에서 그녀에겐 아무런 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 옆에는 단지 ‘희미한 사람’(dim person)이 서 있을 뿐이다(‘희미한 모습의 여자’만큼의 구체성도 갖고 있지 않다). 로즈머리 자신이 연극의 한 장면처럼 연기하고 있지만, 이 장면을 카메라로 옮긴다면 ‘희미한 사람’은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희미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순서상 “그냥 집으로 데리고 왔지 뭐.”라고 말하는 자신을 떠올리면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차를 마셔요”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옮기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자기 차를 같이 타고 가서 차를 마시자는 로즈머리의 뜻밖의 제안에 대해서 여자가 못 미더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심지어 로즈머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사모님, 사모님은 저를 경찰서에 데려가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물어볼 정도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법이다. 결국 로즈머리는 낯선 여인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빌로드 손잡이를 손으로 잡으면서 그녀는 일종의 승리감을 느꼈다. 사로잡다시피 한 조그마한 포로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싶었다. ‘이제야 당신을 붙들었군요.’” 물론 친절한 의도에서 하는 말이었고, 그녀는 많은 걸 입증해주려고 했다. 세상을 살다보면 놀라운 일도 가끔씩 일어나는 법이고, 부자들도 인정은 있으며, 여자들은 모두 자매지간이라는 사실 등등. 로즈머리는 그녀 쪽으로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겁먹지 말아요. 도대체 나하고 같이 가는 게 어때서 그래요? 우리는 여자들이에요. 내가 좀더 잘 산다면 당신도 당연히 기대는 해야…….”
그러나 바로 그때, 이 말을 끝맺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다행히 차가 멎었다.
로즈머리는 “우리는 여자들이에요.”(We're both women)라면서 ‘연대감’을 표시하지만, 그것은 기만적인 감정이다. 이 장면에서도 그녀는 그렇게 ‘관대하게’ 말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도취돼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는 같은 여자’라는 전제에 의해 도출되는 결론을 그녀가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곧이어 나오지만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 방에서 벽장을 다 열어젖히고 상자란 상자를 모조리 끌러 보여주고 있는 부잣집의 어린 소녀와 같았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부잣집 여성으로서 낯선 타인에게 예기치 않은 환대를 베푸는 역을 ‘연기’하고 있는 로즈머리는 ‘손님’을 이제 자신의 침실로까지 안내한다. 그리고 벽난로 앞에 의자에 앉으라고까지 권한다. 과연 이 ‘어린 소녀’ 로즈머리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녀와 ‘손님’은 차 한 잔을 같이 마실 수 있을까?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한숨 돌린 후에 마저 하기로 한다. ‘차 한 잔’ 마시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군...
10. 0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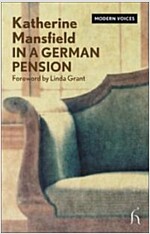


P.S. 맨스필드는 생전에 세 권의 단편집을 발표했는데, <독일 하숙집에서>(1911), <행복>(1920), <가든파티>(1922)가 그것이다. <행복>과 <가든파티>는 표제작이고 타이틀엔 'and Other Stories'라는 말이 붙어 있다. 그녀가 1923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 나온 것이 <비둘기집>(1923)인데, <차 한 잔>은 바로 이 유고 작품집에 실려 있다. 그런 때문인지 국내에 번역된 작품집엔 대개 빠져 있다. 범우사판과 시사영어사판(대역본)이 내가 구할 수 있는 판본이었다. 다양한 번역으로 소개돼 있지 않아 아쉽다. 30여 편이면 전집 분량인데, 아직 작품전집이 소개되지 않은 것도 아쉽고.



거기에 덧붙여 유감스러운 것은 맨스필드에 관한 전기가 한 편도 소개되지 않은 점이다. 물론 지명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같이 교우했던 버지니아 울프나 D. H. 로렌스와 비교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영어권에는 4-5종의 전기가 나와 있는 듯싶다. 맨스필드와 버지니아 울프를 비교한 연구서 등 몇 권도 개인적으론 관심이 가지만, 이 또한 한정이 없어서 <차 한 잔>을 음미한 후에 나는 일단 맨스필드를 떠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