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시스 베이컨의 작업실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책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나름 지저분한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으면 '독서가'로선 소원을 성취한 게 아닌가 하지만, 사정이 또 그렇지만은 않다. 이유선 교수의 표현을 빌면, 이런 게 '아이러니스트의 사적인 진리'인지도 모른다. 매일 책을 읽으면서도 책을 좀 읽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것. "네가 곁에 있어서 나는 네가 그립다"라는 시구절이 있었던가. 고백의 사연은 이렇다.



"나는 거의 일년내내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책을 읽으면서 살았으면 하는 꿈을 꾸면서 산다. 아마도 나는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이 내가 진정으로 읽고 싶은 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책을 읽는 대부분의 상황이 내가 꿈꾸었던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겠다. 내가 읽는 책들은 강의를 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거나, 거의 아무도 읽지 않을 논문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는 책들이다. 그리고 늘 시간에 쫓겨서 읽는다."(<아이러니스트의 사적인 진리>, 16-17쪽)
새로 나온 <역사가들>(역사비평사, 2010)에서 러시아사가 쉴라 피츠패트릭 편을 들추다가 떠올린 대목이다. 스탈린시대의 일상사 연구로 유명한 피츠패트릭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고 여러 권의 책을 구해놓았지만 정작 읽을 시간이 없는 게 또 현실이다. 찾아보니 국내엔 <러시아혁명>(대왕사, 1990)이 소개된 바 있다. 책은 기억이 나는데, 얇은 책이어서 완역본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원서는 현재 3판까지 나와 있다. 간단한 설명은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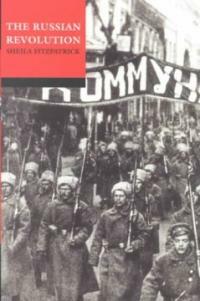
1980년대 초에 피츠패트릭은 볼셰비키혁명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저서 <러시아혁명>을 출간했다. 그녀는 다양한 관점으로 혁명을 두루 관찰하고 1917년 사건의 전체 조건과 함께 볼셰비키 집권 이후의 사회변화를 묘사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중국의 문화혁명에 견줄 만한 소련의 인텔리겐치아 탄압을 스탈린이 아닌 평범한 공산당원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해 학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스탈린 노선이 사회적 기반에 기초해 있었으며, 이러한 인민의 급진주의가 1930년대 정권과 사회가 부분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주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근거는 스탈린시대 일상에 대한 면밀한 연구이다. <스탈린의 농민들>, <일상의 스탈린주의> 등이 그녀의 대표적 저작이다. 말하자면, 연구의 초점이 '아래로부터의 사회사'에 두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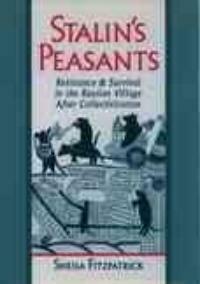

<일상의 스탈린주의>에 대해 한 서평자는 이렇게 말했다. "피츠패트릭은 독자들에게 스탈린이라는 군주의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서커스 속에서 사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러시아사 연구에서 이러한 입장은 '수정주의'라 불리는데, 쟁점은 이런 것이다.
보수주의 학파는 소비에트 사회의출현을 '역사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역사의 일탈'로 간주했지만, 피츠패트릭을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보수주의 학파가 사용한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비학술적인 용어로 공포했다. 수정주의자들은 스탈린과 그의 정치국을 사악한 존재로 보면서도, 소비에트 정치 엘리트들에 대해서는 "다른 평범한 정부에 존재하는" 상층부와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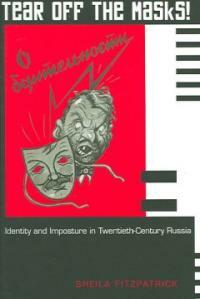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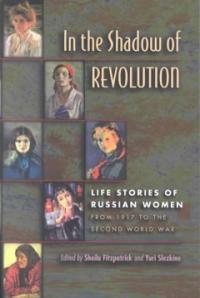
20세기 러시아문학을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당시의 일상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요긴하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러시아사가 중 한 사람이 피츠패트릭이지만, 요는 아직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 현재 읽는 책들을 그렇다고 '억지로' 읽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다. 멀리 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피츠패트릭의 러시아사 연구에 대한 소개를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다시금 떠올라 몇 자 적었다.

참고로, 피츠패트릭은 1941년 호주 태생으로 주로 시카고대학에서 소련사를 강의했다...
10.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