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21에 실은 서평기사를 옮겨놓는다. <이단의 경제학>(시대의창, 2010)을 다루고 있는데, 책은 내가 아니라 편집부에서 고른 것이다. 마땅한 인문사회과학서가 드물게 나오고 있어서 선정에 애를 먹었다. 그런 이유에다 개인적인 피로감이 겹쳐서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한겨레21의 서평은 쉴 예정이다. 재충전을 위해서 다른 일들도 줄여갈 예정이다. 충전이 되긴 되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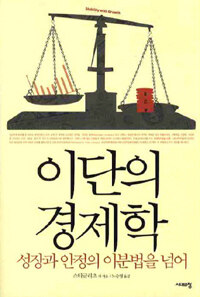

한겨레21(10. 06. 14) 개도국 경제에 이단을 허하라
<이단의 경제학>(시대의창 펴냄)은 저자가 ‘스티글리츠 외’로 표기돼 있지만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를 앞세우고 있지만 공저자 5명은 모두 '정책대화구상'(IPD: Initiative for Policy Dialogue) 회원들이다. IPD는 ‘워싱턴 합의’에 반대해 2000년대 중반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한 단체로 경제학자, 정치학자, 정책입안자,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라고 한다. 이들이 반대하는 ‘워싱턴 합의’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20년 넘게 전 세계에 강요해온 정책을 말한다. 주로 낮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민영화, 자유화를 강조하며 다른 견해들을 배제한 채 그동안 ‘주류경제학’으로 행세해왔다.
선진국의 '완전고용'과 개도국의 '경제성장'
<이단의 경제학>은 이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려 한다. 비판의 빌미는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침체다. 워싱턴 합의가 위세를 떨치던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20세기 들어 최악을 기록했고 세계화와 워싱턴 합의에 대한 환멸을 키웠다. 대안적 이론과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건 당연한데, IPD의 초점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학과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두어진다.
선진국 위주로 발전해온 거시경제학의 주된 관심사는 인플레이션 억제, 완전고용, 경제활동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써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이론상으로도 견해차가 적지 않다. 경제안정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에 대해서 보수파(신고전파), 케인스학파, 비정통파의 입장이 각기 다른 것이다. 하지만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은 개발도상국에 ‘워싱턴 합의’에 따른 정책만을 강요했고, 이것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일이 잦았다. 경제정책의 목표와 상충관계 등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어떤 차이인가?
선진국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안정을 동반하는 완전고용’에 맞추지만 개발도상국의 초점은 경제성장이다. 선진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많은 비중을 둔 정책을 쓰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관계가 불확실하다. 사실 산업구조가 다르고 투자환경이 다르며 성장 동력에도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의 국가에 동일한 정책적 처방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선진국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줄면 학급 당 학생 수가 조금 많아지고 교직원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는 정도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예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 수가 늘어나게 된다. 정책 효과가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다.
물론 경제법칙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재화의 희소성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며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는 법칙들 말이다. 덧붙여, 가장 보편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목표가 ‘장기적인 사회적 후생을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에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정책 또한 달라져야 하니까.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의 선택이 순전히 경제학자나 경제 관료들만의 몫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경제학자들은 가장 좋은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고백을 유의미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은 '정치과정'의 일부
따라서 경제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과정’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포함하여 IPD가 지향점이 대안적 견해를 설계하고 거시경제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 틀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안적 정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일은 경제학자들의 책무겠지만,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그 선택은 정치적 선택이다. 그러니 ‘성장과 안정의 이분법’을 넘기 위해서도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다.
10.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