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의 여성을 위하여
제3의 여성을 위하여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종로에 있는 서점에 들렀다가 손에 든 책 중의 하나는 질 리포베츠키의 ㅣ<행복의 역설>(알마, 2009)이다. 저자는 <패션의 제국>(문예출판사, 1999), <사치의 문화>(문예출판사, 2004), <제3의 여성>(아고라, 2007) 등이 소개된 바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저작들로 보자면 사회학자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다. 좀 비싼 책이지만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에 대한 강의준비에 도움이 될까 하여 출혈을 감수했다. 책의 키워드가 '과소비사회'이기에 '소비사회'와 짝을 이룰 수 있겠다는 나름의 계산(계산이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 그래도 이 책에 주목한 리뷰기사가 없지 않아 챙겨놓는다. 아래 스틸사진(영화 <쇼퍼홀릭>)은 한국경제에서 가져왔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1768261).

서울신문(09. 12. 19) 그리스 神 이미지로 현대사회 5가지 모델 제시
최근 간행된 ‘행복의 역설’(질 리포베츠키 지음, 정미애 옮김·알마 펴냄)에 따르면 인류의 소비 문명은 3단계를 거치며 변화했다. 1880년대 소수의 부르주아 계층만 소비의 주체가 된 1단계, 1950년대 이후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거의 모든 계층이 30년에 걸쳐 풍요를 누린 2단계,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 과잉물질주의가 이끈 ‘과소비 사회’가 3단계다. 저자가 본 ‘과소비 사회 이후’는 결코 밝지 않다. “과소비사회를 대체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발달할 것이라는 게 가장 그럴 듯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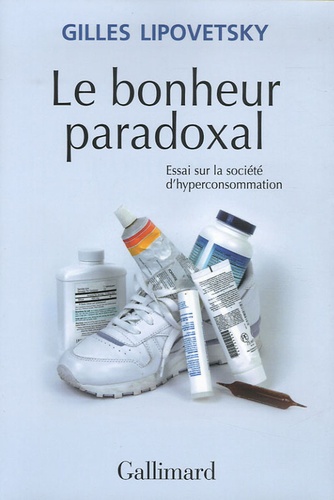
저자는 책을 통해 “현대사회의 삶은 행복과 기쁨의 기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처럼 보인다.”며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일부 모델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 신들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첫째는 페니아(빈곤의 여신). 물질 과잉은 소비자를 끊임없이 결핍의 상태로 몰아가고 주기적으로 불만족스럽게 만들어 평온함과 기쁨을 앗아간다. 기쁨을 맛볼 기회가 많을수록 소비자는 더욱 만족의 상태에서 멀어진다. 이것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 페니아의 강박증이다.
둘째는 디오니소스(술의 신). 전통문화에서 인간은 디오니소스를 숭배함으로써 개인주의에서 해방될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과소비사회는 공동체의 쾌락 대신 개인적인 기쁨으로 대체됐다.
셋째는 슈퍼맨. 현대사회에서는 경쟁력과 유능함, 적극성 등이 최고의 가치로 대접받는다. 개인마다 잠재력을 최대한 격발시켜 자기 초월을 시도한다. 그래서 현대사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늘 ‘슈퍼맨’ 현판이 붙어 있다.
넷째는 네메시스(율법의 여신).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가 사람들에게 증오심과 질투심, 경쟁심리를 부추겼다. 네메시스는 인간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와 행복을 누리는 것을 벌한다.
다섯째는 호모 펠릭스(행복한 인간). 20세기 인류는 위대한 진보를 거듭했지만 지구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한다고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현대의 ‘행복한 인간’ 숭배가 더 큰 재앙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저자는 이처럼 다섯 가지 모델을 들어 과소비사회의 종말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다. 저자는 “온전한 만족감 대신 상품의 욕구만을 따른다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은 없다.”고 단언한다.
책장을 덮고 나면 이런 생각도 든다.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11억명에 이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올해 통계에 따르면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가 10억 2000만명이다. 전쟁보다 기아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행복의 역설’은 이런 곳에서도 유효할까. 저자가 태어나 살고 있는 곳은 프랑스다.(손원천기자)
09. 12. 19.



P.S. <행복의 역설>과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은 <소비의 사회> 외에 물론 리포베츠키 자신의 전작들이다. <사치의 문화>와 <패션의 제국>을 자연스레 손에 꼽을 수 있겠다.



같은 프랑스 저작으로 떠올릴 수 있는 책은 파스칼 브뤼크네르의 <영원한 황홀>(동문선, 2001)과 장 클로드 기유보의 <쾌락의 횡포>(동문선, 2001)이다. 혹시나 싶어 '찾아보기'를 찾아보니 '브뤼크너'의 <영원한 황홀>은 312, 239, 382쪽 등에서 언급된다. 그리고 기유보의 <쾌락의 횡포>는 <쾌락의 폭군>이란 제목으로 330, 332쪽에서 언급되는 걸로 돼 있다(하지만 332쪽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역시나 가장 많이 참조된 책은 <소비의 사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