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의 신작 소설이 나온 김에 그의 최근 칼럼도 읽어본다. 핀란드식 명품교육에 관한 책들이 요즘 유행인데, <영국의 독서교육>(대교출판, 2009)을 주제로 한 책도 나와 있다는 건 칼럼을 보고 알았다. 영국 경제의 토대인 '창의산업'의 기반이 독서교육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인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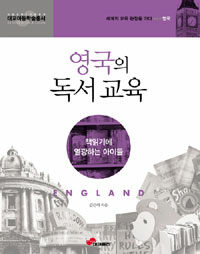
한겨레(09. 10. 31) ‘양파 총리’보다 아이들에게 한마디
원래 이번 글감은 양반론(兩班論)을 통해, 까고 또 까도 의혹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인간 양파’ 정운찬 총리를 까는 거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내게 하신 ‘남자는 나이 서른이 되기 전에 철들지 못하면, 영영 철들지 못한다’는 말을 용케 떠올리고, 벼르던 글감을 포기했다. 총리가 이따위 글을 읽지도 않겠지만, 어머니의 지론에 따르자면, 읽어봤자 별무소용이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은하의 <영국의 독서교육>(대교출판, 2009)을 대신 읽는다.
영국은 전체 고용인구의 80%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한다. 음악·서적·영화처럼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산업이나 스포츠·관광 등의 산업을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하는데, 빈약한 제조업과 천연자원을 가진 영국으로 하여금 세계 5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게 해주는 일등공신이 바로 창의산업이다.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로 벌어들인 수출 총액 231조원은, 같은 기간 조앤 캐슬린 롤링이 <해리 포터> 시리즈와 파생상품으로 벌어들인 308조원보다 적다.
6년 넘게 영국의 교육현장을 일선에서 체험했던 저자는 영국 어린이들이 어떤 독서 환경에서, 어떤 독서 교육을 받는지를 세밀히 보여준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출판·방송·디자인·예술·관광·광고 등 영국의 창의산업 중심에는 책”이 있으며, 창의적인 인력을 키우기 위한 “영국 교육의 키워드” 역시 책이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라’라는 강요만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의 독서는 성인의 독서나 똑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독후감을 쓰는 행위에 국한된다. 하지만 영국은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여행, 작가와의 만남은 물론이고 그저 도서관에서 놀게 하는 것만으로 어린이들을 제한적인 ‘독서 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독서 경험’과 접속시킨다.
지은이에 따르면, 이렇듯 한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선비들처럼 독서란 혼자 읽는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출판사·서점·도서관들이 개별적인 독서운동이 아닌 “유기적인 네트워킹으로 모든 부문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할 것은 어린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옥죄는 국정 교과서를 해체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는 일이다.
흠모하는 중국의 작가 루쉰은 유교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제도’라고 말하면서, 아직 인육을 먹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썼다. 과연 <영국의 독서교육>을 소개하게 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해 불법에 맛 들였던 가망 없는 총리에 대해 한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선택이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면, 다 큰 어른이 아무 대가 없이 용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염치 또한 생길 테니 말이다.(장정일 소설가)
09. 11. 05.

P.S. 그러한 영국식 교육의 이면일 듯싶은 책은 닉 데이비스의 <위기의 학교>(우리교육, 2007)이다. 부제는 '영국의 교육은 왜 실패했는가'이고 원제는 그냥 건조하게 '학교 보고서(The school report)'. '위기의 학교' 속에서도 '책읽기에 열광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일까? 두 가지 보고서가 어떻게 양립가능한지 궁금하다. 누가 같이 읽고 리포트를 써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