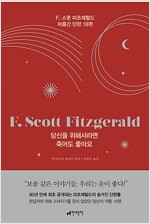제목만 보고는 페터 한트케를 떠올렸지만, 아니었다. 무리카미 하루키가 엮은 피츠제럴드의 후기 단편과 에세이 모음이다. 놀라운 건 현재 문학분야의 베스트셀라는 것. 하루키의 파워도 대단하고(사실 피츠제럴드 작품집은 부지기수다) 출판사의 기획력도 놀랍다. 여하튼 읽히는 책이 있다는 건 나쁘지 않다. 그게 시작이라면 어떤 시작이건 축하할 일이다. 독서의 시작.
안 그래도 민음사 쏜살문고로 피츠제럴드의 작품들이 다시 나왔다. 품종 다각화라고 해야겠다. 리커버판의 유행이 주춤하면서 요즘은 이런 방식의 재상품화가 시도되는 듯싶다. 세계문학전집 독자가 있다면 문고본의 독자도 있는 거니까. 독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추는 것이다.
피츠제럴드의 단편은 두어번 강의에서 다뤘지만(‘플래퍼 ‘의 문학적 저작권은 그의 몫이다) 나는 아직 감동하거나 경탄해보진 못했다(헤밍웨이나 포크너와는 다르게). 미처 알아보지 못한 진가를 하루키가 발견하게 해줄지 모르겠다(물론 세 작가의 인생스토리 가운데 가장 애잔한 건 피츠제럴드다). 그런데 사실 피츠제럴드의 후기작이라면 ‘오후‘보다는 ‘저녁‘에 가까운 것 아닐까. 해는 저물어가지만 마땅히 돌아갈 집이 없는 사내의 저녁. 선입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