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가장 눈에 띄는(물론 내게 그렇다는) 재간본은 게리 솔 모슨과 캐릴 에머슨의 <바흐친의 산문학>(앨피)이다. 공저자는 모두 미국의 저명한 러시아문학자이면서 바흐친 연구가들이고, 1990년에 나온 원저는 1990년대(바흐친 르네상스 초기) 영어권에서 나온 가장 빼어난 연구서 가운데 하나다(홀퀴스트의 <대화주의>와 함께 기본서에 해당하는 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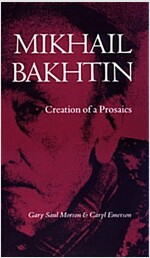
번역본은 2006년에 나왔다가 절판되었는데, 이번에 출판사를 옮겨서 나왔다. 개역판 서문을 보니 새롭게 오역을 바로잡고 읽히지 않는 문장을 손질했다고 하니, 흠, 다시 구입해야 하나 망설이게 된다(안 그래도 도스토예프스키 전작 읽기 강의를 하면서 서가에서 다시 빼놓은 책들 가운데 하나였다). 오래 전에 한 대학원 강의에서도 몇 개 장들을 읽은 기억이 있고, 일부 번역에 불만을 갖기도 했는데, 다시 확인해봐야겠다.
책의 의의는 이중적이다. 일단은 바흐친 연구서로서, 바흐친 문학론의 기본 사항들과 함께 그 의의를 짚어준다. 그리고 두번째는 번역본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산문학'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사실 '산문학'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바흐친의 개념이 아니다. '산문학의 창조'라는 건 따라서 바흐친과 함께 두 공저자가 공을 나눠갖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산문학(영어로는 Prosaics)는 두 저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널리 쓰이는 개념이 아니다. 나로선 특이하게 여겨지는 일이다.
산문학은 무엇보다도 시학(Poetics)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시학'은 비록 비극 장르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개념이다. 반면 산문학은 그 대상이 되는 산문의 출현이 더 늦고, 대표 산문장르라고 할 소설(근대소설)은 근대 이행기 혹은 17세기에나 와서야(<돈키호테>), 혹은 18세기부터야(영국의 경우) 핵심 장르로 부상하기에 그 이론적 정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우리말로도 '산문학'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그렇지만, 시와 소설이 문학장르를 양분한다면, 그와 같은 이치로 시학과 산문학은 문학이론을 양분하게 된다. 두 저자(특히 게리 솔 모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산문학'이 널리 쓰이지도, 이해되지도 않은 상황이 그래서 특이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문학이론서를 많이 읽고, 그에 대한 강의도 해온 터이지만, 특별히 나만의 문학이론서를 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산문학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부진한 수용이 계속된다면, 따로 해야 할 몫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문학이론의 시학 편중성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따져보면 산문 내지 산문소설을 이론적으로 해부하면서 '시학'이라는 용어와 방법론을 갖다쓰는 것은 뭔가 특이하지 않은지. 그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책이 내게는 <바흐친의 산문학>이었다. 책을 한번 읽은 이상, 예전처럼 시학이란 용어를 남용해서 쓸 수는 없다. (근대)소설이라는 새 술에는 산문학이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