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인생의 시간은 한정돼 있다. 오십대가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자꾸 재보게 된다. 읽어야 할 책과 써야 할 책,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에 대해. 톨스토이의 우화를 떠올리자면,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교훈을 되새겨보게 된다. 하룻동안 걸어다닌 땅을 다 소유지로 삼을 수 있지만, 단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너무 욕심을 부릴 수 없기에 적당한 시점에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어디까지 읽어야 할까, 매번 고심하게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읽어야 한는 작품들이 있다. 필독서이고 고전이고 그렇다. 괴테의 <파우스트>나 (아직 읽지 않았지만)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 같은 작품들도 당연히 거기에 속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작품들이지만 다만 분량 때문에 또 쉽게 목록에 넣지는 못한다. 두 작품에 대해 참고할 만한 책들이 나와서 페이퍼를 적는다. 먼저 <파우스트>에 대해서는 독문학자 안진태 교수의 연구서 <불멸의 파우스트>(열린책들)가 나왔다. 괴테와 <파우스트>에 관한 어지간한 책들은 모두 갖고 있는데, 이번 책은 적어도 분량으로는 압도적이다(1000쪽이다). 이런 '무모한' 분량의 책은 국내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성싶다. <파우스트> 번역본도 대부분 갖고 있지만 아직 읽어보지 못한 번역본 가운데, 전영애 교수(전집판) 번역본과 함께 기회가 닿으면 일독해봐야겠다.



안진태 교수는 독자적으로 독문학과 주요 작가들에 대한 연구서를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괴테와 파우스트에 관한 책도 이미 몇 권 들어 있다. <괴테 문학 강의>와 <파우스트의 여성적 본질> 같은 책을 나는 갖고 있다. <불별의 파우스트>가 최종 종합판이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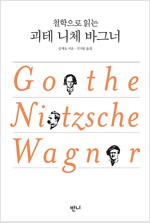


이 참에 다시 생각난 것은 승계호 교수의 <철학으로 읽는 괴테 니체 바그너>(반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를 독해하고 있는 책. 마지막 바그너의 작품은 방대하기도 하고 오페라에 문외한이어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번역본을 구입했다(삶과꿈에서 나온 것으로. 풍월당판은 보류중이다). 이 세 작품이 중요한 것은, 혹은 특이한 것은 프랑스문학의 잘 보여주는 근대소설의 길과는 다른 길을 제시해서다. <파우스트>부터가 '소설'이 아니라 (특이한 종류의) '비극'이다.
근대 이행기와 근대의 문학적 장르로서 서사시와 비극, 그리고 소설의 의의를 해명하는 것이 문학사적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그에 대한 생각의 가닥을 갖고 있어서 적당한 분량으로 정리해볼 계획이다. 프랑코 모레티의 책들이 참고가 되지만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책을 쓰려는 것. 모레티는 '교양소설'을 표준으로 삼았지만, 독일산 교양소설 대신에 프랑스산 사회소설을 근대소설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강의에서도 자주 언급한다). 곧 발자크-플로베르-졸라의 프랑스소설사와 대비되는 것이 괴테-바그너-니체의 독일문학이고 독일사상이다. 이 대비는 프랑스사회사와 독일사회사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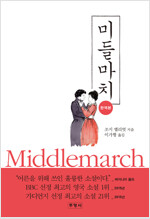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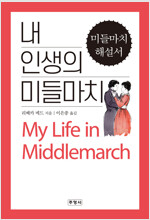
국내에서는 디킨스나 하디만큼 읽히지 않지만, 조지 엘리엇은 19세기 영문학 최대 작가(라고들 한다). 그녀의 최대작이 <미들마치>(주영사)라는 건 번역본이 다시 나왔을 때 한 차례 언급했는데, '미들마치 해설서'가 이번에 나왔다. 리베카 메드의 <내 인생의 미들마치>(주영사)다. "저명한 영국소설 <미들마치>를 읽고 자란 저자가 중년의 나이에 다시 읽으면서 그 소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미들마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다만, 1416쪽짜리 <미들마치>를 어떻게 분권해줄 수는 없는지. 두께와 무게 때문에(거기에 가격도 물론) 강의에서 다룰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