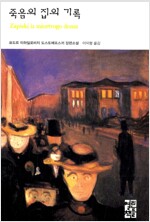앞서 ‘정희진의 글쓰기‘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인데 시간적 간격도 있어서 별도로 적는다. 김영하의 <보다>(문학동네)에 대해 적은 설명이 생각의 꼬투리이자 시빗거리다. 저자가 인용한 건 김영하가 영화 <그래비티>를 보고서 우울증에 대해 적은 대목이다. 줄여서 인용하면 이렇다.
˝우울증 환자들은 인간이 혼자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운명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직시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현실적이다. ‘혼자 죽는‘ 고통을 미리 맛보고 있는 그들에게 삶이 이미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다.˝
나로선 우울증에 관한 책들을 더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인데, 과연 ˝혼자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직시한 자˝들로 우울증 환자들을 정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절판돼 유감인 책 가운데 하나는 로버트 버턴의 <우울증의 해부>인데(완역본은 아니었다), 기억에 버턴은 우울증의 사회적 조건을 지목하고 있어서 시사적이다. 그 첫번째 조건은 고학력. ‘식자우환‘의 전형적 사례인데, 평균보다 많이 아는 자가 우울증을 앓기 쉽다. 두번째 조건은 사회적인 역할이 할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남보다 우월한 앎(인식)이 사회적 쓸모와 결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서가 우울증이다(19세기 러시아희곡의 제목을 빌리면 ‘지혜의 슬픔‘, 곧 잉여적인 앎이 빚어낸 슬픔이 곧 우울증이다).
단순하게 인간이 혼자라는 사실, 혼자 죽는다는 사실에서 우울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자연적 사실일 뿐이고 삶에 대한 성찰과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그런 주제의 철학서나 문학책을 씀으로써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파스칼의 <팡세> 이후의 허다한 책들). 문제는 그러한 인식을 나누지 못할 때다. 체호프의 단편 ‘우수‘가 여기서는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아들을 잃은 가난한 마부 이오나의 이야기인데, 그에게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고통은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혼자 죽는‘ 고통이라는 건 특별히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김영하의 ‘극단적 현실‘론이나 그에 대한 정희진의 맞장구(‘이 정확성!‘)에 나로선 공감하기 어렵다. 정희진은 이렇게 보충한다.
˝‘극단적 현실‘의 당사자도 쓰기 어렵다.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현실적‘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언은 ‘현실‘을 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태인 몇몇 인간만의 특권이다. ‘극단적 현실‘, 즉 현실에서는 도스토옙스키라도 쓰지 못한다.˝
나로선 증상으로밖에 읽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다시 읽어보자.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언제나 현실적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현실에 대한 발언은 현실적인 상태의 몇몇 인간에게만 가능하다, 극단적 현실로서의 현실에 대해선 도스토옙스키도 쓰지 못한다? 나는 누가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려나 도스토옙스키조차도 들지 못하는 ‘몇몇 인간‘에 누가 들어가는지 저자에게 묻고 싶다. 그에 이어지는 문장이 힌트가 될까?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리모 레비 같은 이도 있지만, 그는 인간이 어디까지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기대받았고, 결국 자살했다.˝
나는 저자가 도스토옙스키를 읽지 않았고 프리모 레비도 대충 읽었을 거라고 추정하게 된다. 총살 5분 전까지 경험했던 사형수 도스토옙스키는 8년이 넘는 시베리아 유형생활을 경험했고 이를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소설을 통해 사실적으로 그렸다.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이유로 호출되어(도스토옙스키라도!) 의문의 1패를 당해야 하는지 나로선 알기 어렵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생존작가로 프리모 레비가 자살하기 전까지 평생에 걸쳐서 증언한 것이 ‘인간이 어디까지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였던가? ‘결국 자살‘? 저자는 그의 자살을 그의 패배로 해석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아주 나이브한 해석이다. 레비가 경험한 수용소의 경험은 모든 인간성이 박탈되어 자살조차도 불가능했던 현실이었다. 똑같은 홀로코스트 생존작가로 자살한 장 아메리의 책제목을 빌리자면 두 사람의 자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한 ‘자유죽음‘의 뜻을 갖는다.
저자의 한탄에 따르면 삼사십대에 우울증과 자살연구에 매달렸는데 ˝이룬 것은 없고, 있던 것마저 다 잃˝어서 ˝우울증과 죽음을 해명하지 않으면 다음 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각자에게는 자신의 고통과 고독이 절대적일 수 있다. 그건 주관적 진실이다.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그걸 객관적인 것으로 과장하면서 애꿎게도 도스토옙스키나 프리모 레비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라도 쓰지 못한다˝라거나(저자가 얼마나 읽었는지 궁금하다) ˝프리모 레비 같은 이도 결국 자살했다˝ 같은 문장은 나로선 쓸 수 없는 문장이다. 사실 상상력이 빈약한 탓에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 나는 저자의 진의가 도스토옙스키나 프리모 레비를 폄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서 한 독자로서 불편했다는 것이다. 저자의 어떤 글들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이고 그렇게 읽어야겠다는 것. 오랜만에 정희진의 책을 읽고서 정리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