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의 '이현우의 언어의 경계에서' 꼭지를 옮겨놓는다. 존 밴빌의 <바다>를 여름을 보내는 마지막 책으로 골랐다. 노동계급 출신의 스타일리스트이자 모더니스트라는 작가의 평판을 확인하게 해주는 소설이다. 그의 소설들이 더 번역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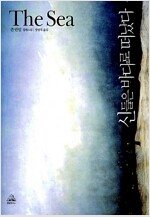
한겨레(19. 08. 30) ‘나를 버리고 그들처럼’ 되려 한 남자의 삶
여름의 끝자락에 읽어볼 만한 책으로 아일랜드 작가 존 밴빌의 <바다>를 골랐다. 작가에게는 2005년 맨부커상을 안겨준 작품이고 나로서는 이번 여름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소설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 정비소 직원의 아들로서 ‘노동계급 출신의 모더니스트’로 분류되는 밴빌의 문학세계가 어떤 것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아일랜드 최고 작가라지만 국내에는 <닥터 코페르니쿠스>와 <바다>, 단 두 작품만 번역되어 있어서 ‘밴빌의 문학세계’라는 말은 의미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약력을 참고해서 말하자면 그는 제임스 조이스와 사뮈엘 베케트 문학의 전통을 계승한다. 열두 살 때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읽고서 처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작가의 이력에 더하여 “실생활을 써나가는” 조이스의 방식을 계승한다는 뜻도 포함하기에 그렇다. 다만 밴빌은 조이스와 마찬가지로 실생활을 전지적 시점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 시점으로 그린다. 주인공 화자의 말을 다 신뢰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손가락(스타일이라는 형식)이 가리키는 달(내용)만 보면 되지만, 모더니즘 소설에서는 손가락에도 주목해야 한다.
<바다>의 주인공이자 화자 맥스 모든은 프랑스 화가 피에르 보나르에 대한 책을 쓰는 딜레탕트다. 그는 아내 애나가 암으로 죽자 오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바닷가를 찾는다. 그곳에는 시더스라는 여름별장이 있었고 그는 열 살, 열한 살 무렵 별장 소유주인 그레이스 가족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이 인연은 가장 밑바닥 계층의 아이가 상류층 가족과 맺은 것이어서 특별하고 예외적이다. 맥스는 그가 속했던 ‘여름 세계의 사회구조’를 이렇게 설명한다. “휴가용 별장을 소유한 소수의 가족이 맨 꼭대기였고, 그다음이 호텔에 묵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다음이 집을 세내는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이 우리였다.”
‘우리’는 맥스네 가족으로 똑같이 휴가차 바닷가를 찾지만 이들의 숙소는 샬레라는 목조주택이었다. 실생활은 분명한 위계와 경계로 구성된다. “제대로 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샬레 출신들과 섞이지 않았고, 우리도 그들과 섞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맥스의 아버지는 노동자로 말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머니는 좌절과 불만을 삭였다. 부모의 불행이 어린 시절 맥스의 그늘이었다. 맥스는 부모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수치스러워했다. 그런 맥스에게 상류층 그레이스 가족은 신들로 여겨졌다. 그는 같이 놀던 친구들을 떠나 그레이스 가족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이 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했다. 그레이스 부인을 여신으로 숭배하던 맥스는 또래의 딸 클로이와 사랑에 빠지는데 클로이의 모욕까지도 황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유지한 그의 어머니가 보기에 맥스의 선택은 자신의 출생과 계급에 대한 배신이었다(맥스라는 이름도 그 자신이 새로 지은 것이다). 하지만 “늘 독특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맥스의 소망은 “독특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그레이스 가족과의 인연으로 새로운 열망과 정체성을 갖게 된 맥스는 성장하여 부유한 여성 애나와 결혼함으로써 신분상승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 과정에서 그가 대가로 지불한 것은 자기 존재의 상실이었다. 애나가 죽자 텅 빈 존재가 된 그는 다시 자기 존재의 기원을 찾아 시더스 별장을 찾는다. 밴빌의 매우 우아한 소설에서 맥스의 회상을 따라가다가 독자가 발견하는 것은 자기 계급을 배신하고 부유한 딜레탕트가 된 ‘늙은 사기꾼’의 초상이다.
19.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