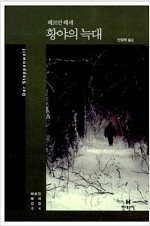한주의 강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막간의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밀린 원고들은 한숨 돌리고 생각해보기로).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마치 ‘강의 기계‘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달력을 보니 이번 봄에는 평일 가운데 단 하루의 휴일이 있을 뿐이다. 하기야 주말과 휴일에도 지방강의가 있는 주는 말 그대로 혹사 모드가 된다(다행히 이번주는 아니다). 이번봄에 새로 강의하는 작품도 적지않아서 무탈하게 여름으로 넘어갈 수 있을는지. 하지만 여름에는 곧바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버티고 있다!
오늘 오전 강의는 헤세의 <황야의 이리>(1927)였는데, 독일문학사에서는 토마스 만의 <마의 산>(1924), 알프레드 되블린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1929)과 함께 1920년대 3대 소설로 꼽히는 작품이다. 헤세 강의에서는 청중에 따라서 <데미안>(1919)을 읽을 때도 있고 <황야의 이리>를 다룰 때도 있는데, 물론 나로선 <황야의 이리>가 더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헤세 문학 전체로 보자면 가장 자전적이면서 가장 예외적인 작품이다.
통상 헤세의 작품세계는 3단계로 구분하는데 데뷔 소설 <페터 카멘친트>(1904)부터 <크눌프>(1915)까지가 1단계라면, 1차세계대전 기간 중에 쓰인 <데미안>부터 <나르치스와 골드문트>(1930)까지가 2단계이다. 그리고 <동방순례>(1932)에서 <유리알 유희>(1943)까지가 3단계. 194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1962년 타계할 때까지는 산문집과 서간집 들을 주로 펴냈고 작품으로서 대작은 <유리알 유희>가 마지막 작품이다. <페터 카멘친트>에서 <유리알 유희>까지 대략 40년에 걸친 여정이다.
이 가운데 <데미안> 이후 2-3단계를 대표하는 작품은 아래 다섯 편이다(기타 작품으로는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요양객><뉘른베르크 여행> 등이 있다).
<데미안>(1919)
<싯다르타>(1922)
<황야의 이리>(1927)
<나르치스와 골드문트>(1930)
<유리알 유희>(1943)
각각을 개별 작품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나는 이 다섯 편의 주요작이 나름대로 헤세문학의 경로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순서와 이행의 과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황야의 이리>는 일종의 수렁에 해당한다. 헤세 자신이 50세를 앞두고 경험한 여러 실존적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에 그렇다(가장 현실에 밀착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황야의 이리>를 사이에 두고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한 <싯다르타>와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마주하고 있는데 두 작품 모두 두 명의 친구를 등장시키고 이들간의 균형과 비대칭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법상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면들이 통상 헤세적인 특징으로 식별된다. 반면에 시민적 세계와 주인공 하리 할리(‘황야의 이리‘로 불린다) 사이의 대립을 다루고 있는 <황야의 이리>에서는 그런 균형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가장 자전적인 소설임에도 ‘헤세답지 않은‘ 예외적인 소설이다. 즉 <황야의 이리>에서 만나는 헤세는 여느 작품에서와는 뭔가 다른 헤세다. 따라서 <황야의 이리>를 읽지 않고도 우리가 헤세를 읽었다고 말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황야의 이리>를 읽지 않는다면 또다른 헤세, 나로선 더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헤세와 만나지 못한다.
<데미안> 출간 100주년이라고 해서 기념 리커버북도 나오고 이런저런 행사도 기획된 걸로 아는데, 내게 <데미안>의 헤세보다 더 중요한 헤세는 <황야의 이리>의 헤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