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중에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그래픽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전시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됐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기회가 닿았다(따지고 보면 어려운 걸음도 아니지만). 지나간 기사들을 훑어보다가 그 중 하나를 옮겨놓는다. 전시에 관한 안내는 미술관의 홈피(http://www.snumoa.org/Exhibition/view.asp?sType=c)를 참조할 수 있다.
.jpg)
경향신문(06. 12. 04) 언제봐도 새로운 도발 ‘앤디 워홀’
“돈을 버는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다.” “나는 기계가 되고 싶다.”
오늘날 순수미술에 대한 도전은 기실 팝아트의 대표작가 앤디 워홀(1928~1987)로부터 시작됐다. 여러 도발적인 선언을 통해 스스로 상업예술가임을 드러내고 미술 역시 상품이라고 당당히 떠들고 다녔던 예술가. 워홀은 자신의 작업실조차도 상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Factory)’이라고 이름붙였다. 조수를 쓰는 일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돈과 명성, 권력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은 현대 작가들에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면서 동시에 모범이다. 또한 요즘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성에 기반한 소재를 그린 작품들은 실은 워홀의 팝아트 작품과 일견 닮아 있다. 정형민 서울대 미술관장은 이러한 요즘 작품들에서 풍기는 ‘네오팝’적인 성향의 연원은 바로 워홀에 있다고 말한다. 정관장은 “일본과 한국 작가들이 요즘 다시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미술작품을 제작하고 있고 중국의 정치적 팝아트 작품 역시 워홀의 스타일로 정치상황을 풍자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다시 앤디 워홀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미술관이 지난 2일 시작해 내년 2월10일까지 여는 ‘앤디워홀 그래픽전’은 초기 상업 광고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시기의 구두작업에서 이제는 워홀의 상징이 된 캠벨 스프캔, 사진 연작, 전기의자 연작, 꽃 연작과 위장 연작 등 그의 전 생애를 망라하는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이 전시는 미국 뉴욕시립대학(CUNY)의 부속기관인 QCC 아트 갤러리와의 교류전으로 미국과 스페인의 개인 소장가의 컬렉션 60여점으로 구성됐다.
그래픽전이라는 제목은 워홀의 작품이 기본적으로 판화기법에 기반하는 데서 따왔다. 워홀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늘 기존의 이미지를 변형하고 가공했다. 1960년대 전후 코카콜라 병과 캠벨스프캔, 브릴로 박스 등 일상의 상품 이미지를 평면으로 옮겨온 작품은 워홀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거쳐 몰두한 작업은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제작한 초상작업이다.

워홀은 실크스크린을 이용해 원형을 복제하면서도 여러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이미지의 배치, 인쇄 상태를 달리했다. 언뜻 인쇄상의 실수처럼 보이는 실크스크린 작품들은 기계적인 작업에 손맛을 더하고 순수미술가로서 독창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법이었다. 전시에는 유명인에 대한 워홀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재키’ ‘리즈’ 등이 전시 중이다.

워홀은 1960년대 중반부터 죽음의 이미지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는 ‘전기의자’ 연작, 존 F 케네디를 모델로한 ‘플래쉬’ 연작(이상은 전시 중), ‘자살’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으스스한 분위기가 서려있는 이들 작품은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래서 밝고 경쾌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을 읽어내고 돈을 벌기 위해 제작한 것이 바로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감이 살아있는 ‘꽃’ 연작이다.

관람동선을 따라 돌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작품은 위장을 위한 알록달록한 군복 이미지에서 따온 ‘카모플라지’ 연작이다. 평생 자신의 작품 이면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며 표면만 봐달라고 주문하던 워홀의 마지막 작품이다. 온갖 화려한 색깔로 변형된 ‘카모플라지’는 세상의 관심을 즐기면서도 철저히 자신을 감추려했던 워홀 자신을 반영한 일종의 추상적 자화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윤민용 기자)
06. 1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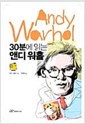





P.S. 워홀에 관한 책들은 가장 최근에 나온 클라우스 호네프의 <앤디 워홀>(마로니에북스, 2006)를 비롯해서 여러 권이 나와 있다. '상식'이 필요하다면, <30분에 읽는 앤디 워홀>(랜덤하우스코리아, 2005)을 손에 들면 되겠고, 한 작품이라도 소장해보고픈 꿈을 키우고 싶다면 <앤디 워홀 손안에 넣기>(마음산책, 2006)를 먼저 손안에 넣으면 됬다. 워홀 이야기들은 미술비평가 김광우의 책 등을 훑어볼 수 있겠다. 나는 (예전에 20분 읽어두었기에) 10분만 더 읽고 전시장에 가볼 예정이다. 특별히 관심이 끄는 건 '전기의자' 시리즈인데, 죽음에 대한 워홀의 강박관념을 드러내준다고 하니까 흥미가 생긴다(게다가 대중으로부터 가장 외면받은 시리즈!). 사실 워홀은 한 채권자의 권총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지 않았나? 농담삼아 말하자면, 전기의자가 그보단 낫다고 생각했을까?..

P.S.2. 전시회를 오늘 관람할 수 있었다. 앞에 적은 마지막 멘트는 수정되어야 하는데, 워홀이 '전기의자' 시리즈를 제작한 건 1967년이고, 그가 피격당한 건 이듬해인 1968년이다. 10점으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의 포트폴리오가 모두 전시돼 있어서 반가웠다. 이 시리즈 외에 눈길을 끈 작품은 '그림자'. 워홀 자신의 초상화를 재료로 한 시리즈이다(전시된 건 아래의 한 작품). '캠벨 수프'보다야 이런 작품이 보다 '전통적'이고 보다 흥미롭다.

0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