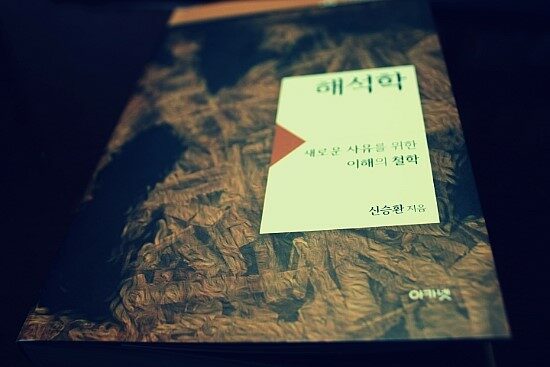
얼마 전 종영한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았다.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정몽주와 정도전의 관계였다. 우리가 흔히 정몽주를 고려의 충신으로, 정도전을 새 왕조를 세운 혁명가로 알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정몽주를 고려라는 무너져 가는 구습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으로, 정도전을 친구의 죽음을 온몸으로 감당하고서라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선구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의 말미에서 정도전은 암살을 당하고, 후에 역사가 정도전을 역적으로 볼 것을 시사한다. 실재로도 조선시대에 정몽주의 제자들인 사림이 등용되면서 정도전은 조선을 세운 인물이지만, 오랜 기간 역적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서는 다시 정도전의 결단과 개혁을 평가하고 있는 책과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역적이고 누가 충신인가? 시대마다 이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현시대에는 정도전의 새로운 개혁이 평가되고 있지만, 후세에는 정몽주처럼 충절이 다시 평가되지 않을까? 결국 역사란 현세대의 해석에 의해 새롭게 쓰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대화로 유명한 EH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저자는 역사가를 마치 시장에서 생선을 사는 사람에 비유한다. 생선을 사는 사람은 자판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생선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생선을 사서,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역사 역시 사람에 의해 수집되고 재편된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가는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조작할 수 있는가? 아니다! 역사가가 역사를 수집하고 재편하는 것은 바로 그 역사가가 속한 현재의 시대의 눈을 통해서이다. 그러기에 과거는 현재에 의해 해석되고, 현재는 과거에 의해 해석됨으로써,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EH 카의 역사이론 역시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 [해석학]이란 책을 읽으며, 특히 가다머에 대한 글을 읽으며, 왜 자꾸 EH 카의 글들이 떠오르는 걸까?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쁜 이야기 일 테지만, 철학자들은 철학을 모든 학문의 근본으로 본다. [철학 이야기]로 유명한 월 듀란트는 철학의 전쟁터의 최전방 학문으로 보았다. 미지의 영역의 개척에 가장 앞장을 서다가 그것이 학문의 영역으로 돌아오면 후방의 개별 학문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다. 현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후설은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대상과 의식의 연결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철학의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으로 삼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졌다. 후설의 제자이자, 후설의 현상학을 이어받아 존재 해석학을 시작한 하이데거는 개별 학문의 대상인 존재자의 기초에 있는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철학은 존재자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학문이었고, 존재자를 연구하지만 존재자의 근원인 존재의 연구는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존재의 해석을 통해 모든 학문의 근거를 철학이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해석은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현존재'라고 불렀다. 그리고 현존재는 항상 시간 속에서 존재하기에 시간을 통해 해석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현존재의 실존적 상황을 '세계-내-존재'로 보았다.

이런 존재에 대한 하이데거의 탐구는 과거의 텍스트를 해석하던 해석학을 존재를 해석하는 존재해석학으로 발전시켰다. 그런데 이 존재는 항상 시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존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밝혀지는 것이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해석학적 지평'이라고 부른다. 마치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듯이 텍스트는 존재라는 터전 위에 떠 있다. 그리고 그 존재라는 터전은 과거와 현재의 흐름 속에 있다. 결국 텍스트나 존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석학]이란 책에서는 해석학적 지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텍스트는 그것이 자리한 문맥 위에 놓인다. 컨텍스트를 떠나 텍스트는 이해되지 않는다. 지평이란 일차적으로 해석학적 작업이 수해되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가리킨다. 나아가 해석학적 지평은 해석학적 순환 구조나 앞선 이해, 이해의 존재론적 터전을 지칭하는 모든 해석학적 터전을 의미한다.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듯이 하나의 텍스트가 자리한 터전이다.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라는 지평을 바라봐야 하듯이 텍스트는 해석학적 지평을 떠나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는다. - [해석학] P125

이런 하이데거의 존재해석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이다. 가다머는 현재의 존재는 과거의 흐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기존의 해석을 선입관으로 부르는 개몽주의사상을 배척하고, 선입관 역시 해석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존재해석학적 영향사', 또는 '영향사의 원리' 등으로 부른다. 결국 현재는 과거에 의해 해석되고, 과거는 또한 현재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다.
가다머의 영향사적 원리는 사실적 역사를 넘어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학적 작용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 작용을 코레트는 '역사 내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곳에서 해석되며 역사적 전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석학은 이해의 과정에서 역사의 현실성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이렇게 요구된 것이 가다머의 영향사에 담긴 의미이기에 그는 영향사를 전승과 역사의 상호영향,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해는 자신의 본질에 따라서 하나의 영향사적 과정으로 규정된다. 현재라는 지평은 과거 없이 형성되지 못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의미지평에 대한 해석의 토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 [해석학] P165
결국 가다머에 의하면 하나의 텍스트는 어떠한 시점에서 완전히 해석되어 결론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해석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텍스트는 언제나 해석학적 차원에서 이해되며, 완결되어 있지 않다. 텍스트는 완결된 대상이 아니라 이해 과정에 놓여 있는 하나의 단계이다. 해석학은 늘 과정에 있다. 그것은 작품이 아니라 작품을 향한 길이며, 완성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해석하는 인간의 존재는 길 위에 있는 존재다. - [해석학] P168-9
이제 다시 앞에 정몽주와 정도전의 사건으로 올라가 보자. 결국 누가 충신이고 누가 역적인지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해석되어질 것이고, 이런 해석은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지금의 현시점의 해석을 절대화해서 그것으로 모든 텍스트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편협함의 위험을 또한 지적하는 것은 아닐까?
끝으로 가다머의 이론을 읽으며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떠올렸지만 실제로 EH 카가 하이데거나 가다머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 했다. 어떤 글에서는 둘의 사상을 대립되는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했다. 결국 가다머와 EH 카의 관계성은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