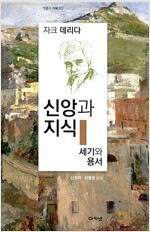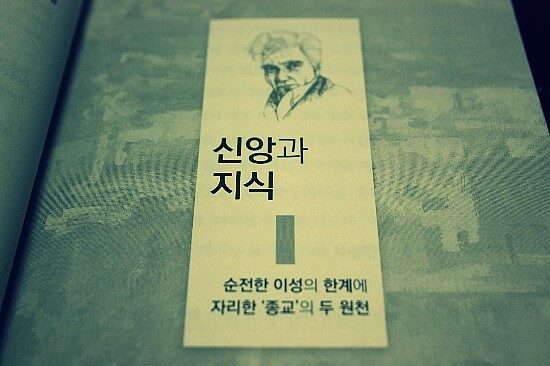
[신앙과 지식]의 시작은 데리다 특유의 아름답지만 조금은 모호한 아포리즘적인 문장으로 시작한다.
어떻게 '종교를 말할 것인가?' 종교에 대해서? 오늘날,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이날 어떻게 두려움이나 떨림없이 그것에 대해 감히 단수로 말할 것인가? 게다가 그토록 적게, 그리고 그토록 빨리? 과연 누가 대담하게 그것이 식별 가능한 동시에 새로운 주제라고 호언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오만하게 거기에다 몇몇 아포리즘을 맞춰 넣을 수 있을까? 이에 필요한 대담함, 오만함 혹은 공평무사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쩌면 잠시 동안 어떤 특정한 추상을 행하는 척해야만 한다. 추상화하는, 모든 것을 추상화하는, 혹은 거의 모든 것을 추상화 하는 추상, 어쩌면 추상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손쉬운 것에, 하지만 동시에 가장 황량한 것에 내기를 걸어야 한다. - [신앙과 지식] 중에서
여기서 데리다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추상'이나 '추상화'라는 단어이다. 한 마디로 추상화 하는 방법으로 종교에 대해서 사유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어렵고 난해한 데리다의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상화 하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는 데리다와 같은 해체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플라톤식 사고에 집착하기에 데리다의 글을 이해하기도 쉽지않고, 그의 언어를 마구 해체하는 손놀림을 따라가기도 버겁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해한 '추상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칸트의 이성 안에서의 사유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앞에서 데리다는 종교에 대한 헤겔의 사변적 방법보다는 칸트의 도덕적 방법을 택했다고 말을 햇다. 그리고 칸트의 도덕적 방법이란 종교를 이성의 한계 안에서 사유하는 것이다. 칸트 이전에는 이성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을 통해 인간은 감성과 오성이라는 선천적 인식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신앙적인 것은 인간의 인식능력 밖에 있다고 말을 한다. 다만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도덕능력'뿐이다. 이 책의 번역자는 이것을 '칸트식 선긋기'라고 말한다. 결국 칸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것은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순수이성의 명령) 그리고 말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실천이성의 명령) 결국 우리는 이성의 범위 안에서만 말을 하고 사유할 수 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사유한다고 한다. 이 추상적으로 사유하기의 반대는 구체적이 아닌, 전체적이라고 말한다.(P36) 결국 추상적인 사유는 부분적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어 사유하는 것이 추상적 사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데리다식의 해체적인 사유이다.
그렇다면 추상적인 사유로 종교를 사유한다는 것, 데리다식의 해체식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은 데리다의 말을 통해 그 방법의 대략만을 짐작할 뿐이다.
오늘날 종교를 추상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추상의 힘에서 출발하여 위험을 무릎쓰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모든 추상과 분리의 힘들 (뿌리뽑기, 탈지역화, 탈육화, 형식화, 보편화하는 도식화, 객관화, 원거리 커뮤니케이션 등)의 견지에서 보자면, '종교'는 그것에 반하는 적대와 동시에 그것을 재인정하려는 경쟁적 부추김 가운데 존재한다. 거기는 지식과 신앙이, 말하자면 한편으로(자본주의적이고 신탁적인) 과학기술과 다른 한편의 믿음, 신용, 신뢰성, 신앙 행위가 항상 그 장소 안에서 그들의 적과 동맹을 결성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될 바로 그런 곳이다. 거기서 아포리아 - 길, 방도, 출구, 구원의 어떤 부재 - 와 두 가지 원천이 유래한다. - [신앙과 지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