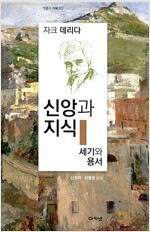젊은 날에 나는 근대와 현대의 서양철학을 신의 존재를 배제한 도덕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했다. 신의 존재를 믿으면 도덕에 대한 논의는 매우 간단하다.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죽은 후에 보상을 받는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의 뜻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신의 존재를 빼면 그동안 쌓았던 도덕의 틀은 다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혼돈과 공황상태이다. 19세기말 유럽은 이런 정신적인 혼란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네형제들]의 이반의 말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생각이 당시 유럽의 지성인들의 생각이었다. 결국 철학자들은 이런 혼돈에서 도덕을 세워야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와 헤겔이다.(이 책에서는 베르그송까지 같은 범주에 넣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베르그송의 책은 접해보지 못했다.) 그들은 신의 존재 대신 절대이성이나, 선의지같은 개념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젊은 시절 나는 이들의 사상에 매료되었다. 특히 칸트의 사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인간 감성과 오성 너머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지를 통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의 사랑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이 책에서 역자가 쓴 '독서카드'라고 이름 붙은 서문에는 칸트가 계몽(이성)과 종교 간에 선 긋기를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순수이성의 명령이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실천이성의 명령이다. 칸트의 계몽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정식이 부여한 한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계몽의 이러한 한계가 궁극적으로 칸트가 옹오화고자 했던 한계로서의, 한계 긋기로서의 계몽이 아니겠는가? - [데리다의 오늘, 오늘의 데리다] 중에서 P25
그러나 칸트의 사상은 마치 출구를 찾지 못하는 고성과 같았다. 일단 멋지게 보여서 한 번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한 내부의 구조때문에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그 복잡한 고성에서 출구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 아니면 어렴풋이 먼 곳에서 출구를 보고, 그 출구가 내가 생각했던 화려한 출구가 아닌 너무나 초라한 출구여서 무시햇는지도 모르겠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데리다의 [신앙과 지식]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1994년 이스라엘의 헤브론시의 사원에서 이스라엘 극우 단체 소속의 의사가 팔레스카인 40명을 학살하는 '헤브론 사건' 이후 자크 데리다와 잔니 바티모가 카프리 섬에서 공동 주관한 세미나를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그는 극단적인 종교의 대립에서 출구를 찾고자 세 권의 고전을 해석한다. 헤겔의 [신앙과 지식], 칸트의 [순전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 베르그송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다. 데리다는 이 세 명의 철학자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저서에서 어떤 답을 찾았을까? 이제부터 읽을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