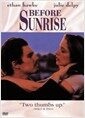

할머니를 만나고 프랑스로 돌아가고 있는 셀린은 옆자리의 부부가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자 다른 자리로 자리를 피한다. 그 곳에서 만나게 된 미국인 제시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지만 부부싸움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식당칸으로 함께 피신을 하기로 한 두 사람은 그 곳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 하지만 프랑스까지 가는 셀린과 달리 제시는 비엔나에서 내려 다음 날 비행기를 타야하는 상황. 제시는 이에 셀린에게 함께 비엔나에서 내려 하루를 보내자고 제안을 하고 셀린도 이에 응하며 그들의 예기치않은 하루가 시작된다.

이 영화를 처음 봤던 것이 초등학생때였으니 거의 10년도 전에 본 셈. 얼마 전 <비포 선셋>이 개봉하고나서 다시 한 번 봐야지 봐야지하다가 결국 이제서야 보게 됐다. 어릴 때는 이 영화를 보며 어떻게 느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든 뒤에 보니 한 편으로는 무모해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런 예기치않은 만남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현실은 영화와 다르게 흘러가겠지만)

여행이라는 비일상적인 경험. 그리고 그 와중에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인연. 이것은 낯선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며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영화는 사람들의 내면에 감춰진 이런 욕구를 잘 파고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단순히 원나잇 스탠드를 위한 하루가 아닌 서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위한, 미래에 곱씹어볼 추억을 하나 만들기 위해 일상을 탈출해버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다가왔다. 여기에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끌어내는 두 사람의 대화에 살짝 압도당한 느낌도 들었다. 두 사람의 짧은 사랑을 보는 것도, 비엔나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다. 이제 <비포 선셋>을 보며 세월이 지난 뒤 그들의 감정을 다시 엿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