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물어야 할 한 가지』에서 '임혜지'는 나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p.78) 라고 말한 바 있다. 어릴적의 나였다면 이혼은 나쁜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지만, 지금으로서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 그래,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대체 어떻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나는 이혼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을 읽었다.

여류 소설가 아홉명이 '이혼'에 대해 얘기한다니, 무척 흥미가 있었다. 이혼후의 얘기든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얘기든, 그게 무엇이든 여류 작가들의 잘 쓰여진 문장으로 읽게 된다니.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점점 실망스러웠다. 왜 대부분의 이혼은 '남편의 외도' 때문인걸까? 물론, 그것만이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을거다.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해도 모두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바람 이전에 사사로운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을테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이혼의 결정적 사유로 대부분 남편의 외도를 꼽는건 나로서는 좀 못마땅했다. 남편의 외도가 아닌 다른 이유들로 이혼을 한 여자들의 내면에 대해 얘기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소설들은 대체적으로 나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세대의 이야기인걸까, 단순히 성향이 다른걸까. 은근히 뭔가가 '나와는 다르군' 하는 느낌을 줬는데 그것이 좀 더 뭐라해야하나, 고지식하다 해야하나, 그리고 어떤 단편엔 로망을 실현하기도 하고. 여튼 전체적으로 딱히 마음에 드는 단편들은 아니었다. 꽤 지루한 단편도 있었고.
그런데 '정지아'의 「양갱」은 달랐다. 정지아의 양갱도 역시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여자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여자의 캐릭터 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였다. 이 책에 실린 아홉편의 단편중 유일하게 나랑 비슷한 성향을 지닌 여자가 나온다고 하면 될까.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있었던거다.
"아이, 먼 잠을 그리 짚이 잔다냐. 일허니라 밤샜는갑다이."
고모는 그 외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전기검침원이든 가스검침원이든 타인을 대면하는 자체가 피곤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잠들지 않았어도 일부러 문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고모는 아마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pp.51-52)
혼자 살기 시작한 그녀의 집으로 고모가 찾아온다. 바로 그자리에서 고모를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모는 일자리를 구해가며 여자의 집에 살고 있다. 여자처럼 나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나가라고 하지 못하고, 그런데 자꾸 나가라고 하고 싶은 여자의 마음이 손에 잡힐듯 느껴졌달까.
고모는 하루종일 부엌에 틀어박혀 그녀에게 줄 양갱을 만든다.
"묵기 싫어도 한나만 묵어봐라. 니 에레서 백점 못 받았다고 홀짝홀짝 울고 있다가도 요놈만 쥐주먼 울음을 뚝 그쳤니라."
고모는 손가락 한마디만 하게 자른 양갱을 포크에 찍어 내 손에 쥐여 주었다.양갱만 먹으면 울음을 그쳤다는 것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양갱은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옅은 팥 맛이 혀끝에 감돌았을 뿐이다.
"니, 아즉 김서방 못 잊었지야?"
내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반 남은 양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모는 불쑥 물었다.
"그런 것을 잡아보도 못했지야? 에레서도 그랬니라, 니가." (p.65)
고모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눈치를 봐가며 머무르는 것 모두, 고모는 자식이 여럿이지만 딱히 갈 데가 없고 일자리도 구해지 못해서라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고모는 짐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어쩌면 고모는, 그 모든 이유들은 그저 별 거 아닌 것들일 뿐, 실상은 그녀의 옆에 단 며칠간이라도 있어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겐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속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단지 말 한마디라도 툭, 건드려 그녀를 울게할 사람이 필요했을테니.
그녀에게 헤어진 남편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술에 취해서였다. 고모가 오기 전날이었다. 남편은 우유를 한 잔 얻어마시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잡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지, 너는." (p.65)
아, 나는 이 문장을 도무지 평심하게 읽어내지를 못하겠다. 하아- 잡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지, 너는. 그래, 잡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겠다, 어쩔래, 이 빵꾸똥꾸야.
이혼에 대한 책을 읽노라니 며칠전 남동생과의 대화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식탁 앞에서 엄마와 남동생과 나는 누군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중이었다. 그게 여동생의 결혼 생활이었는지 앞 집 여자의 결혼 생활이었는지 옆 동 여자의 결혼생활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결혼생활이었는지.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여튼 그 대화중에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 여자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 둘이 사는게 좋지 않았다. 뭐 그런거.
그러자 엄마는 그게 뭔말이냐, 라고 했고 남동생도 그런 말이 있긴한거냐? 라고 되물었다. 나는 응 있어, 소설에 나와. 앤 타일러의 소설에. 이해가 안돼? 다시 말해줄게.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 여자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 둘이 사는게 좋지 않았다. 설명도 해줘? 그랬더니 남동생은 다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이러는거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나쁜 사람이었다, 우리 엄마도 나쁜 사람이었다, 그래서 둘이 사는게 괜찮다, 그거잖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빵터져서 ㅋㅋㅋㅋㅋㅋㅋ그치. 우리 아빠 엄마 둘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괜춘한거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말한 문장을 책에서 찾아보면 정확히는 이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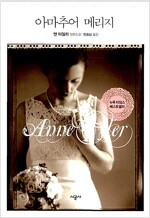
정말이지 폴린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건 마이클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둘이 함께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앤 타일러, 아마추어 메리지, p.230)
이 문장을 찾아서 읽어주고 싶었지만 내가 이 책을 팔아먹었....그래서 책을 펼칠 수가 없었.........orz 책을 팔지 말자. 책을 팔 때는 신중하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책이 필요해질지 모른다. 그나마 내가 페이퍼를 써놔서 다행이다. 페이퍼 뒤지니까 이 인용문이 나와. 그러고보면 나는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팔았나봐? 음..사람이 이정도면 됐지. 이정도면 충분히 신중해. 음..괜춘하다. 훌륭해.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카와 통화를 했다. 나는 엄마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조카에게 할머니 보고 싶냐고 물으니 응, 보고 싶어, 할미 보고싶어, 라고 하는거다. 그래서 그럼 이모는? 하고 물었더니 '이모는 안보고싶어' 하는거다. 흑흑 ㅠㅠ 속상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나는 집에 돌아와서는 씻지도 않고 세숫대야를 꺼내어 밥을 넣고 무나물과 시금치, 고추장과 참기름을 듬뿍 넣고 슥슥- 비벼 먹었다. 먹다가 지칠정도로 양이 많았다. 그리고는 신문을 들추어보다가 씻고 내 방에 돌아와 책을 펼쳤는데 솔솔 졸음이 밀려온다. 밥 먹은지 한 시간도 안된것 같은데 그냥 자버렸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않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팅팅 부어있었고, 그나마 한쪽에 존재하던 쌍커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쌍커풀이 사라진 아침이다. 앞으로는 저녁에 먹는 양을 조금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