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간혹 내가 한 권의 소설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좋은 이야기이기를 원하고 좋은 문장들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작가가 그 책에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것들을 만족시키기가 정말이지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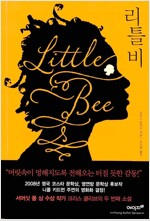
이 책, 『리틀 비』를 읽는동안 자꾸만 삐끗삐끗 나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의욕은 넘치고 전달하고자 하는 능력은 그러나 좀 서투른 작가의 작품이라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될까. 나는 감동을 주기 위해 혹은 독자를 울리기 위해 작가가 많이 개입하지 않기를 원한다. 거기에 어떤 강압이나 억지가 없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싶은 혹은 하고 싶은 말을 더 확실히 전달하고 싶은 욕망이 넘쳐서 심하게 꼬이고 오버가 된 듯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하는 식의 느낌이 전반적이랄까. 결말에 이르러서는 얼굴 표정이 찡그려진다.
나는 왜 이 책에 만족하지 못할까, 만족할 수 없을까. 여기서 아주 먼 곳, 나이지리아의 난민에 대한 삶을,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이 책을 읽고서야 겨우 알게 되었으면서, 그러면서 왜 나는 좀 더 많은 다른 것들을 바라는걸까. 분명 이 책을 읽다가 몇 번이고 눈물이 고이기도 했으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이 부족하다고 느낄까.
이 책을 읽다가 '리사 엉거'의 『아름다운 거짓말』이 생각났다. 리사 엉거의 책에서는 여자주인공이 자꾸만 독자들에게 확신을 구한다. 그게 나는 그 책을 읽는동안 내내 거슬렸는데, 이것은 작가의 성향이라고 정의내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작가의 서투름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패턴을 의도하지 않게 보여주는 것, 그런데 그 보여짐이 독자에게 거슬리는 것. 이 책, 『리틀 비』에서도 그런점이 보였다.
"오, 새라, 우린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기엔 너무 오랜 세월을 함께했어. 결국 보스는 너야. 물론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 난민에 대한 기사를 할 거야. 하지만 그런 기사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눈을 감아버리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주제는 누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 그게 문제라고." (p.326)
새라에게 이 말을 하는 새라의 직장 동료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이 직장동료도 그리고 새라의 애인도, 새라에게 모두들 '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 '너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라는 문장이 이 책에는 '너무' 많이 등장한다. 내게는 신경 쓰일 정도로. 이 부분에서 '리사 엉거'의 책이 자꾸만 생각났던거다. 리사 엉거 같잖아, 하고. 그러고보니 리사 엉거의 책과 공통점이 또 찾아진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큼은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 누군가는 얘기했어야 했다는 것.
그렇지만, 단지 그런 이유로 내가 그 책들을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만약, 이런식의 문장들만으로 진행됐다면 나는 이 책을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불행이 맑고 푸른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행복한 여자였던 적이 없다. 내게 불행은 수많은 전조들과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 일상이 파괴되고 나서야 서서히 찾아왔다. 면도하지 않은 앤드루의 턱, 어느 날 밤 뚜껑이 열린 채 널부러진 두번째 술병, 금요일 마감 칼럼에 쓴 수동태 문장. (p.48)
격렬한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문장들.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찾아노는 파괴를 말하는 덤덤한 문장. 마치 일상같은 문장. 아니 그 자체로 일상을 말하는 문장. 이 문장은 아주아주 좋았는데. 그리고 이런 문장도.
굳이 비밀을 밝히자면, 흉터가 아름다운 이유는 죽어가는 자에게는 생기지 않는 것이 흉터이기 때문이다. 흉터의 의미는 '생존'이다. (p.22)
흉터의 의미가 생존이었음을 나는 이 문장을 읽고서야 깨달았는걸. 무릎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그렇지, 흉터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살아 남으려고 애썼던 자들에게 생기는 것이지. 맞아, 그랬어. 흉터는 생존의 증거야. 아직 살아있다는 거라고!
나는, 이 책을 다 읽고서는 내가 까다로운 독자인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내가 소설을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설을 그냥 단지 소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독자인걸까. 나는 바라는게 많은 까다로운 독자인걸까. 나는 그냥 좋게좋게 책장들을 넘기고 그저 좋게좋게 감상할 수는 없는걸까. 나는 까다로운걸까. 나는 소설을 읽을 때 그 속의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들중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는데, 사실 나는 비판적 입장으로 소설책의 책장을 넘기는걸까? 나는 세상의 모든 소설들을 품을 아량 따위는 없는걸까.
나는 아직 나를 잘 모르는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