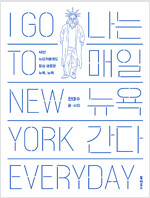
나는 십대 시절, 뉴욕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뉴욕을 좋아했고 20대와 30대에 뉴욕을 가보고서는 사랑했다. 그 찬란한 도시가 왜그렇게 좋던지. 거리를 걸을 때면 좋다는 생각말고 다른 생각은 들질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또 뉴욕에 가고 싶었다. 뉴욕을 내집처럼 만들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해두었고, 갔던 곳에 다시 가는 그 반가움과 익숙함을 몸소 체험하겠다! 했다.
그렇게 뉴욕행을 일주일 앞두고서는, 뉴욕에 대해 뭔가 몰랐던 걸 더 알고 가자 싶어 마침 나온 뉴욕관련 신간을 읽었다. 그게 '한대수'의 [나는 매일 뉴욕 간다] 였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하자면, 굳이 읽지 않아도 좋다. 이 책을 읽는다고 뉴욕에 대해 남달리 특별히 더 알게되는 것도 거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 70세 할아버지의 꼰대같음에 책 자체가 재미가 없다. 한대수가 젊은 시절 음악으로 얼마만큼 이름을 날렸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이 할아버지의 일대기는 나에게 전혀 흥미가 없고 게다가 짜증이 난다. 그렇게나 일찍부터 대도시를 알고 경험했으면서도 그는 딱히 페미니스트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성을 인간 보다는 여성으로 보는 것 같다. 어디에서 살든 뿌리박힌 생각은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뉴욕에 대해 말하는 이 책이 재미있지를 않았어.
한대수는 음악에서도 재능을 보인 사람이지만 사진으로도 그랬다. 예술쪽으로도 아는 것이 많아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는데, 그가 칭송하는 예술가의 사진을 보다가 도대체 이런 사진을 왜 찍고 앉았나 싶어지는 것이다. '아라키 노부유시'란 작가의 묶인 여성이 보여지는 작품은 도대체 이런 작품을 왜 만든건지 노이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진을 보는게 너무 끔찍해. 안그래도 오늘 읽은 2016년 신문기사에서는 남성이 섹스 도중 여성의 목을 졸랐다가 여성을 살해했다는 게 있었다. 남자는 살해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행위 도중 목을 졸랐을 뿐이라고 햇는데, 왜 영화 같은 거 봐도 나오지 않나. 더 큰 쾌감을 원해서 여성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고. 아 진짜 너무 끔찍해. 아 너무 싫다 싫어 진짜. 쾌감이 뭐라고 목까지 졸라가며 그지랄들을 해. 내 목을 졸라가며 얻는 쾌감 같은 거, 나는 바라지 않는다. 행위 도중 목을 조르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 나는 그것은 두렵고 싫다. 무분별하게 그러면 좋대, 이러면서 아무거나 다 따라하고 그러지좀 마. 그런데 한대수가 소개한 '아라키 노부요시'의 작품에서는 여자가 교복을 입고 끈에 묶여 천장에 매달려 있다. 정말이지 씨발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이걸 굳이 뭐하러 작품이라고 찍어 놓는건지 모르겠고, 이걸 작품이라고 해놓은 걸로 그냥 모든게 다 설명되는 것 같다. 이걸 작품이라고 만들고 전시하고 이 작가가 유명해지는 건...뭐야?? 책에 나온 사진 올릴까 하다가 관두기로 한다. 나는 이 사진 보는 순간 너무 짜증이나서, 아직 책의 절반도 읽지 않고서는 책읽기를 그만둘까 어쩔까 고민했다. 끝까지 다 읽었지만, 뭐 좋은 건 없었다.
앤디워홀 전시는 나도 가본 적이 있는데, 앤디 워홀이 페미니스트로부터 총을 맞았었다는 건 처음 알았다. 한대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워홀의 가장 큰 비극은 1968년에 일어났다. 남자들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 발레리 솔리나스로부터 총을 맞았던 것이다. 목숨이 위독할 정도였다. 가슴을 열고 대수술을 한 결과 겨우 살아남았다. (p.48-49)
그러니까 한대수는 페미니스트는 남자들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내리고 있구나, 라고 저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했다.
1987년, 워홀은 담낭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도중에 합병증으로 죽었다. 나이 58세였다. 항상 병원 공포증으로 검진과 치료를 기피해온 결과였다. ( p.49)
아 이부분 읽는데 너무 무서웠어. 내가 받은 수술인데... 요즘 나는 부쩍 피로를 잘 느끼는데, 관리 잘해야겠다. 과식하지 말아야지 ㅠㅠ 과식하면 힘들더라 ㅠㅠ 그런데 오늘 저녁도 또 과식했어 ㅠㅠ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 ㅠㅠ 과식하지 않을게요. 건강하자. 아프지말고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말고..
한대수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는데 영문학에 큰 재능을 보였다고 했다. 그런데 한대수가 쓴 이 책을 보면서 몇 번이나 '글 되게 못쓰는구나' 생각했다. 역시 문학에 관심있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구나, 새삼 깨달았네. 한대수는 여러 소설가를 좋아했지만 그중에서 에드거 앨런 포를 가장 좋아했다는데, 하아, 나는 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좋았을뻔한 것을 이 책을 통해 또 알게 되어버려서 입맛이 쓰다.
그런데 1836년, 그는 사랑에 빠진다. 상대방은 14세 버지니아 클렘. 결혼할 때 아내의 나이가 21세라고 거짓말을 한다. 인생 처음으로 포에게 '가족'이 생겼고, 그는 행복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같이 마실 수 있는 동반자,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에게 생긴것이다. (p.67-68)
........... 어제 내게로 동화책을 가져오며 읽어줘, 라고 말한 나의 조카가 열 살이다. 나는 원래도 포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저 사실을 알았다면 포를 버렸을 것 같다. 열네살... 열네살 아내와 커피를 같이 마시는 동반자...행복......... 그만두자.........
칠십세의 한대수이기 때문일까. 아내를 마누라라고 칭하는 것도 듣기 싫고, 큰 딸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읽는게 괴로웠다. 아내는 22살 연하인데,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아파트를 구하기 시작했다. 큰딸 같은 젊은 마누라와 초등학생 꼬맹이, 두 딸이 편히 살 수 있는 뉴욕의 첫번째 아파트, 어디로 갈까? 인터넷과 뉴욕 타임스를 뒤지니 가격이 장난 아니었다. (p.231-232)
위의 문장은 두 번 읽었다. 어? 계속 딸 하나라 그랬는데? 젊은 마누라가 큰딸같아 두 딸이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정말....하아.....
환갑이 다 되어 아내랑 사이가 안좋아 헤어질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 때 아이가 생겨 다시 사이좋게 같이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때 일을 이렇게 써놨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대하는 옥사나의 태도가 바뀌더니 "I love you." 하면서 육탄 공격을 했다. 그녀는 임신을 간절히 원했다. 내 생각엔, 나 혼자 태국으로 이주한다고 의심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기적이 일어났다. (p.242-243)
.................... 만약 내 앞에서 누가 저렇게 얘기했다면, 듣기싫어 그만 말해, 라고 햇을 것 같다.
한대수는 본인이 대학을 중퇴했고 자신의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걸 이해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나도 물론 그 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 곧 훌륭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 더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다. 그러나 한대수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외의 삶 혹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친한 친구 부인은, 나이 60세에, 갑자기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가 말했다. "대수 형, 나 죽겠어. 생활하기도 힘든데, 학비가 부담스러워."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우리는 학교, 학벌, 지위, 권위, 직책, 너무 따진다. 이것은 열등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꼭 박사 모자를 써야 자신감이 생기고, 별을 달아야 장군이 된 기분이고, CEO가 되어야 성공한 기분이고, 또 그래야 상대방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촌스런 생각이다. (p.267)
에세이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자의 평소 생활이나 생각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작게나마 공감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같은 의미로 에세이의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작가의 생각과 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에세이이기 때문에 나랑 가장 다른 점도 들여다볼 수 있다. 60세에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한 아내 때문에 신랑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고, 그것이 고민이 되어 누군가에게 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열등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라고 치부하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꼭 타이틀이 있어야 되다니 촌스럽다, 라고 하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는 것을 타이틀 따는 거에 연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생각안에 갇힌 거 아닌가.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시야가 넓어지는 건 아닌것 같다. 젊은 시절 다양한 경험을 했어도 나이 들어서 딱히 더 현명해지는 것도 아니야. 첫번째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외도도 많이 했다는데, 만약 내가 그의 음악을 좋아했다면, 그랬다면 나는 지금 이 책을 읽고, '그래도 음악의 천재니까' 하면서 끄덕일 수 있었을까? 내 경우엔 그의 음악을 좋아했었다 한들 이 책을 읽으면 으으, 별로다... 사요나라~ 했을 것 같다.
책의 마지막 추천사는,
김훈이 썼다.
김훈과 한대수는 동갑이라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